- 영문명
- Cult Films and the Era of Censorship: A Contextual Study of Kim Ki-young’s films in the 1970s
- 발행기관
- 한국영화학회
- 저자명
- 박유희(YuHee Park)
- 간행물 정보
- 『영화연구』제105호, 603~64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예술체육 > 예술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23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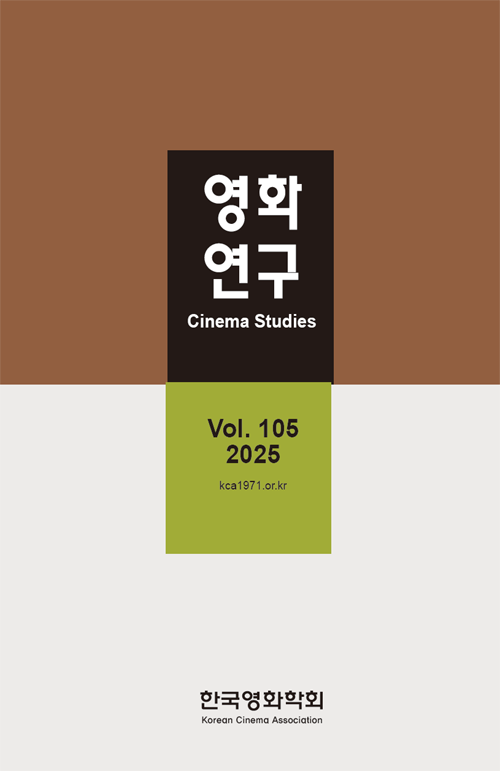
국문 초록
본고는 1990년대 ‘컬트영화’로 재발견된 김기영 영화 미학의 맥락을 1970년대 검열과의 상관성 속에서 구명한 것이다. 김기영 영화는 1997년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소환되며 세계영화 지평에서도 독창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박찬욱 감독을 필두로 K-Cinema를 주도하는 감독들에 의해 추앙되면서 K-Cinema의 원조로서 위상을지니게 되었다. 그러면서 김기영 영화는 한국영화사에서 돌연한 현상으로, 오롯이 김기영이라는 위대한 예술가의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작가의식의 산물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커졌다. 그러나 김기영 영화 32편 중 4편이 개봉 당해 흥행 수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두 편은 ‘불황과 검열의 시대’로 알려져 있는 1970년대의 영화였다. 게다가 이 영화들에서도 김기영 영화의 인장에 해당하며 후대에 ‘컬트’로 재발견되는요소들, 즉 예측불허의 전개와 그로테스크, 파격적 섹스와 잔혹이 줄곧 등장한다. 이는 검열이 가장 엄혹했던 1970년대에 김기영 영화가 어떻게 제작될 수 있었는지에대한 의문을 계속 유발해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기영 영화가 1970년대에 생산될 수있었던 역학과 맥락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 김기영 영화 역시 시대의 산물임을구명하고 나아가 한국영화사에서 저질영화의 시대로 단순화되어 있는 1970년대에 대해 다르게 조망해보고자 했다. 잊혔던 김기영 영화를 21세기와 연결해준 ‘컬트영화’ 는 열광적인 관객성, 기성 질서에 도전하는 파격과 경계 침범적인 미학으로 구성된영화를 일컫는 초장르적 명칭이다. 이러한 컬트영화의 자질은 1970년대 영화를 폄훼하며 통칭하는 ‘저질영화’와 겹치는 면이 있다. 당시 검열에서 요구하고 권장하는 윤리적·미학적 기준으로서의 ‘승화’에 도달할 수 없는 외설(섹스와 폭력)은 ‘저질’로분류되었다.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화든 ‘승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나, ‘외설’은 당시 영화의 유일한 돌파구이기도 했다. 따라서 두 벡터가 작용하는 가운데 영화 텍스트는 기묘한 어긋남과 불균질을 노정했다. 검열이 저질영화를 통제할수록 저질영화가 양산되었던 역학이 여기에 있다. 김기영 영화는 인간의 본질과 원초적 세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시대를 창의적으로 통과한 결과였다. 김기영 영화가 견지했던 문제의식은 선구적이었으나 1970년대 국가가 허용하는예술성의 영역에서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외설’은 그러한 예술성에 내재하였고, 외설이 제한된다고 해서 외설에 대한 상상력까지 가위질될 수 없었으므로 계속 시도되었다. 이것이 1970년대에 김기영의 파격적인 영화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었던 시대적 맥락이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lucidates the context surrounding the formation of Kim Ki-young’s cinematic aesthetics—which were rediscovered in the 1990s as “cult films”—in relation to the censorship of the 1970s. Kim Ki-young’s films were summoned through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1997, where they began to gain recognition for their originality in the global film landscape. These films were subsequently revered by directors of K-Cinema, such as Park Chan-wook, who established Kim Ki-young’s films as the progenitors of K-Cinema. Thus, Kim Ki-young’s films have increasingly been regarded as a sudden phenomenon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n cinema, where they are often seen as the product of the personal and independent artistic consciousness of this great artist. However, among Kim Ki-young’s 32 films, four ranked first at the box office upon their release, including two from the 1970s, known as the “era of recession and censorship.” Moreover, elements such as unpredictable developments, grotesqueness, obscenity, and brutality, which are emblematic of Kim Ki-young’s films, consistently appeared in these films, which would later be rediscovered as “cult” by future generations. This has continuously raised questions about how Kim Ki-young’s films could be produced during the most restrictive period of censorship in the 1970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dynamics and context that allowed for the production of Kim Ki-young’s films in the 1970s. Through this, the study seeks to clarify that Kim Ki-young’s films were also products of their time and to offer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the 1970s, which has been simplistically viewed as an era of low-quality films in Korean cinema. “Cult films,” which connect the forgotten works of Kim Ki-young to the 21st century, refer to a transgenre term that describes films characterized by enthusiastic audiences, shocking challenges to the established order, and boundary-pushing aesthetics. The qualities of cult films overlap with those of what is derogatorily referred to as “trash films,” which were denigrated in the 1970s. Works that could not achieve the “sublimation” defined by the ethical and aesthetic standards demanded and encouraged by censorship—namely, obscenity (involving sex and violence)—were classified as “trash.” While any film needed to strive for “sublimation” to pass censorship, “obscenity” also served as a unique escape route in the cinema of that time. Thus, the film text revealed strange disjunctions and heterogeneity amid the operation of these two vectors. The greater the degree to which censorship attempted to control trash films, the more trash films proliferated, reflecting that dynamic. Kim Ki-young’s films stemmed from a fundamental inquiry into the essence of humanity and the primal world, creatively navigating this era. The problems he addressed in his films were pioneering but could be accepted only within the realm of artistic expression permitted by the state. Moreover, “obscenity” was intrinsic to the state-sanctioned art, and even if obscenity was restricted, the imagination surrounding it could not be curbed, leading to continual attempts at obscenity. This context accounts for the continued production of Kim Ki-young’s audacious films in the 1970s.
목차
1. 문제제기
2. 김기영 영화의 재발견과 컬트영화
3. 1970년대 텍스트로서 김기영 영화의 맥락
4.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영화연구 제105호 목차
- 디지털 숏폼 시네마의 감각적 전환: 포스트-연속성과 플랫폼 디스포지티프
- 생기적 물질론으로 본 에코시네마의 물질적 전회: 하마구치 류스케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 한류 소재 OTT 콘텐츠의 스케이프와 문화적 표상: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엑스오, 키티>를 중심으로
- 컬트영화와 검열시대: 김기영 영화의 1970년대 생산 맥락에 대한 일고찰
- 연상호의 작품 세계: 카이뉴레닌과 불완전한 움직임의 미학
- 픽사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변주: 서사적 공간 확장의 관점에서
- 화이트 포크 호러와 시각적 과잉의 미학: 영화 <미드소마(Midsommar)>(2019)를 중심으로
- 디지털 전회 이후 한국 공포영화 유령성의 위치 짓기
- 영화의 자동화(Automation)와 인공지능 영화의 미학적 의의
- 미디어 고고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인공지능과 의미생산: <정이>를 중심으로
- 이타미 주조의 <탐포포>(1985)에 나타난 음식을 통한 사회 비판과 햅틱 비주얼리티 연구
- 미디어 환경 변화와 아날로그적 스펙터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전략적 선택
- 4·3 서사의 행위자, ‘음식’: 영화 <지슬>을 중심으로
- 서부극의 생태학적 리얼리즘: 앙드레 바쟁의 생태미디어적 사유와 <믹의 지름길>(2010)
- 한중 SF 영화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일고찰: <더 문>(2023)과 <문맨>(2022)의 사례를 중심으로
- 1990년대 이후 홍콩 영화와 한국영화의 상호텍스트적 관계 연구: 왕가위 현상을 중심으로
- 영화제와 지역의 관계 형성과 변화에 대한 재고찰: 전주국제영화제 사례를 중심으로
- 자이니치의 초월적 정체성 연구: 일본 영화 <용길이네 곱창집>(2018) 캐릭터를 중심으로
- 여성 주체의 실패와 페미니즘 정치학의 가능성: <서브스턴스>(The Substance, 2024) 속 여성의 이중적 위치
- <500일의 썸머>와 마페졸리의 순환 시간: 정체성 전환의 감정적 윤무(輪舞)
- 인서트 쇼트의 ‘과잉된 시간성’ 연구: 로베르 브레송의 <소매치기>를 중심으로
- 신체, 공간, 계급 감각의 시각적 연출: 발터 벤야민 이론을 중심으로 본 <하녀>와 <기생충>의 연기 분석
- 노태우 정부 시기(1988-1993)의 레임덕 영화 연구
-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의 독일 표현주의 전략: <살인! Murder!>(1930)를 중심으로
- 후각의 불가능성과 영화적 재현: 영화 <향수>의 시청각적 환유 전략 연구
-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공간 윤리와 비가시적 감각 구조
- 스피박의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더글러스 서크 식의 ‘영화적 화답’: ‘탕웨이 2부작’ <헤어질 결심>, <만추>를 중심으로
- 크리스 마르케르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태양 없이>와 아이의 형상
-
남성 타자화와 젠더 권력의 재구성: 중국영화
(2024)를 중심으로 - 시리즈 <정년이>의 해외 팬 반응을 통한 글로벌 문화 현상 연구
- 한국전쟁을 전후한 한국영화의 지역 표상: 로케이션과 서사 이미지의 변화
- 시네필 문화 가치의 구성과 가치 전환의 정치: 가치 인류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세실 B. 드밀의 <왕중왕>(1927)과 니콜라스 레이의 <왕중왕>(1961)과 장성호의 <킹 오브 킹즈>(2025) 비교연구: 이중서술을 통한 기적과 부활의 재현
- 일본 영화정책의 제도적 공백과 영화 생태계
참고문헌
관련논문
예술체육 > 예술일반분야 BEST
- 생성형 AI 도구와 디자이너의 협업 프로세스 개발 - 이미지를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서 고해상도 렌더링까지
- 디자인 전공 교과목에서의 생성형 AI 도구 활용 사례 연구
-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예술체육 > 예술일반분야 NEW
- 한국영화의 촬영과 조명 시리즈 2: 영화 '형사, Duelist'의 Visual Concept 및 조명플랜
- 포스트모더니즘적 영상표현에 관한 연구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 영화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소니 HVR-Z1N 카메라의 중요한 메뉴에 관한 소고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