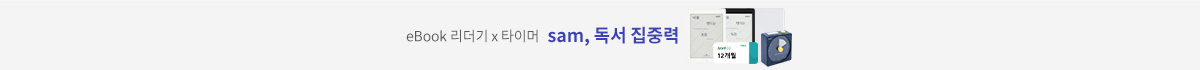학술논문
송정 조용의 삶과 학문적 위상
이용수 0
- 영문명
- Song-Jeong Cho, Yong's life and Academic Status
- 발행기관
- 영남퇴계학연구원
- 저자명
- 추제협
- 간행물 정보
- 『퇴계학논집』제36권, 159~18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글은 조용의 삶과 학문적 특징에 대한 시론적 검토이다. 조용은 여말선초에 활동한 대표적인 문신으로, 20여 년간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다.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 사림의 도통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위한 것이다. 다만 자료의 빈곤으로 그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없지 않다. 당연히 기존 연구 또한 전무하다. 그럼에도 그가 걸어간 관료의 삶을 재구성하고, 스승 정몽주와 제자 윤상의 학문을 통해 그의 학문을 짐작해 보려고 했다.
우선, 조용은 주로 관료의 삶을 살았다. 1374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에서 간의대부, 세자 빈객, 예문관 대제학, 성균관 대사성 등 여러 중요 요직을 맡으며 비교적 순탄한 관직 생활을 이어왔다. 특히 성품이 강직했고 문장에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 능통했던 터라 간관의 역할과 예문관, 성균관의 책임을 여러 차례 역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 따른 조용의 학문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정몽주와 윤상을 통해 비추어 보면, 주자학의 리기론적 체계에서 리의 우위적 입장을 견지하고, 현상 세계의 근본 원리와 법칙에 따른 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집중했으며, 이러한 심성론적 문제를 수양론과 연결하여 수기에서 치인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 것은 대체로 공유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사림의 도학을 정립 및 전개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만약 이를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림의 도통인 정몽주에게서 길재, 김숙자,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계보는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계보가 중종 대의 기묘사림에 의해 의도된 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정몽주에게서 조용과 윤상, 그리고 김숙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면밀한 분석하여 도통론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text examines the life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of Cho, Yong(趙庸), a prominent scholar and official active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Cho, Yong served as the Sungkyunkwan-Daesaseong for over 20 years. The reason for focusing on him is to provide a reflective critique of the existing scholarly tradition(道統, Do-Tong) of the Sarim (Confucian scholars). However, due to the scarcity of sources, there are limitations in fully revealing his true nature. As expected, there is also no prior research on him. Nonetheless, the text attempts to reconstruct his bureaucratic life and, through the study of his teacher Jeong, Mong-ju and his disciple Yun, Sang, offers insights into his academic pursuits.
First of all, Cho, Yong was a bureaucrat for most of his life. After pass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1374, he had a relatively smooth career in the civil service, holding several important positions during the historical transition from the late Goryeo to the early Joseon dynasty, including ‘Ganui-Daebu(諫議大夫)’, ‘Seja-Bingaek(世子賓客)’, ‘Yehmungwan-Daejehak(藝文館大提學)’ and ‘Sungkyunkwan-Daesaseong(成均館大司成)’. In particular, he was strong in character, excelled in writing, and was fluent in several disciplines, including the Neo-Confucian, which allowed him to assume the responsibilities of ‘Gangwan(諫官)’ as well as ‘Yehmun(藝文館)’ and ‘Sungkyunkwan(成均館)’ at various times.
Accordingly, the scholarship of Cho, Yong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features in light of the scholarship of Jeong, Mong-ju and Yun, Sang: He asserted the dominant position of Li(理, principle) in the Neo-Confucian Li-Gi theory and focused on the ethical problems of human beings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laws of the phenomenal world, His linking of the problems of mind and nature in his philosophy with the practice of self-cultivation(修養, Suyang) to move from self-cultivation(修己, Sugi) to the path of governing others(治人, Chinin) seems to be largely shared. This is indirect evidence that he was an important bridge in the formulation and development of Sarim(士林)'s ‘Do-hak(道學)’.
If we agree with this, then we must reconsider the commonly known scholarly lineage of the Sarim that runs from Jeong, Mong-ju to Gil, Jae to Kim, Suk-ja to Kim, Jong-jik. This is even more evident in that such a lineage is the intended setting by Gimyo-Sarim(己卯士林) in ‘the reign of King Jung-jong in Joseon dynasty. Therefore, a three-dimensional approach to the theory of Dotong(道統) of Chosun is needed by closely analyzing the lineage from Jeong, Mong-ju to Cho, Yong and Yun, Sang to Kim, Suk-ja.
목차
1. 들어가며
2. 역사적 전환과 관료의 삶
3. 학문적 특징과 그 위상
4.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삼국유사』의 체재에 나타난 성스러움의 구도화
- 퇴계 이황의 귀향과 서원부흥운동의 의미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선구적 모형의 관점에서-
- 퇴수재 이병곤의 도산 사숙과 학문적 특징
- 퇴계 이황의 1666년 퇴계학파 3인의 상소문과 그 영향
- 영남 유학 3人의 性理說에 나타난 退溪學과의 접점과 간극 -이현일·이상정·류치명의 理氣·四端·七情을 중심으로-
- 국권 상실기 전우(田愚)의 시대인식과 사상적 모색
- 송정 조용의 삶과 학문적 위상
- 절성(節性)ㆍ인성(忍性)ㆍ복성(復性)의 도덕관념 계승 관계 구명(究明)
- 이토 진사이의 주희 천지만물생성과 이선기후(理先氣後) 비판
-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의 장도화 구도
- 『三綱行實圖』의 유교 윤리적 의미와 현대사회
- ‘동양 사람들은 점(占) 보기를 좋아한다’는 사회심리학적 결론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