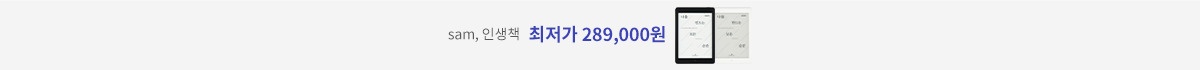- 영문명
- Xuanzang’s Scholarly Status as Reflected in the Yogācārabhūmi-Śāstra Commentary
- 발행기관
- 불교학연구회
- 저자명
- 백진순(Jin-Soon BAEK)
- 간행물 정보
- 『불교학연구』제84호, 229~2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불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현장의 중요한 학문적 업적 중 하나는, 『유가론』전권의 번역과 강설을 통해서 『유가론』뿐만 아니라 그것의 한 부분인 논리학[因明] 연구의 열풍을 선도한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업적은 제1세대 『유가론』 연구자들의 전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해진다. 본고에서는 선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유가론기』에 의거해서 현장의 학문적 위상을 추측해 보았다. 특히 「섭결택분」에서 두 개의 인용문을 택해서 자세히 분석해보았다.
첫째는 오종성(五種性)의 학설이다. 이것은 무종성(無種性)을 상정하기 때문에 당대 학승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문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어떤 화두를 남겨놓았다. 그에 따르면, 『유가론』의 ‘끝내 열반의 장애를 가진자’란 『능가경』의 ‘보살천제(菩薩闡提)’처럼 실은 종성이 있는 자[有性]임에도 끝내열반에 들지 않는 자일 수도 있고, 혹은 『대장엄론』의 ‘필경무열반법(畢竟無涅槃法)’ 처럼 항상 종성이 없는 자[無性]이므로 끝내 성불하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다. 이것은후대에 무종성의 문제를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단골 소재가 되었다.
둘째는 현장의 유식비량(唯識比量)이다. 『유가론기』에 따르면, 아뢰야식에 의거하는 유식의 교설 안에서는 그것은 제한적 의미만 갖는다. 그것은 특히 ‘아뢰야식의 존재’를 우회적으로 성립시키는 어떤 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논제에 따르면, 안식(眼識) 등이 색(色) 등의 경계를 요별하는 작용을 일으켰다면, 그와 동시에 아뢰야식과 말나식은 기세계·신체 및 ‘아’를 요별하는 작용을 일으킨다. 이와 관련해서, ‘일체법은 식과 분리되지 않음’을 성립시키는 논증을 시도한다. 이중, 소승을 대론자로 하여, ‘색을 요별하는 안식이 일어났을 때 그 색은 안식과 분리되지 않음’을 성립시킨 것이 바로 현장의 유식비량이다.
영문 초록
One of Xuanzang’s most significant scholarly achievements was his complete translation and exposition of the Yogācārabhūmi-Śāstra. Through this work, he not only deepened understanding of the text but also stimulated scholarly interest in Buddhist logic (Hetuvidyā), a branch of Yogācāra philosophy. This influence is known primarily through indirect accounts transmitted by the first-generation scholars of the Yogācārabhūmi-Śāstra.
This paper examines Xuanzang’s intellectual standing by analyzing Dunlun’s Yogācārabhūmi Commentary (瑜伽論記), which consolidates earlier scholarly interpretation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wo representative examples from the section “Saṅgraha-prayukta-vibhāga” (攝決擇分), revealing Xuanzang’s methodological depth.
The first concerns his interpretation of the Five Types of Natures. The concept of “no-nature”—which posits the existence of beings without the potential for enlightenment—provoked prolonged controversy among Tang dynasty monks. Xuanzang offered two distinct explanations. According to him, “no-nature” may refer either to a bodhisattva who possesses the potential for Buddhahood but chooses not to enter nirvāṇa in order to save sentient beings, as described in the Laṅkāvatāra Sūtra; or to an individual who inherently lacks the capacity for nirvāṇa, as explained in the Mahāyāna-sūtrālaṅkāra, and thus cannot attain Buddhahood even under favorable conditions. This interpretation has continued to shape subsequent Buddhist discourse on “no-nature.” The second example is Xuanzang’s application of vijñaptimātra inference. As presented in the Commentary, this inference occupies a circumscribed role within Yogācāra teachings grounded in ālaya-vijñāna. Xuanzang’s argument indirectly affirms the existence of ālaya-vijñāna through an epistemological proposition: when discriminative cognition of a visual object arises, ālaya-vijñāna and manas simultaneously generate awareness of the world of vessels, the body, and the self.
This demonstrates that all dharmas are inseparable from consciousness. In particular, Xuanzang challenges the Hīnayāna position by asserting that a visual object perceived by visual consciousness cannot exist independently of that consciousness —thereby firmly establishing his vijñaptimātra inference.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예비적 논의
III. 현장에 의해 촉발된 주요 논쟁들
IV. 맺는말
참고 문헌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선사상에 나타난 초목불성의 전개와 함의
- 불교 언어철학의 전개 - 초기불교에서 『중론』까지
- 『유가론기(瑜伽論記)』에 나타난 현장(玄奘)의 학문적 위상
- 고려 사경(寫經), 젠더로 읽다 - 『묘법연화경』사경으로 본 여성의 성불과 좌절
- 초기 유가사 수행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가능성 모색 - 『수행도지경』을 중심으로
- 인성교육 주체 간 신뢰회복의 중요성 - 『대승기신론』의 수행체계를 중심으로
- 불성의 형이상학
- 『능가경』은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동일시했는가?
- 물리적 대상만이 공간을 점유하는가? - 유가행 유식학파 철학에서 공간성의 문제 재검토
- 『대승기신론』의 물과 바람과 파도의 비유 연구
- “무대 위의 꼭두각시를 보라” - 임제의 삼구·삼현·삼요와 동산의 삼로를 중심으로
- 원효의 상위비량을 통한 법상유식 무성론 비판 연구 - 규기의 무성유정 인명논증을 중심으로
- 역사적 붓다의 본성에 대한 재고찰 - 초기 불교 문헌을 완성된 전체로 파악하는 접근법에 입각하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