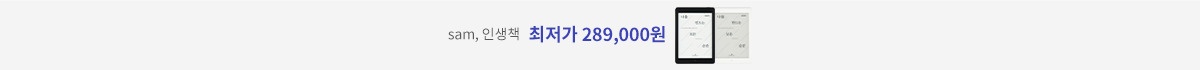- 영문명
- Does the Laṅkāvatārasūtra identify the Tathāgatagarbha with Ālayavijñāna?
- 발행기관
- 불교학연구회
- 저자명
- 김성철(Seong-Cheol KIM)
- 간행물 정보
- 『불교학연구』제84호, 25~5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불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능가경』은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동일시한 최초의 문헌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동일시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다른 대답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대답은 『능가경』에서의 ‘동일시’는 단순한 동일시가 아니라, 여래장 개념에 대한 유가행파 입장에 선 재해석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재해석은여래장 개념이 방편설에 입각한 불요의설이라는 유가행파의 시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본고는 먼저 『능가경』의 찬술 의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것이 ‘섭대승’과 ‘해심밀’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한 후, 특히 ‘해심밀’의 입장에서 여래장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단독으로 여래장이 다루어지는 부분에서 『능가경』은 그것을 공성 혹은 진여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개념이라고 한다. 이 구절들은 후대의 문헌에서 여래장사상이방편설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여래장이 알라야식과 나란히 등장하는 부분에서 핵심 문제의식은 윤회의 주체가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여래장 개념은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쳐 알라야식으로재해석된다. 다시 말해 무한한 과거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윤회하는 것은 알라야식이며, 여래장은 이러한 알라야식을 의도해서 설해진 방편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고의 결론은 『대승기신론』적 시각을 『능가경』에 역으로 투영하는 데서 벗어나, 인도불교 사상사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e Laṅkāvatārasūtra has long been regarded as the first text to identify tathāgatagarbha with ālayavijñāna. This paper offer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what the identification actually means.
To put it directly, the “identification” in the Laṅkāvatārasūtra is not a simple equation of the two concepts but rather a reinterpretation of the tathāgatagarbha concept from a Yogācāra standpoint. This reinterpretation reflects the Yogācāra perspective that tathāgatagarbha is a provisional teaching (neyārtha) grounded in skillful means (upāyakauśalya). To establish this point, the paper first considers the compositional intention of the Laṅkāvatārasūtra, noting its twofold standpoint —Mahāyānasaṃgraha and Saṃdhinirmocana—and then examines how the tathāgatagarbha concept is treated, particularly from the latter perspective.
In the sections where tathāgatagarbha is discussed independently, the Laṅkāvatāra Sūtra presents it as a concept taught with śūnyatā or tathatā in mind. These passages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later claims that the tathāgatagarbha doctrine is a provisional teaching. In the sections where tathāgatagarbha appears alongside ālayavijñāna, the central issue is what is the subject of saṃsāra. At this point, the tathāgatagarbha concept is meticulously reinterpreted as ālayavijñāna. In other words, what transmigrates from beginningless time until nirvāṇa is ālayavijñāna, and tathāgatagarbha functions only as a provisional teaching posited in reference to this ālayavijñāna.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suggests that, when we refrain from projecting the perspective of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onto the Laṅkāvatārasūtra and instead interpret the text within the context of Indian Buddhist intellectual history, new horizons of interpretation become possible.
목차
I. 서론
II. 『능가경』의 찬술 의도
III. 『능가경』의 여래장설
IV. 여래장과 알라야식의 결합
V. 여래장과 알라야식의 결합 의도
VI. 결론
참고 문헌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선사상에 나타난 초목불성의 전개와 함의
- 불교 언어철학의 전개 - 초기불교에서 『중론』까지
- 『유가론기(瑜伽論記)』에 나타난 현장(玄奘)의 학문적 위상
- 고려 사경(寫經), 젠더로 읽다 - 『묘법연화경』사경으로 본 여성의 성불과 좌절
- 초기 유가사 수행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가능성 모색 - 『수행도지경』을 중심으로
- 인성교육 주체 간 신뢰회복의 중요성 - 『대승기신론』의 수행체계를 중심으로
- 불성의 형이상학
- 『능가경』은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동일시했는가?
- 물리적 대상만이 공간을 점유하는가? - 유가행 유식학파 철학에서 공간성의 문제 재검토
- 『대승기신론』의 물과 바람과 파도의 비유 연구
- “무대 위의 꼭두각시를 보라” - 임제의 삼구·삼현·삼요와 동산의 삼로를 중심으로
- 원효의 상위비량을 통한 법상유식 무성론 비판 연구 - 규기의 무성유정 인명논증을 중심으로
- 역사적 붓다의 본성에 대한 재고찰 - 초기 불교 문헌을 완성된 전체로 파악하는 접근법에 입각하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