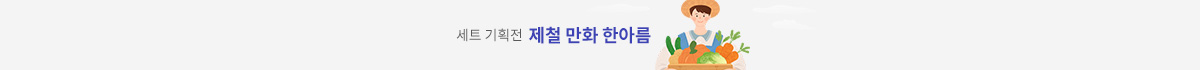학술논문
한국전쟁기 황해도민의 서해안 피난과 전후 전라남도 정착
이용수 197
- 영문명
- Evacuation of the West Coast during the Korean War and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1960s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저자명
- 김아람(Kim, A-ram)
- 간행물 정보
- 『동방학지』동방학지 제180집, 141~17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9.30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한국전쟁기 피난의 실상과 피난민의 정착 과정을 규명하였다. 황해도 출신들은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섬으로 우선 피난하였다. 섬에서는 의식주가 해결되기 어려웠고, 위험을 무릅쓰고서 섬과 집을 오가는 특수한 피난 생활을 하였다. 피난민은 생사의 순간을 때때로 마주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등 체념에 그치지만은 않았다. 섬에서 군 수송함(LST)으로 서해안을 따라 목포로 이동하였다. 목포에서 각 지역으로 배정된 사람들은 현지인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현지에서는 원치 않더라도 피난민을 받아들여야했다. 정부와 UNCACK이 피난민 구호대책으로 ‘난민정착사업’을 시작하자 피난민은 사업장에 모여들었다. 전남 장흥에서는 대규모로 사업장이 조성되었다. 피난민이 이끄는 한국정착사업개발흥업회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현지인과 개척단까지 합류하였다. 난민 정착사업은 1960년대에 자조근로, 자조정착사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때에도 흥업회는 전국에서 사업을 처음으로 완료하며 장흥 대덕사업장을 성공 사례로 이끌었다. 영암에서는 일제시기부터 호남의 대자본가가 조성한 학파농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피난민은 주도권이 없었다. 장흥의 흥업회 사업장에는 새로운 농지가 조성되었고, 규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두 분배되었다. 농지를 분배 받은 피난민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였다. 영암에서는 지역 내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이웃에 본보기가 된다는 목표 하에 피난민들이 더욱 사업에 분발하였고, 1950년대부터 ‘새마을’로 불리며 다른 마을보다 풍요를 누렸다. 정착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구호 사업이자 개발 사업이었다. 피난민은 여기서 핵심적인 주체였다. 농지 확대를 통한 식량 증산과 농촌 자조는 국가가 추구하는 성장 기조였다. 피난민의 정착사업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자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피난민과 현지 지역민은 정착사업을 매개로 복합적인 경계를 형성하였다. 피난민은 차별을 극복하려고 근면한 생활을 실천하거나 공동체적인 결속을 강조하며 정착하였고, 이 과정은 농촌의 전후 복구에 기여 하는 것이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reality of evacuation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rocess of refugees’ resettlement. Refugees who left their homes in Hwanghae-do had lived long sheltered lives on the west coast island. They risked their way back and forth between houses and islands as they had difficulty securing basic food and shelter on the island. The refugees on the island were carried on LSTs and came to Jeollanam-do, at the end of the west coast. Together with the Korean government, UNCACK conducted a Resettlement project nationwide, and this project was promoted in Jeonnam. In Jangheung, the refugees became leaders of the settlement businesses and ran businesses, while this was not the case inYoungam as business was conducted on the land of the landowners. The refugees worked diligently to achieve their goal of creating farmlands. The resettlement project was turned into a self-help project in the mid-1960s, and the refugees have been fully settled in Jeollanam-do thanks to the distribution of farmland. The refugees participated in settlement projects actively to create farmland and overcome social discrimination. Therefore, they cannot be excluded from the groups who did their best in the post-war restoration process of Korea.
목차
1. 머리말
2. 피난의 시작과 여정
3. 전라남도 배치와 정착사업 주도
4. 정착사업의 완수와 피난민 인식
5.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편집위원
- 연구원 소식 (2017년 7월~9월)
- 『경세유표』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
- 『東方學志』 편집규정
- 한말 ‘동양’ ․ ‘아시아’ 담론과 ‘민족’의 발견
- 1920년대 이후 용정 주재 캐나다 선교사들의 활동과 문재린 목사
- 경계를 넘나드는 한인공동체와 동아시아의 평화
- 통감부 시기 인천의 시구개정사업과 시가지 행정
- 송몽규의 민족의식 형성과 기독교
- 조선후기 새로운 국가구상의 전통과 『경세유표(經世遺表)』
- 월남 지식인의 정체성: 정치사회변동과 자기 결정성
- 해방~한국전쟁기 인천 지역 월남민의 정착과 네트워크 형성
- 1910년대 매일신보의 쇄신과 보급망 확장
- 이산 1세대 월남민 연구의 기획과 의의
- - 특집 취지문 - 『경세유표』의 역사성과 현재적 의미
- 근대 전환기 다산 저술의 출판과 승인
- 李鈺의 觀物論的 사유와 花潭學
- 한국전쟁기 황해도민의 서해안 피난과 전후 전라남도 정착
참고문헌
관련논문
인문학 > 문학분야 BEST
- 근대 문학과 목격의 서사 : 이상 「날개」 연구
- 한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현대 사회에서의 재해석 -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논어(論語)』 연구 동향 분석 - 2000-2023년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인문학 > 문학분야 NEW
-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의 곽분양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사별 애도 과정과 의미 - 영화 <원더랜드>(2024) 속 모녀 관계와의 비교를 겸하여
- <세경본풀이>의 통사론적 규칙과 서사 의미론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