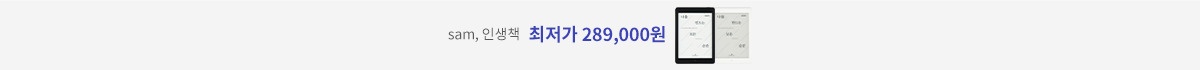- 영문명
- Syntactic Rules and Narrative Semantics of
- 발행기관
- 한국고전연구학회
- 저자명
- 오세정(Se-jeong Oh)
- 간행물 정보
- 『한국고전연구(韓國古典硏究)』제70권, 61~8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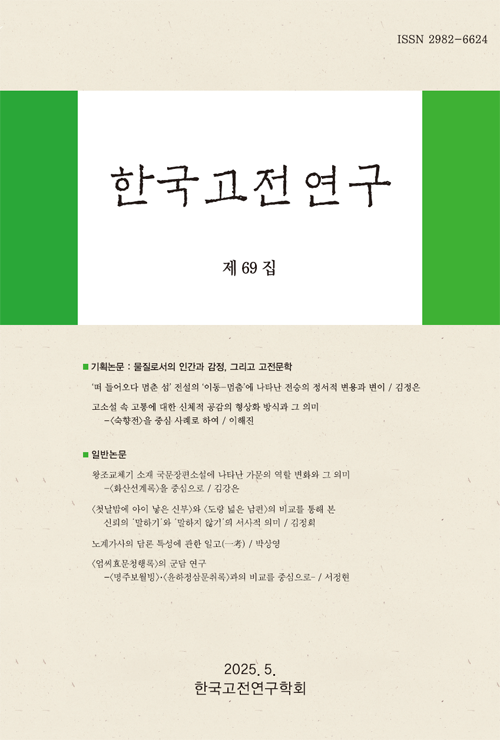
국문 초록
본 논의는 농경 기원 신화 <세경본풀이>를 대상으로 서사의 통사론적 규칙을 찾고 이를 토대로 신화 서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서사는 ‘여성 인간’이 ‘여성 신’이 되는 이야기인데, 전체 서사의 최초 상황에서 최종 상황으로의 변화는 서사를 이루는 변형 단계의 단위 형태인 신화소의 통사 규칙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는 ‘문도령과 만나기’와 ‘문도령과 헤어지기’, ‘정수남을 죽이기’와 ‘정수남을 살리기’의 대립 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 전체 서사에서 자청비는 문도령과 만나기 위해 정수남을 죽이고,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문도령과 헤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청비는 타고난 존재론적 정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천상의 여성 신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인간 세계의 농경신으로 좌정한다.
<세경본풀이>의 통사론적 규칙에 따르면 이 서사는 자청비와 정수남의 서사가 틀을 이루며, 세경신 신직의 체계에서도 자청비와 정수남과 달리 문도령은 명목상 존재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 죽이기’와 ‘사람 살리기’의 대립 체계 속에서 자청비의 행위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자청비가 세경신이 되는 과정과 그 함의가 보다 명확해 진다. 자청비는 반복되는 죽이고 살리는 행위 끝에 지상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살리기의 방법으로 농경을 선택한 것이다. 이 신화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여성 인간이 ‘여성/남성’, ‘인간/신’의 존재론적 제약을 모두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하고 누군가에 예속된 존재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독립적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살림’의 가치가 바로 농경이라는 것을 지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find the syntactic rules of the narrative in the agricultural origin myth and analyze the meaning of the narrative based on those rules. This myth is a narrative of a ‘female human’ becoming a ‘female god’, and the change from the initial situation to the final situation of the entire narrative is well expressed through the syntactic rules of the mythemes, which is the unit form of the transformation stage that constitutes the narrative. This can be expressed as a system of opposition between ‘meeting Moon-doryeong’ and ‘parting with Moon-doryeong’, and ‘killing Jeongsunam’ and ‘saving Jeongsunam’. In the entire narrative, Jacheongbi kills Jeongsunam to meet Moon-doryeong, and then breaks up with Moon-doryeong to save Jeongsunam. In this process, Jacheongbi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her innate ontological identity, becomes a goddness in the heavenly world, and ultimately takes her place as an goddess of agriculture in the human world.
According to the syntactic rules of , the entire narrative is centered around the narratives of Jacheongbi and Jeongsunam, and in the position system of agricultural gods, unlike Jacheongbi and Jeongsunam, Mun-doryeong exists only in name. Also, if we understand the actions and roles of Jacheongbi within the opposing system of ‘killing people’ and ‘saving people,’ the process of Jacheongbi becoming an goddess of agriculture and its implications become clearer. After repeated acts of killing and reviving, Jacheongbi chose agriculture as the best way to save many people on earth. This myth is about the ontological transformation of a female human born as an imperfect being. She demonstrates the ability to overcome the ontological constraints of ‘female /male’ and ‘human/god’ and is reborn as an independent being who chooses for herself rather than a being subordinate to someone. And her story tells us that the most necessary value for ‘living’ for imperfect humans on earth is agriculture.
목차
1. 서론
2. <세경본풀이>의 통사론적 규칙과 서사 구성
3. <세경본풀이>의 구성 원리에 기반한 서사 의미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사별 애도 과정과 의미 - 영화 <원더랜드>(2024) 속 모녀 관계와의 비교를 겸하여
- <세경본풀이>의 통사론적 규칙과 서사 의미론
- 조선후기 승려 권선문의 문체와 설득 전략
- 남유용의 회화 감상과 시적 형상화에 나타난 심미 의식
- 뇌과학적 관점에서 본 감정과 고전문학
- 남성으로 묻힌 열녀절부(烈女節婦) - 〈방한림전〉에서 유교 덕목을 통해 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충돌
- 경판 <소대성전>의 간행 양상 재구 - 동경외대 소장 ‘30장본’을 중심으로
- 『송계잡록』수록 가사 <채란상사곡>의 문학적 형상화와 성격 고찰
-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의 곽분양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소현성록> 속 며느리 형상화와 시집살이 양상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