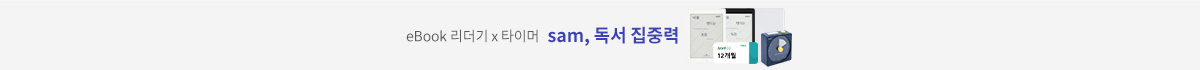학술논문
1960년대 대일무역 불균형 개선 교섭과 양국 경제의 접근
이용수 54
- 영문명
- Korea-Japan negotiations to resolve trade imbalance in the 1960s and permanent of trade im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 발행기관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 신재준
- 간행물 정보
- 『동국사학』제80집, 130~166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7,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글은 오랜 기간 만성화했던 한일무역 불균형 구조가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일무역 불균형은 수교 이전부터 고질적이고 심각했다. 한국 정부는 1964년 한일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며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1966년 무역협정 개정 교섭 및 그 이후에도 불균형 현상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무역 확대ㆍ균형을 위한 한국의 경제환경 선(先)정비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요구에 맞닥뜨려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1960년대 후반 이후 양국은 초보적이지만 산업분업 구상을 논의 의제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의 관련 논의에서 산업분업은 무역 불균형 문제보다 더 우선하여 취급되었다. 요컨대 한국이 장기 경제협력과 산업분업 논의에 공명한 이 시점은 결과적으로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장기 과제로 미뤄버렸다는 점에서 한일무역관계, 나아가 한국경제 발전 방향의 한 분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그것은 1950년대부터 의연히 존재했던, 한일의 긴밀한 유대와 산업분업을 구상했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이 정치(수교)면에 이어 경제면에서도 그 구상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선 것이기도 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mpirically examines when and how the Korea-Japan trade imbalance structure, which has been chronic for a long time, was created. The trade imbalance with Japan was chronic and serious even before 1965. The Korean government first brought up this issue during the Korea-Japan negotiations in 1964 and attempted to resolve it. However, the imbalance phenomenon did not change much during and after the 1966 Trade Agreement revision negotiations. This is because discussions on imbalance have come to a standstill in the face of the Japanese government’s new demands for a preemptive overhaul of Korea’s economic environment. Meanwhile, after the late 1960s, two governments began to bring up the idea of division of two country’s industry, although it was rudimentary, as a topic of discussion. In subsequent discuss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division of industry was given priority over trade imbalance. As a result, resolving the trade imbalance problem was postponed as a long-term task. In that respect, the moment when Korean government agreed to discuss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and division of industry was a turning point in the direction of Korea-Japan trade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수립 후 한일무역의 단절과 재개
Ⅲ.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1966년 무역협정 체결
Ⅳ. 일본 정부의 ‘환경정비’ 요구와 문제의 장기화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唐高宗咸亨3年(672)歸順縣主告身」 考釋
- 혁신주의 시대 대기업의 대두와 법의 역할
- 1960년대 대일무역 불균형 개선 교섭과 양국 경제의 접근
- 唐代 契丹人 李範 墓誌銘 검토
- 金의 흥기와 고려 擊毬
- “헌정에 새로운 옷을” - 존 셀월의 『자연의 권리』(1796)에서 재산과 시간성 -
- 원 간섭기 탐라 귀속 문제와 ‘제주 방물’ 진헌
- 한암(閑庵) 보환(普幻)의 행적과 서산 개심사 아미타여래좌상의 수보 배경
-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와 노농운동
- ‘樂浪望族’ 李仁德 出自의 재검토
- 1920년대 미국 노동운동과 혁신주의의 어긋난 조우: 1926년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 of 1926)을 중심으로
- 『舊唐書』ㆍ『新唐書』 王毛仲傳 역주
- 동부유라시아론의 저서 3종 소개
- 北朝ㆍ隋唐의 여러 國家와 共同體倫理
- 王毛仲과 唐玄宗 政權
- 동아시아 세계론에서 유라시아론을 조망하다
참고문헌
관련논문
인문학 > 역사학분야 NEW
- The Sage Transmits His Mandate”: A Study on the Concept of “Mandate” in Wang Anshi's Yijing Thought
- An Analysis of the Mechanism of College Students' “Inv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iddens' Modernity Theory
- A Study on the Coupling Coordination between Basic Public Services and 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in Chongqing and Their Influencing Factors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