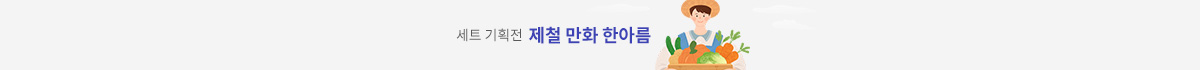- 영문명
- The Acousmatic Voice as Technological Nonconscious and its Politics of Affect: Spike Jonze’s Her
- 발행기관
- 한국영화학회
- 저자명
- 박제철
- 간행물 정보
- 『영화연구』제81호, 283~31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예술체육 > 예술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스파이크 존즈의 영화 <그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인공지능 운영체제와 인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영화의 이러한 내용이 갖는 포스트휴머니즘적 함의를 다각도로 밝혀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 영화가 포스트휴머니즘의 철학적 논제들을 어떻게 ‘예시’하거나 ‘재현’하는지만을 논의함으로 이 영화가 포스트휴머니즘적 세계를 ‘경험’할 여지를 관객에게 어떻게 선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간과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그녀>가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어떻게 남성 인간 시어도르와 관객에게 비인간-되기의 정동적 ‘경험’을 제공하는지를 논의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 영화의 이러한 성취는 무엇보다 이 영화가 사만다의 아쿠스마틱 목소리를 캐서린 헤일즈가 말한 의미에서 ‘기술적 비의식’의 구현으로 제시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헤일즈와 마크 핸슨과 같은 낙관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을 갖는 뉴미디어 학자들에따르면 이러한 기술적 비의식의 구현은 곧바로 포스트휴머니즘적 장밋빛 미래에대한 유토피아적 전망을 열어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 입장에서기대되는 것과는 달리 필자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와 인간 시어도르(와 그에 공감하는 관객) 간의 정동적 접속이 전개되는 과정을 면밀히 독해함으로써 1)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 사만다의 아쿠스마틱 목소리를 통한 기술적 비의식의 구현이 어떻게 미래를 특정한 정동적 정향으로 선취하려는, 브라이언 마수미가 논의한 ‘선취 논리’의 한계 내에 국한되는지 그리고 2) 영화의 후반부에 펼쳐지는사만다의 목소리의 본성상의 변화가 어떻게 시어도르와 그에게 공감하는 관객에게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설 여지를 제공하면서 미래에 대해 정동적으로 열린 전망을 선사하는지를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e existing scholarship on Spike Jonze’s Her (2013) that focuses its attention on the love between the AI operating system and the human has shed light on the film’s implications for posthumanism. But by exclusively discussing how the film illustrates or represents philosophical ideas of posthumanism, these studies have mostly ignored how the film offers the spectator a chance to experience the posthuman world. This paper explores how the film Her, by focusing on the voice of the AI operating system named Samantha, offers both Theodore, a male human being, and the spectator an affective experience of a becoming-nonhuman. What makes this possible is, among others, the way in which the film presents Samantha’s ubiquitous acousmatic voice as an embodiment of the ‘technological nonconscious’ in N. Katherine Hayles’ sense. According to optimistic posthumanist new media scholars such as Hayles and Mark B.N. Hansen, this embodiment of the technological nonconscious would immediately allow for a utopian vision of a rosy posthumanist future. Unlike this optimistic vision, however, by offering an attentive reading of the development of affective connections between Samantha and Theodore, I show 1) how, in the film’s first half, Samantha’s acousmatic voice’s realization of the technological nonconscious is confined to what Brain Massumi calls the logic of preemption that aims to preempt the future in a determinate affective tendency and 2) how, in the film’s latter half, the changes in the nature of Samantha’s acousmatic voice offer both Theodore and the spectator who empathizes with him a possibility of transgressing this limit and thus providing them with an open affective anticipation of the future.
목차
1. 들어가며
2. 유비쿼터스 컴퓨테이셔널 미디어로서의 사만다: 시어도르의 기술적 비의식의 구현
3. 미래를 전매개하는 보안장치로서의 아쿠스마틱 목소리
4. 아쿠스마틱 목소리와의 ‘다른’ 비의식적 연동: 소수자 인간-되기와 비인간-되기 사이에서
5.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예술체육 > 예술일반분야 BEST
- 생성형 AI 도구와 디자이너의 협업 프로세스 개발 - 이미지를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서 고해상도 렌더링까지
- 영화 [올드보이]와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의 상동성 연구
-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