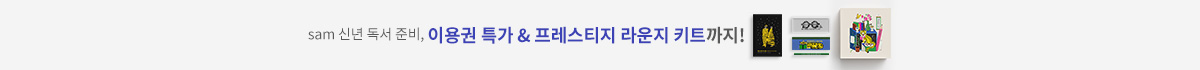사기28
2025년 02월 28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ePUB (6.21MB)
- ISBN 9791191146479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그가 중국 최초의 임금인 황제(黃帝)부터 무제에 이르는 역사를 인물 별로 나누어 쓴 <사기> 130권은 형식으로나 내용으로나 획기적인 역사책이다. 이런 형식을 기전체(紀傳體)라고 하는데, 연대순으로 써가는 편년체(編年體)와 함께 역사 기록 방법의 하나이다.
<사기>의 가장 큰 특색은 역대 중국 정사의 모범이 된 기전체(紀傳體)의 효시로 제왕의 연대기인 본기(本紀) 12편, 연표인 표(表) 10편, 역대 제도 문물의 연혁에 관한 서(書) 8편, 제후왕을 중심으로 한 세가(世家) 30편, 공명을 세운 사람들의 전기 열전(列傳) 70편 등 총 13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마천은 서문(태자공자서)을 통하여 <사기>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 수 있게 했다. 이편을 둘로 나누어 전반부는 태사령(太史令) 사마담(司馬談)의 아들 사마천의 집안 내력과 사기를 집필하게 된 동기 등을 기록하고, 후반부는 <사기> 130편에 대하여 각 편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기록하고, <사기>를 저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황제(黃帝)부터 태초(太初) 연간에 이르기까지 총 130편에 526,500자를 ‘태사공서(太史公書)’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였다.
또 사마천이 친구 임안(任安)에게 보낸 편지 <보임소경서(報任少卿書)>에서 이광의 손자 이릉(李陵)이 흉노를 토벌하러 나갔다가 흉노에게 항복하자, 사마천이 무제(武帝)에게 이릉을 변호하다가 궁형(宮刑)을 당하게 된 사실을 말하였다.
사기는 <본기(本紀)> 12권, <표(表)> 10권, <서(書)> 8권, <세가(世家)> 30권, <열전(列傳)> 7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121. 유림열전儒林列傳 | 40
권 122. 혹리열전酷吏列傳 | 88
권 123. 대완열전大宛列傳 | 174
사기 28
史記
열전列傳
12
사마천
우리고전연구회 역
차 례
권 120. 급정열전汲鄭列傳 | 6
권 121. 유림열전儒林列傳 | 40
권 122. 혹리열전酷吏列傳 | 88
권 123. 대완열전大宛列傳 | 174
권 120. 급정열전汲鄭列傳
본 편은 급암(汲黯)과 정당시(鄭當時)의 합전(合傳)이다. 두 사람은 한무제(漢武帝) 때 구경(九卿)을 지냈고, 모두 청렴하고 직간(直諫)을 잘하여 좌천당하기도 했다.
사마천은 “정장과 급암이 처음 구경의 반열에 올랐을 때, 청렴하고 집안에서의 행실이 결백했다. 이 두 사람이 중도에 파직되었을 때, 그들의 집이 청빈했기에 빈객들은 점차 떨어져 나갔다. 두 사람은 한 군(郡)을 다스렸으나, 죽은 뒤 집안에 남은 재산이라곤 없었다.”라고 하였다.
급암(汲黯)은 전한(前漢)의 관료로 자는 장유(長儒), 복양현(濮陽縣) 사람이다. 한(漢)나라 경제(景帝)와 무제(武帝) 때 태자세마(太子洗馬)와 주작도위(主爵都尉) 등을 지냈다. 그는 황제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고, 황로지도(黃老之道)와 무위의 정치를 주장했으나 황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양태수(淮陽太守)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급정열전(汲鄭列傳) (1)
급암(汲黯) (1)
汲黯字長孺(급암자장유) 濮陽人也(복양인야) 其先有寵於古之衛君(기선유총어고지위군) 至黯七世(지암칠세) 世為卿大夫(세위경대부) 黯以父任(암이부임) 孝景時為太子洗馬(효경시위태자세마) 以莊見憚(이장견탄) 孝景帝崩(효경제붕) 太子即位(태자즉위) 黯為謁者(암위알자)
급암(汲黯)의 자(字)는 장유(長孺), 복양현(濮陽縣)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예전 위(衛)나라의 군(君) 古之衛君(고지위군) : 예전 위나라의 군주. 전국시대 후기 위후(衛侯)가 군(君)으로 강등되었으므로 위군(衛君)이라 한 것이다. <사기 권 37. 위강숙세가(衛康叔世家)>
에게 총애받았다. 급암에 이르기까지 7대에 걸쳐 대대로 경(卿)이나 대부(大夫)를 지냈다.
급암은 부친의 추천으로 任(임) : 보증하여 추천하다. 한나라에 녹봉 이천 석(二千石) 이상의 관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는 형제와 자식의 보증을 서서 낭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경제(景帝) 때 태자세마(太子洗馬) 太子洗馬(태자세마) : 관직명. 태자궁(太子宮)의 속관으로 태자를 보좌하고 태자에게 정사를 교육하는 직책으로 선마(先馬)의 벼슬이었으나, 잘못 기록되어 세마로 전해지게 되었다.
가 되었는데, 사람됨이 엄정하여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경제(景帝)가 붕어한 후 태자가 즉위하자, 太子即位(태자즉위) : 한무제(漢武帝) 유철(劉徹). 16세 때 경제(景帝)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올랐다.
급암은 알자(謁者) 謁者(알자) : 내빈을 접대하고 군주에게 보고를 담당하는 직책.
가 되었다.
東越相攻(동월상공) 上使黯往視之(상사암왕시지) 不至(부지) 至吳而還(지오이환) 報曰(보왈) 越人相攻(월인상공) 固其俗然(고기속연) 不足以辱天子之使(부족이욕천자지사)
그 무렵 민월(閩越)과 동구(東甌)가 서로 공격하니, 東越相攻(동월상공) : 동월(東越)은 동구(東甌)라고도 하며 민월(閩越)과 동구(東甌) 등 월족(越族)의 일파이다. 진나라 말기부터 한나라 초에 민월국과 동해국이 동월로 바뀌었다. 무제(武帝) 건원(建元) 3년(기원전 138년), 민월이 군대를 일으켜 동구를 포위하고 공격했다. <사기 권 114. 동월열전(東越列傳)>
무제(武帝)가 급암을 파견하여 그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급암은 동월까지 가지도 않고 오현(吳縣)까지 갔다 돌아와서는 보고했다.
“월(越)나라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건 본래 그들의 풍속이 그러한 것이니, 천자의 사신을 수고롭게 할 가치가 없습니다.”
河內失火(하내실화) 延燒千餘家(연소천여가) 上使黯往視之(상사암왕시지) 還報曰(환보왈) 家人失火(가인실화) 屋比延燒(옥비연소) 不足憂也(부족우야) 臣過河南(신과하남) 河南貧人傷水旱萬餘家(하남빈인상수한만여가) 或父子相食(혹부자상식) 臣謹以便宜(신근이편의) 持節發河南倉粟以振貧民(지절발하남창속이진빈민) 臣請歸節(신청귀절) 伏矯制之罪(복교제지죄)
하내(河內)에 화재가 발생해 1천여 채의 민가가 연이어 불에 타자, 무제는 급암을 파견하여 시찰하도록 하였다.
급암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백성의 부주의로 불이 났고, 집들이 이어져 있어 불길이 번져서 탔으니, 걱정하실 바가 아닙니다.
신이 하남(河南)에 들렀다가 그곳 빈민들 가운데 만여 가구가 수해와 한해를 당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는 人相食(인상식) : 흉년에 배를 너무 주려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음
일도 있어, 신이 삼가 임시방편으로 지니고 있던 부절(符節)로 하남의 곡식 창고를 열어 현지의 빈민들을 구휼하였습니다. 振(진) : 賑(진)과 통하여 구제(救濟)하다. 구휼(救恤)하다.
신은 부절을 반환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짓 꾸며댄 矯制(교제) : 왕의 명령이라고 거짓 꾸며댐. 制는 황제의 명령.
벌을 받고자 합니다.”
上賢而釋之(상현이석지) 遷為滎陽令(천위형양령) 黯恥為令(암치위령) 病歸田里(병귀전리) 上聞(상문) 乃召拜為中大夫(내소배위중대부) 以數切諫(이삭절간) 不得久留內(부득구류내) 遷為東海太守(천위동해태수)
황제는 급암의 처사가 현명했다고 여기고, 그의 죄를 면해주고, 형양(滎陽) 현령으로 전근시켰다. 급암은 현령으로 좌천된 걸 치욕스럽게 여기고, 병을 핑계로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 田裡(전리) : 고향.
으로 돌아갔다.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여 중대부(中大夫)로 임명했다. 召拜(소배) : 불러들여 관직을 주다.
급암은 여러 차례 직언으로 간(諫)하였으므로 切諫(절간) : 직언(直言)으로 간(諫)함.
조정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동해군(東海郡) 태수로 좌천되었다.
黯學黃老之言(암학황로지언) 治官理民(치관리민) 好清靜(호청정) 擇丞史而任之(택승사이임지) 其治(기치) 責大指而已(책대지이이) 不苛小(불가소) 黯多病(암다병) 臥閨閤內不出(와규합내불출) 歲餘(세여) 東海大治(동해대치) 稱之(칭지) 上聞(상문) 召以為主爵都尉(소이위주작도위) 列於九卿(열어구경) 治務在無為而已(치무재무위이이) 弘大體(홍대체) 不拘文法(불구문법)
급암은 황로(黃老)의 학설 黃老之言(황로지언) : 도가(道家)의 학설.
을 배워 관리와 백성을 다스리는 데도 조용한 걸 좋아하였고, 군승(郡丞)과 서사(書史)를 선택하여 모든 일을 위임(委任)하였다. 급암은 군(郡)을 다스릴 때 큰 원칙을 지키는 걸 요구할 뿐, 사소한 일에는 가혹하게 하지 않았다.
급암은 자주 병에 걸려 항상 안방에 누워 출입하지 못했다. 한 해가 지나자, 동해군은 크게 잘 다스려졌고, 백성들도 모두 칭찬하였다.
황제가 이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들여 주작도위(主爵都尉)로 임명하니, 구경(九卿)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그는 업무를 처리할 때 무위(無爲)의 다스림을 실천했는데, 대체적인 걸 중시할 뿐 법령조문(法令條文) 文法(문법) : 법령조문(法令條文).
에 구애받지 않았다.
黯為人性倨(암위인성거) 少禮(소례) 面折(면절) 不能容人之過(불능용인지과) 合己者善待之(합기자선대지) 不合己者不能忍見(불합기자불능인견) 士亦以此不附焉(사역이차불부언) 然好學(연호학) 游俠(유협) 任氣節(임기절) 內行修絜(내행수결) 好直諫(호직간) 數犯主之顏色(삭범주지안색) 常慕傅柏(상모부백) 袁盎之為人也(원앙지위인야) 善灌夫(선관부) 鄭當時及宗正劉棄(정당시급종정유기) 亦以數直諫(역이삭직간) 不得久居位(부득구거위)
급암은 성격이 오만하고 예의에 벗어났으며, 남의 면전(面前)에서 꾸짖기도 했는데,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다.
자기와 뜻이 맞는 자는 잘 대우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마주 보는 것조차 꺼렸으므로, 선비들 역시 이 때문에 그를 잘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학문을 좋아하고 의협심과 절조를 중히 여기며, 집 안에 있을 때도 품행이 바르고 깨끗했다. 內行(내행) : 보통날 집에 있을 때의 품행. 修絜(수결) : 바르고 깨끗함.
직간하길 좋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제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늘 부백(傅柏)과 원앙(袁盎) 傅柏(부백) : 전한 때 양나라 사람으로 양효왕의 장군이었다. 강직함으로 유명했다. 袁盎(원앙) : 전한(前漢) 시대의 대신으로 개성이 강직하고 재간과 담력이 있었다. <사기 권 101. 원앙조조열전(袁盎鼂錯列傳)>
의 사람됨을 흠모했다.
그는 관부(灌夫), 정당시(鄭當時)와 종정(宗正) 유기(劉棄)와 사이가 좋았다. 灌夫(관부) : 오초칠국의 난에서 공을 세워 장군이 된 인물이다. <사기 권 107. 위기무안후열전> 鄭當時(정당시) : 전한(前漢) 회양진(淮陽陳) 사람으로 자는 장(莊), 의협(義俠)으로 자부하여 양초(梁楚) 사이에서 이름을 떨쳤다. 경제(景帝) 때 태자사인(太子舍人)이 되었다. 사람됨이 청렴하고 행동이 깨끗했으며, 인재를 추천하길 좋아했다. 劉棄(유기) : 유기질(劉棄疾). 전한 중기의 황족이자 관료이다. 원삭 4년(기원전 125년), 종정에 임명되었다. 급암은 부백(傅柏)의 강직함과 원앙의 정직함과 아부하지 않는 걸 흠모하였다. 또 솔직한 관부(灌夫)와 재물을 멀리하고, 의를 중시한 정당시(鄭當時)와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언행이 반듯했던 유기와 사이가 좋았다.
그들 또한 자주 직언했기 때문에 관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했다.
當是時(당시시) 太后弟武安侯蚡為丞相(태후제무안후분위승상) 中二千石來拜謁(중이천석래배알) 蚡不為禮(분불위례) 然黯見蚡未嘗拜(연암현분미상배) 常揖之(상읍지) 天子方招文學儒者(천자방초문학유자) 上曰吾欲云云(상왈어욕운운) 黯對曰(암대왈) 陛下內多欲而外施仁義(폐하내다욕이외시인의) 柰何欲效唐虞之治乎(내하욕효당우지치호) 上默然(상묵연) 怒(노) 變色而罷朝(변색이파조) 公卿皆為黯懼(공경개위암구)
당시 두태후(窦太后) 太后(태후) : 두태후(竇太后). 한문제(漢文帝) 유항(劉恆)의 처. 경제(景帝)의 어머니.
의 동생 무안후(武安侯) 武安侯蚡(무안후분) : 무안후(武安侯) 전분(田蚡). 장릉(長陵) 사람으로 경제(景帝) 왕황후(王皇后) 왕지(王娡)와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다. <사기 권 107. 위기무안후열전(魏其武安侯列傳)>
전분(田蚡)이 승상(丞相)이 되었는데, 녹봉 중이천석(中二千石) 中二千石(중이천석) : 당시 한(漢)나라의 제도는 관리가 받는 녹봉(祿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리의 등급을 정했는데, 이천석(二千石)은 중이천석(中二千石), 이천석(二千石), 비이천석(比二千石)의 세 등급으로, 중이천석이 가장 높다.
을 받는 고관이 배알해도 전분은 제대도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그러나 급암은 전분을 만나도 절을 올리지 않았고, 늘 그에게 가볍게 읍례(揖禮)만 하였다.
무제가 마침 문학(文學) 文學(문학) : 문학으로 이름난 선비들. 문학은 유가의 학설.
과 유학자들을 불러 모으려고, 황제가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려 하였는데, 급암이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께서 내심으로는 욕망이 많으시면서 단지 겉치레로만 인의(仁義)를 표방하고 계시는데, 어찌 도당씨(陶唐氏)와 유우씨(有虞氏) 唐虞(당우) : 도당씨(陶唐氏) 요(堯)와 유우씨(有虞氏) 순(舜)을 말한다.
의 다스림을 본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무제는 말없이 있더니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한 채 조회를 마쳤다.
이 일로 공경(公卿)들은 급암을 걱정하였다.
上退(상퇴) 謂左右曰(위좌우왈) 甚矣(심의) 汲黯之戇也(급암지당야) 群臣或數黯(군신혹수암) 黯曰(암왈) 天子置公卿輔弼之臣(천자치공경보필지신) 寧令從諛承意(영령종유승의) 陷主於不義乎(함주어불의호) 且已在其位(차이재기위) 縱愛身(종애신) 柰辱朝廷何(내욕조정하)
황제가 조회에서 돌아와 측근 신하들에게 말했다.
“심하구나, 급암의 고지식함이여!”
군신 중 어떤 자가 급암을 책망하자, 급암이 말했다.
“천자께서는 공경(公卿) 등 보필하는 신하를 신변에 배치하셨는데, 신하로서 황제의 뜻을 받들면서 어찌 아첨하고 옳지 못한 곳으로 빠지게 한단 말이오? 또 이미 자신들의 몸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 한 몸만 아끼고, 어찌 조정 대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인가!”
黯多病(암다병) 病且滿三月(병차만삼월) 上常賜告者數(상상사고자삭) 終不愈(종불유) 最後病(최후병) 莊助為請告(장조위청고) 上曰(상왈) 汲黯何如人哉(급암하여인재) 助曰(조왈) 使黯任職居官(사암임직거관) 無以踰人(무이유인) 然至其輔少主(연지기보소주) 守城深堅(수성심견) 招之不來(초지불래) 麾之不去(휘지불거) 雖自謂賁育亦不能奪之矣(수자위분육역불능분지의) 上曰(상왈) 然(연) 古有社稷之臣(고유사직지신) 至如黯(지여암) 近之矣(근지의)
급암은 자주 병에 걸렸는데, 병이 또 석 달을 채우자, 황제는 여러 차례 휴가를 주었다. 病且滿三月(병차만삼월) : 당시 한나라 제도에 관리가 병이 나서 3개월이 걸리면 면직하게 되어 있으나, 무제는 급암을 면직하지 않고 휴가를 주어 우대한 것을 말한다. 賜告(사고) : 황제가 휴가를 주다.
그러나 끝내 병이 낫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병에 걸렸을 때, 장조(莊助) 莊助(장조) : 전한의 관료로 회계군 오현(吳縣) 사람이다. <漢書>에는 명제의 휘를 피하여 엄조(嚴助)라고 기록되어 있다. 군의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었고, 무제의 주목을 받아 중대부로 발탁되었다.
가 급암을 대신하여 휴가를 청하러 왔다.
황제가 장조에게 물었다.
“급암은 어떤 인물 같은가?”
장조가 대답했다.
“급암에게 어떤 관직을 맡겨도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소한 군주를 보필할 때는 기존 왕조가 성취한 업적을 굳건히 지킬 것이며, 다른 사람이 불러 유혹해도 가지 않을 것이며, 내쫓아도 가지 않을 것이며, 비록 옛날 맹분(孟賁)이나 하육(夏育) 賁育(분육) :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맹분(孟賁)은 역사(力士)로 맨손으로 살아 있는 소의 뿔을 뽑았다고 한다. 하육(夏育)은 위(衛)나라 사람으로 1천 균(鈞)을 들 수 있고 소꼬리를 뽑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같이 용맹한 자들도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황제가 말했다.
“옳은 말이오. 고대에 사직(社稷)을 지키는 신하 社稷之臣(사직지신) : 나라의 안위와 존망을 담당한 중요한 신하. 국가의 안위를 한 몸에 맡은 중신(重臣).
들이 있었는데, 급암과 같은 사람이 그들에 가까울 것이오.”
급정열전(汲鄭列傳) (2)
이 장에서는 급암이 지나치게 직간하는 사례와 오만했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다.
급암(汲黯) (2)
大將軍青侍中(대장군청시중) 上踞廁而視之(상거측이시지) 丞相弘燕見(승상홍연현) 上或時不冠(상혹시불관) 至如黯見(지여암현) 上不冠不見也(상불관불현야) 上嘗坐武帳中(상상좌무장중) 黯前奏事(암전주사) 上不冠(상불관) 望見黯(망현암) 避帳中(피장중) 使人可其奏(사인가기주) 其見敬禮如此(기견경례여차)
대장군 위청(衛靑) 衛靑(위청) : 전한의 장군으로 누나는 무제의 황후 무사황후(위자부)이다. 생질 곽거병과 함께 무제 때 흉노를 일곱 차례나 물리쳐 관직이 대사마(大司馬)와 대장군(大將軍)에 이르렀다. <사기 권 111. 위장군표기열전(衛將軍驃騎列傳_>
이 궁중에서 무제를 모실 때, 무제는 침대에 걸터앉아 그를 대하였다. 승상 공손홍(公孫弘) 公孫弘(공손홍) : 한무제(漢武帝) 때 내사(內史)와 어사대부(御史大夫)를 역임하였고, 기원전 124년 승상(丞相)이 되고 평진후(平津侯)로 봉해졌다. 회남왕(淮南王)과 형산왕(衡山王)이 반란을 일으키자, 책임을 지고 사임하려 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 유임하였고, 그 이듬해 병사하였다. 공손홍이 벼슬에 올라 황제에게 아첨한 행위는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로 인용되고 있다. <사기 권 112. 평진후주보열전(平津侯主父列傳)>
이 사사로이 알현할 燕見(연현) : 사사로운 일로 윗사람을 찾아 봄. 황제가 한가로울 때 찾아뵘. 燕은 宴과 통하여 편안하고 한가롭다는 뜻.
때도 무제는 이따금 관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급암이 알현할 때는 무제가 관을 쓰지 않고 접견하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무제가 궁전 내에 무기를 배치해 놓은 장막 武帳(무장) : 궁중 내 무기를 보관한 장막.
안에 앉아 있는데, 급암이 일을 아뢰러 오는 걸 보고, 관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을 급암이 알현하면서 책망할까, 장막 뒤로 피하였다. 그리고 측근을 시켜 그 일을 상주하게 했다.
급암이 황제에게 예의를 갖추게 한 것이 이와 같았다.
張湯方以更定律令為廷尉(장탕방이경정률령위정위) 黯數質責湯於上前(암삭질책탕어상전) 曰(왈) 公為正卿(공위정경) 上不能褒先帝之功業(상불능포선제지공업) 下不能抑天下之邪心(하불능억천하지사심) 安國富民(안국부민) 使囹圄空虛(사령오공허) 二者無一焉(이자무일언) 非苦就行(비고취행) 放析就功(방석취공) 何乃取斑皇帝約束紛更之為(하내취반황제약속분갱지위) 公以此無種矣(공이차무종의)
장탕(張湯) 張湯(장탕) : 한무제(漢武帝) 때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조우(趙禹)와 함께 모든 법령을 제정했고,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자 법문을 교묘히 농락하여 옥을 다스림이 너무 가혹해 혹리(酷吏)로 유명했다. <사기 권 122. 혹리열전(酷吏列傳)>
은 때마침 형법을 개정한 공로로 정위(廷尉)가 되었고, 급암은 여러 차례 황제 앞에서 장탕을 질책하였다.
“공이 정경(正卿)이 되고 나서, 황제께서는 선제(先帝)의 공적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아래로는 천하의 사악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것과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풍요롭게 하여 범죄를 없애 감옥 囹圄(영어) : 감옥.
을 텅 비게 만드는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이룬 것이 없소. 덕행을 조금도 실현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법조문을 파괴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았소. 非苦就行(비고취행) : 덕행을 조금도 실현하지 못함. 苦는 조금. 就는 실현하다. 行은 덕행. 放析就功(방석취공) : 마음대로 법령을 바꾸어 한나라의 구제도를 파괴하여 자신의 공적으로 삼았다는 뜻. 析은 파괴하다의 뜻.
어찌하여 고조 황제의 규칙과 제도를 뜯어고쳐 더욱 어지럽게 하는가? 그대는 이 일로 말미암아 멸족할 無種(무종) : 자손이 끊어지다.
것이다.”
黯時與湯論議(암시여탕론의) 湯辯常在文深小苛(탕변상재문심소가) 黯伉厲守高不能屈(암항려수고불능굴) 忿發罵曰(분발매왈) 天下謂刀筆吏不可以為公卿(천하위도필리불가이위공경) 果然(과연) 必湯也(필탕야) 令天下重足而立(영천하중족이립) 側目而視矣(측목이시의)
급암은 자주 장탕과 논쟁을 벌였는데, 장탕은 항상 심오한 법조문을 상세하게 거론했고, 급암은 강직하고 호되게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굴복시킬 수 없자,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었다.
“천하에 하찮은 도필리(刀筆吏) 刀筆吏(도필리) : 도필(刀筆)은 대쪽에 글씨를 쓰는 붓과 잘못된 글씨를 깎아내는 칼을 가리키며, 도필리는 문서를 작성하는 낮은 벼슬아치를 말한다.
를 공경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만약 장탕이 득세한다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 하고 서 있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곁눈질하겠구나!” 重足而立(중족이립) :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 하고 서 있다. 側目而視(측목이시) : 곁눈질로 보다. ※ 重足侧目(중족측목) : 두 발을 모으고 곁눈질하다. 몹시 두려워하다.
是時(시시) 漢方征匈奴(한방정흉노) 招懷四夷(초회사이) 黯務少事(암무소사) 乘上閒(승상한) 常言與胡和親(상언여호화친) 無起兵(무기병) 上方向儒術(상하향유술) 尊公孫弘(존공손홍) 及事益多(급사익다) 吏民巧弄(이민교롱) 上分別文法(상분별문법) 湯等數奏決讞以幸(탕등삭주결언이행)
이 당시 한나라는 막 흉노를 정벌하고, 사방의 이민족 四夷(사이) : 고대에 중국이 인접 국가들을 얕잡아 일컫던 말로 東夷(동이), 西戎(서융), 南蠻(남만), 北狄(북적)을 말한다.
을 회유하고 있었다.
급암은 나랏일을 적게 하려고 힘썼는데, 황제가 한가한 틈을 타 늘 흉노와 화친하고 군사를 일으키지 말라고 권했다.
황제는 마침 유가의 학설에 마음이 기울어 方向儒術(방향유술) : 마침 유학에 마음이 기울다.
공손홍(公孫弘)을 존중했다. 나랏일이 더욱 늘어나자, 하급 관리와 백성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황제는 법조문을 세분하여 법 기강을 세우려 했고, 장탕 등은 자주 새로운 판결문을 만들어 무제의 총애를 얻었다.
而黯常毀儒(이암상훼유) 面觸弘等徒懷詐飾智以阿人主取容(면촉홍등도회사식지이아인주취용) 而刀筆吏專深文巧詆(이도필리전심문교저) 陷人於罪(함인어죄) 使不得反其真(사부득반기진) 以勝為功(이승위공)
그러나 급암은 항상 유학을 헐뜯었는데, 공손홍 등은 단지 불순한 의도를 품고 교묘하게 꾸미면서 황제에게 아부하여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면전에서 무례하게 질책하였고, 面觸(면촉) : 마주 보며 무례하게 질책하다.
장탕과 같은 도필리들은 오로지 의미가 깊은 법조문을 끌어다가 교묘한 말로 속여 飾智(식지) :교묘하게 꾸며대다. 取容(취용) : 환심을 사다. 苟合取容(구합취용) : 아부하여 남의 환심을 사려고 힘씀. 深文巧詆(심문교저) : 의미가 깊은 법조문을 교묘한 말로 속이다.
사람들을 죄의 함정 속에 빠뜨려 진상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들고,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 공로라 여긴다고 질책했다.
上愈益貴弘(상유익귀홍) 湯(탕) 弘(홍) 湯深心疾黯(탕심심질암) 唯天子亦不說也(유천자역불열야) 欲誅之以事(욕주지이사) 弘為丞相(홍위승상) 乃言上曰(내언상왈) 右內史界部中多貴人宗室(우내사계부중다귀인종실) 難治(난치) 非素重臣不能任(비소중신불능임) 請徙黯為右內史(청사암위우내사) 為右內史數歲(위우내사수세) 官事不廢(관사불폐)
그러나 황제는 공손홍과 장탕을 더욱 귀하게 여겼고, 공손홍과 장탕은 급암을 깊이 원망하였다. 그러므로 무제 역시 급암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급암을 죽이려고 했다.
공손홍이 승상이 되자, 무제에게 건의했다.
“우내사(右內史)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귀족과 황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평소 덕망 높은 중신(重臣)이 아니면 그 소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급암을 우내사로 임명하시기를 청합니다.”
이에 급암이 우내사가 된 지 몇 해가 되었으나, 관할하는 지역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
大將軍青既益尊(대장군청기익존) 姊為皇后(자위황후) 然黯與亢禮(연암여항례) 人或說黯曰(인혹설암왈) 自天子欲群臣下大將軍(자천자욕군신하대장군) 大將軍尊重益貴(대장군존중익귀) 君不可以不拜(군불가이불배) 黯曰(암왈) 夫以大將軍有揖客(부이대장군유읍객) 反不重邪(반부중야) 大將軍聞(대장군문) 愈賢黯(유현암) 數請問國家朝廷所疑(삭청문국가조정소의) 遇黯過於平生(우암과어평생)
대장군 위청이 더욱 존귀해진 후, 그의 누나 위자부(衛子夫)가 황후가 되었다. 그러나 급암은 여전히 대등한 예로 위청을 대했다.
어떤 사람이 급암에게 말했다.
“천자께서는 모든 신하가 대장군을 받들기를 바라시고, 대장군은 존중받고 더욱 귀한 신분이 되었으니, 공께서도 대장군에게 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급암이 대답했다.
“대장군에게 절하지 않고 읍만 하는 상대 揖客(읍객) : 서로 읍(揖)은 하되 절은 하지 않는 손님. 보통 손님.
가 있다는 것만으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를 <본기(本紀)> 12권, <표(表)> 10권, <서(書)> 8권, <세가(世家)> 30권, <열전(列傳)> 70권으로 구성하였다.
사마천은 <본기(本紀)> 12권에서 “제왕들이 일어나게 된 자취를 살폈는데, 그 처음과 끝을 탐구하고 그 흥망성쇠를 보되 사실에 근거하여 논하고 고찰하여 삼 대 이상은 간략하게 추정하고, 진나라와 한나라는 상세하게 기록하되, 위로는 황제 헌원(軒轅)으로부터 아래로는 지금(孝武本紀第十二효무본기제십이)에 이르기까지 12편의 본기(本紀)로 저술하고, 종류별로 배열하였다.
<표(表)> 10권에서는 본기(本紀)에 나오는 제왕과 제후들의 흥망을 연표(年表)로 정리하였다. 사마천은 ‘세대가 다른 일이 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발생한 연대의 차이가 분명치 않은 사건들이 있으므로, 10편의 표(表)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서(書)> 8권에서 사마천은 ‘예악(禮樂)의 증감, 율력(律曆)의 개역, 병법의 권모술수와 산천의 귀신,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그 성패와 변화를 살피기 위해 8편의 서(書)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세가(世家)> 30권에서는 분봉한 국가의 군주나 제후들, 혹은 중요한 역사적 인물의 사적 및 사회에 특출한 재능을 보인 인물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사마천은 ‘28수(宿)의 별자리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수레바퀴 살 30개가 바퀴통에 모여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처럼, 제왕을 보필하는 팔다리와 같은 신하들을 이에 빗대어, 충신으로서 도를 행하여 군주를 받드는 모습을 30편의 세가(世家)로 지었다.’라고 하였다.
사마천은 <열전(列傳)> 70권에 대해서, ‘정의롭게 행동하고 자잘한 일에 매이지 않으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세상에 공명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 70편의 열전(列傳)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서평
Epub은 한자의 덧말 쓰기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한자 옆에 훈을 달았다. <사기>를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한자 읽기에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사마천의 <사기(史記)>는 13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사기의 기전체 서술은 역사의 줄기를 제대로 더듬어 갈 수 있게 안배하고 있다.
특히 <표> 10권은 연도별로 일어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여 역사적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게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료의 방대함에 새삼 놀라게 된다.
《사기》는 중국 전한 왕조인 무제 시대에 사마천이 저술한 중국의 역사서로, 중국 이십사사의 하나이자 정사의 으뜸으로 꼽힌다.
본래 사마천 자신이 붙인 이름은 《태사공서(太史公書)》였으나, 후한 말기에 이르러 《태사공기(太史公記)》로도 불리게 되었고, 이 ‘태사공기’의 약칭인 ‘사기’가 정식 명칭으로 굳어졌다.
〈본기〉(本紀) 12권, 〈표〉(表) 10권, 〈서〉(書) 8권, 〈세가〉(世家) 30권, 〈열전〉(列傳) 70권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의 역사서로서, 그 서술 범위는 전설상 오제(五帝)의 한 사람이었다는 요(기원전 22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 말의 전한 무제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 서술 방식은 후대 중국의 역사서, 특히 정사를 기술하는 방식의 전범(典範)이 되었고, 유려한 필치와 문체로 역사서로서의 가치 외에 문학으로서도 큰 가치를 가진 서적으로 평가받는다.
《사기》의 내용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바로 ‘하늘의 도라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天道是也非也)’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하늘의 도리, 즉 인간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사기》 열전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백이열전(伯夷列傳)〉에서 사마천은 의인(義人)이 틀림없는 백이와 숙제가 아사(餓死)라는 초라한 죽음을 맞은 데에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서는 사마천 자신이 과거 친구이자 이릉의 불가피한 항복을 변호했던 올바른 행동을 하고도 궁형이라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은 데 대한 비통함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사기》의 기술은 유교 사상이 주가 되는 와중에 다른 사상도 가미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추구한다는 역사서 편찬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역사 서술을 위한 간결하면서도 힘찬 문장은 ‘문성(文聖)’ 또는 ‘백전노장의 군대의 운용’과 같은 것이라 하여 격찬받았다. 특히 〈항우본기〉는 명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역사 면에서는 정사로서 기술된 당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는 섬세한 기술로 당시의 생활이나 습관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서〉(書)의 내용은 전한 시대의 세계관이나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또 흉노를 비롯한 주변 이민족이나 서역에 관한 기술도 현재 알려진 지리와 유적 발굴 등에서 판명된 당시 상황과의 정합성이 높고, 이러한 지방의 당시를 알기 위한 귀중한 단서가 되고 있으며, 진시황 본기의 ‘진시황이 자신의 무덤에 근위병 3천 인의 인형을 묻었다’는 기술에 대해서도, 시안시 교외의 병마용갱 발견으로 그 정확성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 책이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당신의 새로운 무기를 연마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인물정보
저자(글) 사마천
사마천司馬遷
⁃ BC145년 : 중국 섬서성 용문시하양에서 태어났다.
⁃ 기원전 139년 : 아버지 사마담이 천문 역법과 도서를 관장하는 태사령이 되어 무릉에거주하였다.
⁃ BC126년 : 아버지의 도움으로 2년간 천하를 여행했다.
⁃ BC124년 : 낭중(황제의 시종)이 되어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 BC110년 :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자신이 시작한 <사기>를 완성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 BC108년 : 태사령이 되어서 한무제를 수행하며 장성 일대와 하북, 요서 지방을 여행하였다. 이 여행을 통해 <사기>를 쓰는 데 필요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 BC104년 : <사기>를 쓰기 시작했다.
⁃ BC99년 : 흉노와의 전쟁에서 투항한 이릉(李陵)장군을 두둔하다 황제의 노여움을 사 사형당할 처지에 놓였다. 사형을 피하는 방법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거나 궁형(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치욕적인 궁형 대신 사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궁형을 선택하였다.
⁃ BC95년 : 황제의 용서를 받고, 환관 중 최고 직책인 중서령이 되었다.
⁃ BC91년 : <사기>를 완성하였다.
⁃ BC86년 : 세상을 떠났다.
번역 우리고전연구회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