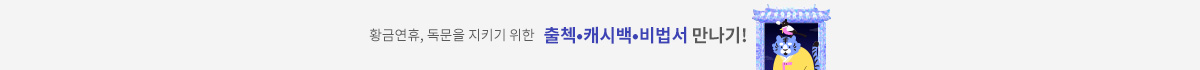학술논문
청동기~초기 철기시대 고 김해만 중심촌락 집단 공간구조 연구 —대성동 환구유적의 재검토
이용수 30
- 영문명
-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Ancient Gimhae Bay Habancheon Village Group in the Bronze Age and the Early Iron Age
- 발행기관
- 한국고고학회
- 저자명
- 윤영석
- 간행물 정보
- 『한국고고학보』제136집, 547~58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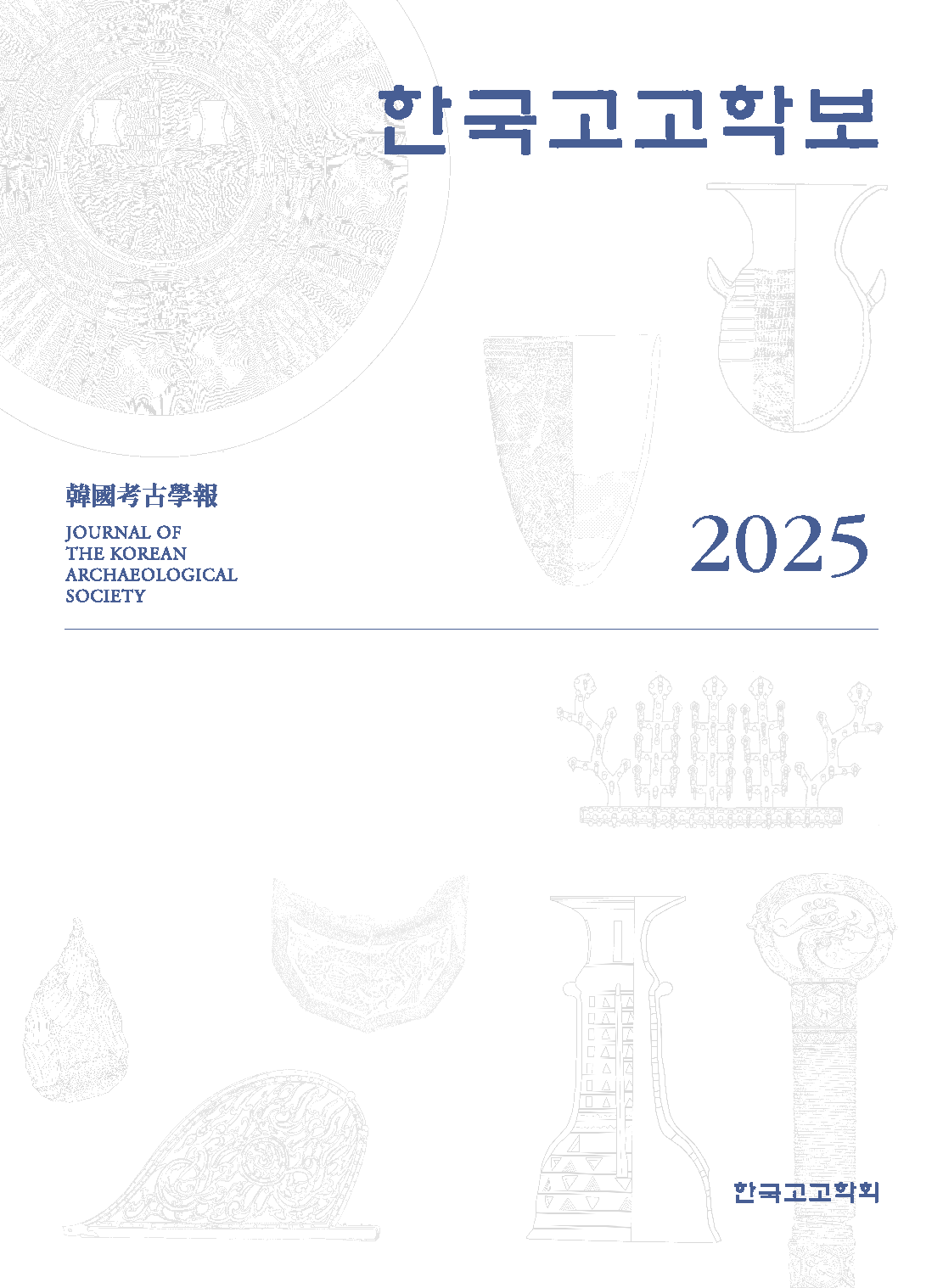
국문 초록
본고의 주제는 고 김해만의 해반천 일대에 청동기시대에 조성, 기능한 대성동 환구Ⅰ・Ⅱ의 공간구조와 추정 범위, 성격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 성과와 같이 2개소 환구는 의례공간으로 막연히 비정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까지의 대성동 환호 조사 성과를 경관고고학 관점에서 중서부, 영남 내륙~남해안의 의례환구촌락 특성과 비교해 분석하였다. 대성동 환구Ⅰ은 의례적 성격의 환호로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환호Ⅱ의 5열 다중환구는 가장 내측의 ⅰ열 환구 내부에서 제사장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거지와 의례용 수혈로 보이는 폐기장, 이를 구획하는 목책열, 추정 입목 고정용 수혈 등이 확인되어 이 내측 공간을 단순한 주거역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내부 출토 토기로 보건대, 대성동의 2개 환구유적은 후기 무문토기부터 점토대토기 단계에 걸쳐 동 시기 전후로 기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환구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문헌사료 중 『三國志』의 마한의 제천 행사와 읍락 수장인 천군의 제사공간인 ‘소도’의 양상을 두고 상정해 보았다. 중서부 및 영남 지역의 의례적 성격의 ‘환구’촌락 공간구조와 비교했을 때, 구지봉 구릉 정상부를 감싸는 대성동 환구Ⅰ은 환구와 함께 내부의 경작 관련 유적은 읍락 내 독립적 제의권이 보장된 별읍, 제천의례 행사가 거행되던 소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환구Ⅱ 내부의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의 토기와 각 호마다 보이는 다수의 수혈 및 주혈군은 청동기시대 토착의 의례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환구Ⅰ・Ⅱ 사이 현 대성동 일대 촌락군의 내외 공간에 존재했던 의례・구획성 환구촌락의 공간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 의례와 정치적 중심지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고 김해만 해반천변에서 의례용 환구의 조성과 함께 발전했음을 방증한다. 이를 실현한 물질적 사회체제는 재지 청동기문화와 북방 이주민계의 초기 철기문화가 융화한 복합사회를 기반으로 했으며, 대성동 의례환구촌락이 해반천의 촌과 소촌을 결합시킨 대촌으로 추정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examines the spatial structure, extent, and character of Daesung-dong Ditched Enclosures I and II, which functioned as ritual spaces in the Haedongcheon Stream area of ancient Gimhae Bay during the Bronze Age. Analyzing recent excavation fin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archaeology, these enclosures are compared with similar ritual circular ditches in the mid-western and Yeongnam regions. Daesung-dong Ditched Enclosure I, which encircles Gujibong Hill, along with its internal features, is interpreted as a ‘separate settlement (byeol-eup)’ with independent ritual authority. It is presumed to have functioned as a ‘sodo,’ a ritual space for the village headman (cheongun) as described in historical accounts. In contrast, Daesung-dong Ditched Enclosure II, a five-ring ditch, contains features like a dwelling presumed to be a priest's residence and a refuse pit for ritual purposes. The presence of pottery from the Bronze Age to the early Iron Age suggests it may have been an indigenous ritual space linked to the earth god. The study concludes that both enclosures were broadly contemporaneous, representing a ritual ditched enclosure village. This settlement, which combined villages and smaller settlements in the Haebancheon area, is considered a 'large village (daechon)'. The material and social system that enabled its development was based on a complex society formed through the fusion of indigenous Bronze Age and northern migrant cultures. This settlement is believed to be the prototype of the ‘euprak’ of Byeonjin-Guyaguk, which later shifted its center.
목차
Ⅰ. 머리말
Ⅱ. 고 김해만 해반천 일대 원사시대 생활유적과 대성동 환구 특징
Ⅲ. 대성동 환구Ⅰ・Ⅱ 유적의 공간구조 재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