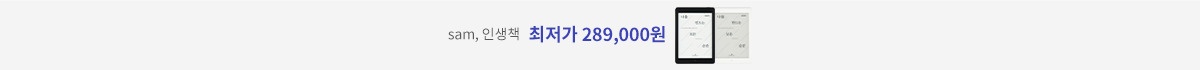- 영문명
- A Study on Settlement Relations in the Western Gyeongnam Region from the 3rd to 6th Century
- 발행기관
- 영남고고학회
- 저자명
- 김수민(Sumin Kim)
- 간행물 정보
- 『영남고고학』제103호, 115~14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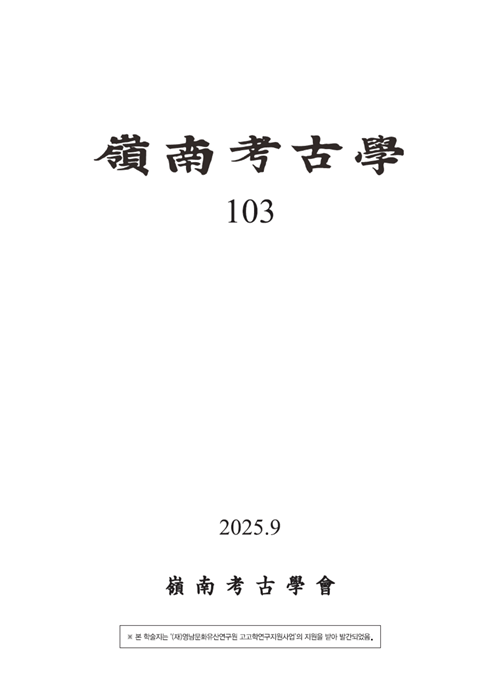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삼국시대 3~6세기 경남 서부지역 취락의 생활문화권 형성과 분화 과정을 통시적·미시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경남 서부지역 취락은 대규모 취락을 중심으로 중소규모 취락들이 반경 5㎞ 내외에분포하여 여러 생활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3~4세기에는 삼한시대 주거문화가 지속되며, 각 생활문화권마다 아라가야계 토기의 기종이 달리 나타나서로 다른 문화 유입 경로가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5세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지리적·정치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생활문화권이 점차 공고화되며 주거문화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송정 생활문화권에서는 신라계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며, 대가야의 영향력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독자적인 주거문화를 형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촌 생활문화권은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양한 외래계 유물들이 혼재되어 접경지역 취락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평거 생활문화권은 5세기 이후 다소 축소되지만, 소가야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에서 취락이 유지·전개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각 지역은 고유의 지리·사회·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외래문화와 주거 양식을 수용하며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결된 생활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경남 서부지역 취락은 외부 정치세력의일원적 지배가 아닌, 각 지역의 독자적 생활문화권이 교통과 정치·경제적 영향 속에서 상호 연결되며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residential cultural zones in western Gyeongnam during the 3rd to 6th centuries, using both diachronic and micro-analytical approaches. Settlements in this region were organized around large-scale villages, with smaller sites distributed within a 5 km radius, forming multiple interrelated cultural zones.
In the 3rd and 4th centuries, traditional Samhan-style dwelling practices persisted, but distinct types of Ara-Gaya pottery across each zone suggest different cultural inflow routes. From the 5th century onward, changes in housing styles and settlement structures reflect the growing influence of regional geography, politics, and society on the consolidation of localized cultural zones.
For instance, the Songjeong cultural zone displays Silla-type dwellings and Daegaya pottery, yet also preserves unique burial traditions, implying cultural autonomy under external influence. The Hachon zone, situated along key transportation routes, shows a mix of Gaya, Baekje, and Mahan artifacts, underscoring its role as a borderland settlement. Meanwhile, although slightly reduced in scale, the Pyeonggeo zone continued to show sustained influence from Sogaya through the 5th century.
These patterns demonstrate that the settlements developed their own distinct cultural spheres, shaped through dynamic interactions with various external powers—not by uniform control, but through interconnected and adaptive local systems.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 유적
Ⅲ. 취락 시설과 토기 검토
Ⅳ. 3~6세기 경남 서부지역 취락 생활문화권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