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f the “Jungtaryeong” Section in Pansori : Focusing on the Styles of Park Bong-sul and Jeong Gwang-su
- 발행기관
- 판소리학회
- 저자명
- 서정민(Jeong min Seo)
- 간행물 정보
- 『판소리연구』제60집, 263~30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언어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1
7,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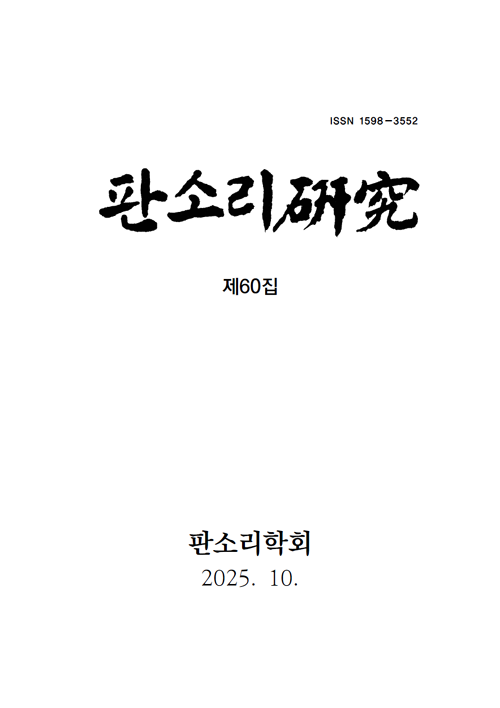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동편제 계보로 알려진 박봉술과 서편제 계보로 알려진 정광수의 <흥보가> 중 ‘중타령’을 비교·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흥보가>에서 ‘중타령’은 이야기 전개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대목이다. 비범한 인물의 등장으로 판소리 전판에서 적게 사용되는 ‘엇모리’로 연행되며, 모든 창자가 동일한 장단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흥보가>의 유파는 현재 아홉 가지로 구분되나 큰 갈래는 동편제와 서편제 두 갈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흥보가>의 계보를 살피고, 동·서편 계열의 연구 대상을 박봉술과 정광수로 선정한 뒤 두 창자의 ‘중타령’을 사설, 장단, 붙임새, 악조, 구성음, 시김새, 선율 진행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창자의 ‘중타령’ 사설은 상이하였다. 박봉술은 동편 계열의 소리로 알려진 강도근, 박녹주 등의 창본들과 유사하였고, 정광수는 서편 계열의 박동진, 박초월과 유사하였다. 음악적 양식을 제외한 사설만으로도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단은 두 창자 모두 엇모리였으나 박봉술이 정광수에 비해 빠르게 연행하고 있었고, 이는 정광수의 선율 진행과 다양한 시김새 사용이 박봉술에 비해 많은 장단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창본 사설의 장단도 정광수가 5장단 많았다. 장단 붙임새는 두 창자 모두 대마디대장단의 사용이 많았고, 뻗음의 횟수가 4회로 일치하였으나 뻗는 부분은 상이하였다. 그 외의 엇붙임으로는 박봉술만 교대죽 2회, 밀붙임 3회를 사용하고 있었고, 정광수는 잉어걸이를 2회 사용하는 차이가 있었다. 악조는 두 창자 모두 B본청 계면조로 일치하였고, 시작음과 종지음이 F#과 B로 일치하였으며, 음폭 또한 15도로 일치하였다. 마디별 구성음은 박봉술이 ‘G’음정 구성이 정광수에 비해 27마디 많았고, 정광수는 ‘(c)B’로 꺾는 음정이 박봉술보다 6회 많았으며, 전체 대목의 계면조 퍼센테이지도 박봉술이 41%, 정광수가 79%로 정광수가 계면의느낌이 더 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창자의 시김새 중 꺾는 목은 정광수가 박봉술에 비해 많았으며, 그 외의 시김새도 정광수가 더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박봉술이 선호하는 시김새는 흘러내리는 시김새와 퇴성으로 시김새로 계면의 느낌을 주고 있었고, 정광수는 앞·뒷 꾸밈음과 끝음을 드는 시김새를 많이 사용하여 시김새에서 우조의 느낌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 사설에서의 선율진행 또한 두 창자가 상이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며, 뻗음을 포함한 선율 진행은 정광수가 많았다.
박봉술과 정광수의 <흥보가> 중 ‘중타령’ 비교 결과 동편 계열의 박봉술이 우조느낌을 더 구사하고 있었고, 정광수는 서편 계열의 계면조 느낌을 더 짙게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Jungtaryeongsection of Heungbogaas performed by Park Bong-sul of the Dongpyeonje lineage and Jeong Gwang-su of the Seopyeonje lineage. Jungtaryeongserves as a turning point in the narrative and is distinguished by its rare use of the Eotmorirhythm, which is performed consistentlyby all singers. The analysis focuses on text, rhythm, rhythmic placement, mode, pitch content, ornamentation (sigimsae) , and melodic pro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Park’s text aligns with Dongpyeonje traditions, while Jeong’s corresponds to Seopyeonje sources. Both employed Eotmori, but Park sang at a faster tempo, whereas Jeong’s slower pace allowed for richer melodic development. In rhythmic placement, both used daemadi-- daejangdan with four extended notes; however, Park alone employed gyodaejuk and milbutim, while Jeong used ingeogeori . Both performers adopted gyemyeonjo centered on B, yet Jeong’s greater proportion of gyemyeonjo passages and frequent pitch bends produced a stronger modal color. Regarding ornamentation, Park favored descending figures and toeseong, whereas Jeong employed a broader range, including grace notes and raised endings. In conclusion, Park Bong-sul’s Jungtaryeong reflects the ujo tendencies of Dongpyeonje, while Jeong Gwang-su’s rendition emphasizes the deeper gyemyeonjo qualities of Seopyeonje.
목차
1. 서론
2. 박봉술제와 정광수제 <흥보가> 중 ‘중타령’ 비교
3. 결론
참고 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판소리연구 제60집 목차
- <심청전>의 광고 재현과 의미: LG gram 360 광고를 사례로
- 임진택의 창작판소리에 대한 문학적 접근 3: 위인 판소리를 대상으로
- 채만식 희곡 <심봉사>(1936) 속 안맹(眼盲) 형상화와 비극 구조의 의미 재고
- 심정순 구술 판소리 작품의 특징과 의미
- 오늘날 창작판소리의 경향과 학술적 과제
-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본 K-컬처의 전지구적 확장과 K-헤리티지의 실천적 재구성
- 혼종성 시대 문화전략으로서 K-컬처 분석 및 판소리의 글로컬 확산 전략 - BTS ‘대취타’부터 이자람 ‘억척가’까지
- ‘참여적 서사화’의 측면에서 본 스트리트 댄스의 전통 문화예술 재맥락화 양상 - 범접의 <몽경(夢境)- 꿈의 경계에서>을 중심으로
- 영화 〈마담 뺑덕〉에 나타난 고전 콘텐츠 변용과 그 의미
- 판소리 <흥보가> 중 ‘중타령’ 비교 연구 - 박봉술제와 정광수제를 중심으로
- 유가(遊街)의 경비(經費)와 재인·광대의 보수(報酬)
참고문헌
관련논문
인문학 > 언어학분야 BEST
- ChatGPT 기반 TOPIK 말하기 평가피드백 모형 개발 및 적용
- AI 기반 피드백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탐색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에서의 논점과 설계 근거
인문학 > 언어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