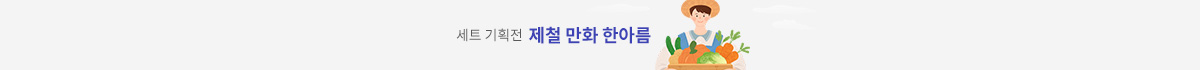- 영문명
- Plantational Landlord System in the First Half of Cho-sun Period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 이세영(Lee, Se-young)
- 간행물 정보
- 『역사문화연구』제45집, 43~107쪽, 전체 65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2.28
10,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조선 건국 이래 16세기 후반까지 국왕과 함께 여러 정책을 강구・실시하면서 정치를 주도했던 정치세력의 한 축은 功臣 출신의 宰相그룹인 ‘勳臣勢力’이었다. 조선 전기에 가장 전형적인 훈신세력은 5공신(靖難・佐翼・敵愾・翼戴・佐理 功臣) 출신의 院相들이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先秦時代 이래의 儒家의 사상과 이념을 수용하면서도 조선봉건사회와 국가의 경영에 있어서 정치사상과 이념, 그 실천방략과 정책에서 결집력을 지닌 정파나 정치세력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전제군주인 왕・왕권과 밀착된 최고위의 관료집단이자 봉건지배층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러한 훈신세력의 ‘豪富論’은 周代의 ‘世祿制’에서 그 정당성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魯나라의 정승 公儀子가 ‘拔圓菜 去織婦’한 까닭을 애써 외면하고, 모든‘仕者’들은 ‘世祿’을 보장받아야만 하고, 그의 ‘벼슬이 높아지고 祿도 두터워져서 富者가 되는 것은 天命’이 있기 때문이며, 市井 사람들이 조그만 이익도 계산하여 미치지 못할 세라 낮에도 헤아리고 밤에도 생각하나 ‘가난함을 免하지 못하는 것은 天命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豪富 = 天命’이라는 것이었다. 또 ‘仕者’들이 世祿을 받지 못하거나 그것이 끊길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殖貨致富’하는 것은 전혀 ‘不義’한 일이 아니며, 家門과 門戶를 유지하고 廉恥와 節義를 키우기 위해서는 도리어 그것이 필요하다고까지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훈신세력의 豪富論은 그들로 하여금 이내 ‘貪官・貪墨’이 되게 했고, 당시 財力의 상징인 農莊을 광범위하게 조성하게 함으로써 조선 전기의 전국적인 농장의 발달을 가져왔다.
조선 초기 훈신세력이 고수했던 對私田施策의 핵심은 功臣田・別賜田만은 경기 토지로 折給받아 世傳한다는 것이었다. 봉건지배층은 적어도 前朝의 사전의 폐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私田主의 수조권 행사를 감독・관리할 수 있는 경기의 토지로 사전(공신전・별사전・과전・직전)을 분급한다는 것과 경기 밖의 외방은 祿俸田・軍資田 등의 公田으로 확보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훈신세력은 稅穀船의 遭難으로 인한 외방의 軍資田租, 즉 軍糧의 손실을 막기 위해 왕과 사림세력이 그 대책으로 제안한 ‘私田外方移給’을 반대했고, 공신전・별사전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과전 액수를 줄이기 위해 과전법을 직전제로 개정하기도 했다(세조 12년, 1466). 또한 그들은 흉년이나 外患 등의 비상시에 國用・軍資 등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림세력이 제안한 ‘私田還收’를 반대했으며, 그러나 늘 田租의 濫收를 지적받아 오던 터에 비상시에 당면해서 공신전・별사전의 전조를 ‘半收’하거나, 職田의 전조를 ‘全收’하는 ‘官收官給制’(성종 9년, 1478)를 마지못해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私田主의 수조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했던 ‘관수관급제’도 ‘己卯士禍’(중종 14년, 1519) 이후에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시적으로 사전을 外方에서 移給받기도 하고, 수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도 했지만, 조선 전기 내내 공신전・별사전과 과전・직전 등의 사전을 경기 토지로 折給받아 世傳하고 家産化하여 농장을 조성하고 경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별사전은 亂臣의 籍沒田으로 賜給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처럼 收租地로 이루어지는 ‘私田型 農莊’은 주로 경기도에 있었지만 별사전으로 인해 下三道에도 있었으며, 조선 전기에 발달한 농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건국 직후부터 陳荒處와 海澤의 開墾을 권농정책의 하나로 수립하고 추진해 갔다. 고려 말기 이래 파괴되어 버린 농업생산기반을 복구하고 확대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였던 것이다. 그 개간정책의 하나가 고려시기
의 賜牌를 계승한 立案法이었다. 이는 훈신세력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豪勢家들이 토지 집적과 겸병의 수단으로 진황처를 廣占하는 것을 금지하고, 民人들에게 입안을 발급해 주어 진황처를 개간하고, 그 개간지의 所有主가 되게 하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입안을 적극적으로 발급받아 개간을 주도했던 것은 宮家・勢家・士大夫・豪族 등이었다. 진황처나 해택 개간에는 무엇보다도 많은 노동력과 경영자본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
영문 초록
The vassals of merit, the group of ex-prime ministers were one of the power circles which devised and enforced various policies together with the king ever since the founding of Cho-sun Dynasty up until the later 16th century. The 5 vassals of merit(Jeongnan 靖難, Joaik 佐翼, Jeokgae 敵愾, Ikdae 翼戴, Joali 佐理 功臣) were the most typical circle of the meritorious retainers in the first half of Cho-sun Dynasty. Despite of accepting Confucius' thought, they never comprised a political group coming up with both political ideology and the policies of its execution in the state administration. Being the highest bureaucrats close to the king, they just wanted to execute power and to retain vested rights.
They tried to seek the justification their idea of wealth in the salary system of Chou Dynasty. Intentionally denying the reason behind the act of a prime minister of Lu, Gongyizi's "removing the garden vegetables and expelling the spinning wife", they thought that all the officials should be guaranteed with the salary. Moreover, they ascribed it to the Mandate of Heaven that the fortunes on the part of the officials and the deprivation on the part of common peoples. In short, they equalized the fortunes with the Heavenly Mandate. They even thought to the extent that it was not against justice to make fortunes by any means when the salary was not bestowed, which, according to them, was inevitable to support the families and to keep the sense of honor. These ideas were contributed to the genesis and ensuing development of plantations, the symbol of wealth. It, however, led the vassals of merit to become the corrupt officials and greedy scholars.
The gist of the private land policy that the vassals of merit stood pat was seeing to it that only lands of vassal of merit and special bestowment be inherited with the land of Gyoung-gi. In order not to repeat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previous dynasty's private lands, the ruling class agreed to the two fundamental principles. One was that the private lands(land of meritorious retainers, land of special bestowment, land for the noble class, and duty land) be distributed with the lands of Gyoung-gi which was convenient for supervising and controlling the rights of the land owners of collecting dues. The other was to secure the public lands such as the salary land and the military aid land in case of provincial lands which was outside of Gyoung-gi. The meritorious powers, however, opposed to "the distribution of the private lands with provincial lands" which
was proposed by the king and the Confucian powers to protect the loss of provisions caused by the grounding of the duty grain ships. And they replaced the law of Gwajeon 科田法 with the law of duty lands 職田法 to secure the lands of meritorious retainers and special bestowment and thereby reducing the number of the nobility
lands(Sejo 世祖 12th year, 1466). They opposed to "the restitution of the private lands" which was proposed by the Confucian circles as a fundamental countermeasure for making up for the losses both in the government use and military aid caused by the emergencies such as the famine year and external trobles. However, in the wake of the criticism for the abuse of land dues collecting, they reluctantly paid half of the land dues for the lands of vassal merit and special bestowment, and unwillingly accepted "the system of government -collect government-distribution"(Seongjong 世宗 9th year, 1478) according to which they were obliged to pay the whole of dues for the duty lands. However, the system which temporally curbed the rights of dues collection on the part of the private land owners was abolished after Gimyosahwa 己卯士禍(Jungjong 中宗 14th year, 1519).
목차
Ⅰ. 序論
Ⅱ.‘私田型’農莊
Ⅲ.‘開墾型’農莊
Ⅳ. 結論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