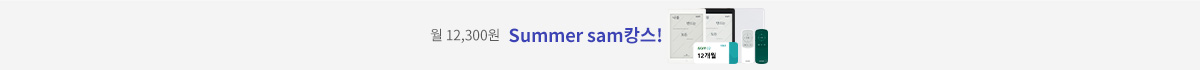학술논문
『구사론』의 소속 부파에 대한 고찰: 담혜(湛慧)와 쾌도(快道)의 견해를 중심으로
이용수 0
- 영문명
- A Study on the Sectarian Affiliation of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Focusing on the Views of Danghae(湛慧) and Kaido(快道)
- 발행기관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 저자명
- 김남수(해진)
- 간행물 정보
- 『불교와 사회』제17권 제1호,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불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아비달마구사론』은 4세기경 인도의 논사 세친(世親)이 저술한 아비달마 논서이다. 중국의 전통 주석가들은 그 부파적 귀속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담혜(湛慧)의 『아비달마구사론지요초阿毘達磨俱舍論指要鈔』(이하 『지요초』)와 쾌도(快道)의 『아비달마구사론법의(阿毘達磨俱舍論法義)』(이하 『법의』)에서 그 논의의 양상과 함께 자신들이 주장하는 견해까지도 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담혜가 제시한 세 가지 견해와 평론 그리고 이에 대한 쾌도의 반론을 고찰하여 『구사론』의 부파적 귀속 문제를 논의하고, 그 타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구사론』의 부파적 귀속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이해하고, 나아가 20부파라는 범주 안에서 『구사론』은 설일체유부라는 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담혜가 비판적으로 정리했던 여러 견해를 살펴보았다. 담혜는 부파적 귀속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구사론』을 설일체유부의 논서로 보는 견해이고, 둘째는 경량부의 논서로 보는 견해이고, 셋째는 어느 한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셋째는 다시 둘 모두에 속한다는 견해와 이치가 뛰어난 것이 종지가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다음으로 담혜의 평론과 결론을 정리하였다. 담혜는 이러한 세 가지 견해를 인용하고 평론한 뒤, 이치가 뛰어난 것이 종지가 된다는 보광과 법보의 견해를 계승하여 『구사론』은 구사종이 종지가 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담혜의 결론은 부파불교에서 『구사론』이 갖는 교판적 위상에서 바라볼 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담혜의 견해에 대한 쾌도의 반론과 결론을 정리하였다. 쾌도는 담혜의 결론에 대해 구사종이란 결국 소승의 설일체유부를 가리키는 것이라 반론한다. 그는 세친이 『구사론』 본문에서 설일체유부를 ‘우리 종[我宗]’이라고 언명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비록 유부의 정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취지는 유부의 종의를 장엄하기 위한 것이며, ‘傳說’이란 표현 역시 유부를 논파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유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20부파에 한정할 경우 『구사론』은 설일체유부에 소속한다는 것이 쾌도의 결론이다.
영문 초록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is an Abhidharma treatise composed in the 4th century by the Indian scholar Vasubandhu. Traditional Chinese commentators have held various views regarding the sectarian affiliation of this work. Previous discussions on this matter are well illustrated in Kusharon-yubiyosyo(『俱舍論指要鈔』)by Danghae(湛慧) and Kusharon-Hogi(『俱舍論法義』) by Kaido(快道). These two works not only present the contours of the debate but also reflect the authors’ own stances, making them valuable resourc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three views and critical evaluations presented by Danghae, along with the rebuttals offered by Kaido, in order to discuss the sectarian affiliation of the Kośa and evaluate the validity of these perspectives. Through this inquiry, the study seeks to better understand the diversity of opinions concerning the Kośa's affiliation and to affirm the interpretation that the Koś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wenty sects of early Buddhism, is fundamentally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Sarvāstivāda.
The paper first reviews the multiple interpretations that Danghae critically summarized. He categorized the sectarian affiliation issue into three main positions: (1) that the Kośa is a treatise of the Sarvāstivāda; (2) that it belongs to the Sautrāntika; and (3) that it belongs to neither. The third view is further divided into the opinions that it belongs to both and that the sect with superior reasoning becomes its foundation.
Next, the paper outlines Danghae’s critique and conclusion. After presenting and analyzing the three views, Danghae adopts the opinion of Puguang (普光) and Fabo(法寶), who argued that superior reasoning should determine the doctrinal base, and concludes that the Kośa is grounded in what is called the “Kośa-school(俱舍宗)”. This conclusion is notably persuasive when viewed within the doctrinal classifications of sectarian Buddhism.
Finally, the paper considers Kaido’s rebuttal and conclusion. Kaido argues that the so-called “Kośa-school” ultimately refers to the Hīnayāna Sarvāstivāda. He supports this view by pointing out that Vasubandhu refers to the Sarvāstivāda as “our school” in the Kośa. Although there are aspects of the Kośa that deviate from the orthodox Sarvāstivāda position, Kaido argues that these are intended to elaborate or refine the Sarvāstivāda doctrine. Even the expressions such as “it is said(傳說)” is not meant to refute or criticize the Sarvāstivāda, but to supplement its shortcomings. Thus, Kaido concludes that when limited to the context of the twenty sects, the Kośa should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Sarvāstivāda.
목차
Ⅰ. 서론
Ⅱ. 구사론의 소속 부파에 대한 3종 견해
1. 제1설-설일체유부에 속함
2. 제2설-경량부에 속함
3. 제3설-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음
Ⅲ. 3종 견해에 대한 담혜의 평론 및 결론
1. 제1설(유부소속설)에 대한 평론
2. 제2설(경부소속설)과 제3설에 대한 평론 및 결론
Ⅳ. 쾌도의 반론 및 결론
1. 구사종에 대한 반론
2. 제2설과 제3설 평론 및 담혜에 대한 반론3. 유부소속설 비판에 대한 반론 및 결론-설일체유부에 속함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Harmony Unveiled: Exploring the Convergence of Buddhism and Scientific Thought
- 호국불교의 새얼굴, 호국대전의 미래를 위한 제언
- 『구사론』의 소속 부파에 대한 고찰: 담혜(湛慧)와 쾌도(快道)의 견해를 중심으로
- 연명 의료에 대한 불교적 접근
- 서간문에 나타난 출가 초기 법정의 사상 고찰: 『마음하는 아우야』를 중심으로
- 소외(疏外)와 고(苦): 마르크스주의와 불교의 자연-인간(사회) 관계 비판과 대안적 이해
- 대한불교관음종의 종헌 변천 연구: 종무권한 분석을 중심으로
- 모태신앙 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불교의 대응 전략: ‘법연신앙’의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 불교신도의 종교적 믿음과 낙관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