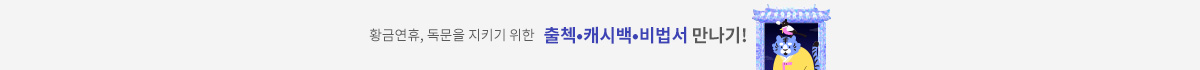- 영문명
- How Did“One Mind”Become the Basis of the World? : On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One Mind in the Awakening of Faith
- 발행기관
- 보조사상연구원
- 저자명
- 이상민(Sangmin Lee)
- 간행물 정보
- 『보조사상』第72輯, 9~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불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신론』의 일심사상이 400년대 초에 활동했었던 승위의 설에 영향을 받았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십지경』의 내용과 승위의 사상, 그리고 『기신론』이 찬술된 북조 지역의 문헌들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십지경』의 일심이 반드시 현상세계의 기반으로서의 일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승위의 해석에 나타난 일심은 현상세계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으로 일심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십지경』에 대한 고찰이라기보다는 남조 불교에 널리 퍼진 사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심’과 ‘일법’의 이원론적 사유는 『기신론』의 일심사상과 구분된다.
이와는 달리 6세기에 북조에서 번역된 『십지경론』은 명확히 일심을 알라야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알라야식은 청정과 염오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당시 북조의 학장이었던 보리유지가 번역한 『입능가경』, 그리고 그에 대한 교설은 일심=알라야식=여래장이라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북조에서 찬술된 문헌에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이미 『기신론』과 사상적, 지역적으로 직결되는 문헌이 있다면, 그 사상의 직접적 원인을 굳이 한 세기 전의 인물인 승위에까지 돌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기신론』의 일심사상은 역시 당시의 한역 경론과 그에 대한 해석에 기원하고 있다고 보는 쪽이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십지경함주서』와 『기신론』의 관계는 직접적 영향 관계보다는 보다 넓은 견지에서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의 연속적인 양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시 말해 두 문헌이 보여주는 놀라운 구조적 유사성은 단순한 인용의 결과라기보다는 동아시아 불교가 공유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사유 구조의 균질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undertakes a critical examination of prior scholarship claiming that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Dashengqixinlun, henceforth “Qixinlun”)’s doctrine of “one mind” (一心) was influenced by the thought of Sengwei (僧衛), a monk active in the early 5th century. To reassess this assertion, I have analyzed Shizhujinghanzhuxu (十住經含注序) ascribed to Sengwei, as well as the Buddhist texts composed in the Northern Dynasties of early 6th century, the region where the Qixinlun was compiled. The findings of this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While the notion of “one mind” in the Daśabhūmika Sūtra does not necessarily signify a foundational ground of the phenomenal world, Sengwei’s interpretation presents “one mind” as the mind that functions as the origin of phenomenal existence. However, this appears to reflect not so much a close reading of the Daśabhūmika Sūtra itself as it does a broader mode of thought prevalent in Southern Chinese Buddhism at the time. Above all, the dualistic framework distinguishing “one mind” and “one dharma” in Sengwei’s system differs substantially from the ontological conception of “one mind” articulated in the Qixinlun.
By contrast, the Shidijinglun (十地經論), translated in the sixth century in Northern China, explicitly identifies “one mind” with the ālayavijñāna, which is described as possessing a dual nature of purity and defilement. Furthermore, the Laṅkāvatāra Sūtra (入楞伽經), translated by Bodhiruci—one of the leading translators and exegetes of the Northern Dynasties—along with his associated doctrinal formulations, clearly articulates a conceptual structure equating one mind with ālayavijñāna and tathāgatagarbha. This structure, as my research shows, is faithfully inherited in Chinese-authored texts from the same milieu. In light of the existence of such conceptually and geographically proximate sources, there appears to be little necessity to trace the doctrinal origins of the Qixinlun back to Sengwei, a figure of the preceding century. From this perspective, it is more plausible to regard the Qixinlun’s formulation of the “one mind” doctrine as having emerged from the interpretative horizon shaped by contemporary Chinese translations of Indian scriptures and their exegetical tradi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십주경』의 일심과 승위의 일심
Ⅲ. 『십지경론』의 일심 해석과 두 가지 성격의 알라야식
Ⅳ. 보리유지의 사상 : 여래장과 알라야식, 그리고 일심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인문학 > 불교학분야 BEST
더보기인문학 > 불교학분야 NEW
- 빠알리 주석서(Pāli-aṭṭhakathā)의 해석과 방법 - anassuṃ의 용례와 주석을 중심으로
- 曇延『大乘起信論義疏』現行テクストの成立過程について
- 진억(津億)의 수정결사 재고 - ‘역사-비교 방법론’에 기반하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