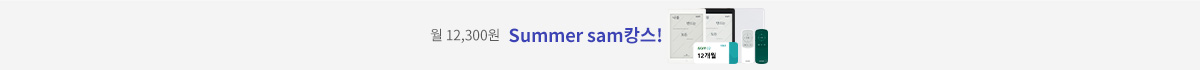- 영문명
- Confucian Scholars’ Use of Buddhist Temples and Interaction with Monks in Seventeenth-Century Joseon: A Focus on Maewon Ilgi (梅園日記)
- 발행기관
- 불교학연구회
- 저자명
- 윤혜민(Hye-Min YUN)
- 간행물 정보
- 『불교학연구』제83호, 197~22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불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매원일기(梅園日記)』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 매원(梅園) 김광계(金光繼, 1580~1646)가 경상도 예안현(禮安縣) 오천리(烏川里)에 거주하며 남긴 일기이다. 오천리에 정착한 광산김씨(光山金氏) 가문은 퇴계학(退溪學)의 학통을 계승한 가학(家學)을 형성하고 있었고, 김광계 또한 이러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산서원(陶山書院)과 역동서원(易東書院)의 원장을 여러 차례 역임하며 유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본 연구는 『매원일기』를 중심으로, 17세기 영남 지역 유학자의 사찰 이용 방식과 승려와의 교류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매원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운암사(雲岩寺)·용수사(龍壽寺)·성천사(聖泉寺) 등의 사찰 방문 기록을 통해, 유학자가 사찰을 과거 시험 준비, 독서, 병중 요양, 은신의 공간으로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광산김씨성회(光山金氏姓會)를 비롯한 친족·지인·관료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진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 공간으로도 기능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매원일기』에 등장하는 승려들과의 교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유학자는 승려들과 독서·담론·유람 등을 함께하며 감각적·문화적 소통을 지속했을 뿐 아니라, 책의 매매, 나루 개통, 암자 중수, 권선문(勸善文) 작성, 사찰 보수와 유지 등과 관련된 실용적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7세기 조선 유교 사회에서 사찰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으며, 유학자와 승려는 경쟁적이거나 배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상적 층위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였음을 조명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Maewon ilgi is the diary of Maewon Kim Gwang-gye (1580-1646), a Confucian scholar of mid-Joseon Korea who resided in Ocheon-ri, Yean-hyeon, Gyeongsang Province. The Gwangsan Kim clan, settled in Ocheon, had established a strong scholarly lineage rooted in the Toegye school of Neo-Confucianism. Building upon this academic foundation, Kim Gwang-gye served multiple terms as head of Dosan Seowon and Yeokdong Seowon, solidifying his position as a prominent scholar. This study examines how a seventeenth-century Confucian scholar in the Yeongnam region made use of Buddhist temples and interacted with monks, based on the records in Maewon ilgi.
His diary frequently mentions visits to temples such as Unamsa, Yongsusa, and Seongcheonsa, revealing that Confucian scholars utilized these sites as places for exam preparation, reading, recuperation from illness, and temporary retreats. These temples also served as local nodes of social interaction, where the Gwangsan Kim clan association and various relatives, acquaintances, and officials gathered and communicated.
Furthermore, an analysis of interactions with monks shows that scholars engaged in cultural and sensory exchanges such as reading, discourse, and excursions. They also engaged in practical collaborations through buying and selling books, opening ferry routes, renovating hermitages, composing gwonseonmun, and maintaining temple facilities, illustrating their coexistence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highlights the multifaceted roles of Buddhist temples seventeenth- century Joseon Confucian society. Rather than standing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Confucian scholars and Buddhist monks maintained close, everyday connections that transcended simple religious boundaries.
목차
I. 머리말
II. 유학자의 학문과 휴식 공간
III. 유학자의 네트워크 활동 공간
IV. 유학자와 승려의 협력과 공생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초기불교 명상의 현대적 변용과 가치
- ‘추론근거의 인식(jñāna)’에 관한 논쟁 연구
- 『범망경술기권제일』(T2797)의 문헌학적 연구 - 승장(勝莊)의 『범망경보살계본술기』(X686)와의 대조를 통한 문헌 동일성과 성립 연대, 저자, 문헌의 유통을 중심으로
- n그램 기반 슬라이스 유사도 분석을 활용한 종밀과 원효의 『대승기신론』 주석 비교 연구
- 『중론송』의 「관사제품」 분석 - 공성·연기·중도를 천착하여
- 『매원일기(梅園日記)』를 통해 본 17세기 유학자의 사찰 이용과 승려 교류 양상
- 조선시대 공주 마곡사(麻谷寺)의 사세(寺勢)와 국가적 위상 변화
참고문헌
- Saemulgyul 새물결
- Saemulgyul 새물결
- Saemulgyul 새물결
- Korea Studies Institute 한국국학진흥원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학 (Korean Studies Quarterly)
- 대구사학 (Daegu Sahak)
- PhD Dissertation 박사학위논문
- 영남학 (Yeongnamhak)
- 태동고전연구 (Tae-dong Yearly Review of Classics)
- 태동고전연구 (Tae-dong Yearly Review of Classics)
- 국학연구 (Korean Studies)
- 매원일기 (Maewon Ilgi)
- 지역과 역사 (Chiyeok kwa Yeoksa)
- 민속학연구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 문화사학 (Munhwasahak)
- 장서각 (Jangseogak)
- 남도문화연구 (Namdo Munhwa Yongu)
- 사림 (Sarim)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