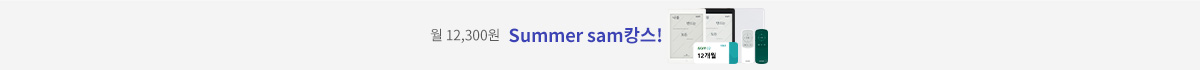- 영문명
- An Analysis of the Mūlamadhyamakakārikā’s Chapter on the Four Noble Truths: A Philosophical Inquiry into Emptiness, Dependent Origination, and the Middle Way
- 발행기관
- 불교학연구회
- 저자명
- 김귀옥(Kwie-Ok KIM)
- 간행물 정보
- 『불교학연구』제83호, 133~16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불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용수(Nāgārjuna)의 『중론』 제24장 「관사제품(觀四諦品)」을 중심으로, ‘공(空)’ 개념을 통해 사성제(四聖諦)와 불교 교설 전반이 어떻게 철학적으로 재정립되는지를 분석한다. 붓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믿음과 그 믿음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언어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붓다는 이러한 견해는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하며 연기론(緣起論)을 설파했다. 그러나 아비달마 불교는 연기(緣起)를 고정된 구조적 실재론으로 해석하면서, 자성을 전제한 법(dharma)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붓다의 연기론과 무아 사상을 왜곡하였다.
용수는 『중론』을 통해 이러한 실체론적 견해에 맞서 연기를 새롭게 해석하여 ‘공’으로 재천명한다. 「관사제품」에 등장하는 대론자는, ‘만일 모든 것이 공하다면’ 사성제를 비롯한 불법(佛法) 전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공을 허무주의나 단순한 무(無)로 오해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용수는 공성(空性), 공의(空義), 공용(空用)이라는 세 층위와, 세속제와 승의제라고 하는 이제(二諦) 개념을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그는 자성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사성제를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임을 지적한다. 특히 24-18 게송에서 선언하고 있는 “연기=공, 공=가명, 공=중도”라는 구절은, 연기적 세계관과 언어, 수행, 철학이 통합된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용수는 존재와 언어, 진리와 실천이 모두 자성을 갖지 않는 연기적 상호 의존관계에 그 기반이 있음을 밝히며, 불교 교설을 공에 의해 재구성한 「관사제품」의 철학적 의의를 명료하게 드러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Four Noble Truths and Buddhist doctrinal discourse are philosophically restructured through the concept of emptiness (śūnyatā) in Chapter 24, “Examination of the Four Noble Truths,” of Nāgārjuna’s Mūlamadhyamakakārikā. The Buddha taught that suffering arises from belief in fixed and unchanging substances, as well as from linguistic structures shaped by that belief. He regarded such views as rooted in ignorance about the nature of reality and presented dependent origination (pratītyasamutpāda) as the correct response.
However, Abhidharma Buddhism reinterpreted dependent origination in terms of structural realism, developing a dharma theory based on inherent existence (svabhāva) and thus distorting the Buddha’s original insights into non-self and conditionality. In response, Nāgārjuna reasserts dependent origination as emptiness, challenging all substance-based views. In Chapter 24, an opponent objects that if all phenomena are empty, then the Four Noble Truths and the Buddha’s teaching are undermined. Nāgārjuna refutes this by arguing that such a view results from a nihilistic misunderstanding of emptiness.
He counters with a threefold analysis of emptiness—its nature, meaning, and function—as well as the doctrine of the two truths: conventional and ultimate. He contends that it is attachment to essence, not emptiness itself, that undermines the truths. Verse 24.18—“dependent origination is emptiness, emptiness is designation, and emptiness is the middle way”—demonstrates how ontology, language, practice, and philosophy are unified within an interdependent, non-essentialist framework.
목차
I. 들어가며
II. 「관사제품」의 불교 철학적 의의
III. 24장 게송 분석 - 대론자의 비판, 용수의 답변
IV.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초기불교 명상의 현대적 변용과 가치
- ‘추론근거의 인식(jñāna)’에 관한 논쟁 연구
- 『범망경술기권제일』(T2797)의 문헌학적 연구 - 승장(勝莊)의 『범망경보살계본술기』(X686)와의 대조를 통한 문헌 동일성과 성립 연대, 저자, 문헌의 유통을 중심으로
- n그램 기반 슬라이스 유사도 분석을 활용한 종밀과 원효의 『대승기신론』 주석 비교 연구
- 『중론송』의 「관사제품」 분석 - 공성·연기·중도를 천착하여
- 『매원일기(梅園日記)』를 통해 본 17세기 유학자의 사찰 이용과 승려 교류 양상
- 조선시대 공주 마곡사(麻谷寺)의 사세(寺勢)와 국가적 위상 변화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