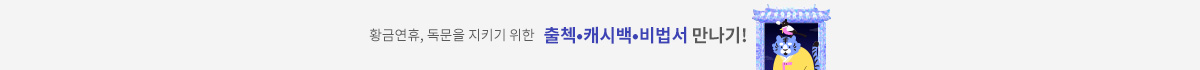- 영문명
- Han Empire and Several Ethnic Groups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저자명
- 김효진(Hyo Jin Kim)
- 간행물 정보
- 『중원문화연구』제30집, 287~336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1
8,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의 저자인 栗原朋信은 漢의 국가 구조를 內臣와 外臣으로 구분한 연구자이다. 즉 內臣은 京師 및 郡縣의 관료, 諸侯王ㆍ列侯 이하 有爵者가 해당하며, 모두 황제의 德化를 입고 禮ㆍ法을 받드는 대상이다. 外臣은 주로 異民族을 대상으로 하고, 禮를 보급할 뿐, 法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內臣과 外臣의 차이는 璽印의 격식에도 반영됐다고 하였다(栗原朋信, 『秦漢史の硏究』).
이 논문은 그러한 기존의 주장에 더하여, 外臣은 황제와 직접 관계를 갖는 이민족 군주에만 해당되고, 그 아래 세력은 민족 독자의 禮ㆍ法을 행한다고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栗原朋信의 內臣-外臣 구분론은 西嶋定生의 隋唐 시기 책봉 체제 연구나 工藤元男의 秦의 천하 인식 연구, 熊谷滋三의 ‘蠻夷降者’ 연구 등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본학계 내의 秦漢時代史 논고 등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栗原朋信이 內臣-外臣 논리를 漢代 전반에 적용해서 설명했다는 점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예를 들면, 漢初에 중앙과 諸侯王國은 행정ㆍ경제ㆍ군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념상 ‘外’ 신하였다고 보고, 애초 일괄된 국가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漢初에는 冠帶印綬나 의복 제도에 따른 준별 또한 불분명했다고 한다. 그 구체적 구분이 가능하게 된 시기는 武帝期로 추측한다(阿部幸信).
禮와 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內臣과 外臣의 이분법적 이해 자체를 비판하고, 漢이 외부 집단의 실정에 대응한 각각의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史記』에서 外臣이란 단순히 ‘他國을 섬기는 자’ 정도의 용례로 주로 활용됐고, 栗原朋信의 해석은 南越ㆍ朝鮮 정도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漢代 諸侯王國은 실질적 독립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栗原朋信이 정의한 ‘外臣’은 諸侯王國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高津純也).
사실 漢代 前半期의 동아시아는 漢, 南越, 匈奴, 衛氏朝鮮 등, 여러 帝國과 王權이 병존하고, 그들 사이에 정치적 중층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武帝 시기의 원정으로 郡縣化가 실현됐고, 중층 구조의 해체, 즉 內臣-外臣 구조도 해체를 맞이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外臣은 漢 帝國의 형성 과정에 출현한 주변 지역의 왕권에 대한 독자 규정이며, 武帝期에 帝國 편성의 완성과 동시에 소멸시켜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渡邊信一郞). 역자의 생각에는, 연구사적으로 栗原朋信의 주장은 초기적 요소를 띈다고 본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세부적 또는 자료 용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의를 제기할 요소도 많다. 주지하듯이 外臣은 『史記』 朝鮮傳에도 언급된다. 衛滿朝鮮의 대외관계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栗原朋信의 주장에 대한 재검토나 그동안 쌓여온 일본 학계의 연구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영문 초록
목차
머리말
一. 漢과 주변 諸民族의 관계
二. 漢 帝國의 구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