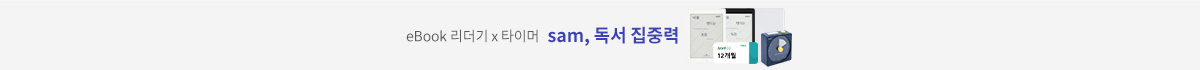- 영문명
- The Exploration the Original Meaning of ‘『詩』, 可以怨’ in 「Yang Huo」 of 『Lun yu』
- 발행기관
- 동방한문학회
- 저자명
- 홍유빈(You-bin Hong)
- 간행물 정보
- 『동방한문학』제99호, 7~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고는 『論語』에 나오는 ‘『詩』, 可以怨’이 가지는 원의를 탐구하고자 작성된 논문이다. 『논어』에는 공자가 자신의 아들이나 제자들에게 『詩經』을 공부하길 권하는 장면이 나오며, 「陽貨」편에 있는 ‘小子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도 그중 하나이다. 『논어』에는 ‘怨’이라는 말이 십여 회 이상 등장하는데, 그 대부분이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원망할 수 있다’는 의미의 ‘可以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난해한 면이 있다. 본고를 통해 역대의 설들을 살펴본 바, ‘『詩』, 可以怨’의 원의로서 古注인 『논어집해』에서의 ‘怨, 刺上政.’설이 가장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하가 임금을 위해 조언하는 간언의 맥락에서 나온 말인데, ‘『詩』, 可以怨’은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신하가 원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이러한 원망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나 임금을 걱정하는 따듯한 마음과 그 마음이 다치지 않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諷의 기법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淸代의 유보남과 朝鮮의 정약용의 설을 살펴보았다. 현재 전하는 『시경』의 시편들에 대해 毛詩의 「詩序」에서는 당대의 임금과 정치 혹은 사회상을 비판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그 토대에는 ‘怨慕’라는 근본정신과 ‘諷諭’라는 표현방식이 있음을 논의하면서 결론을 마무리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phrase “『詩』, 可以怨” in the Analects. In the Analects, Confucius encourages his sons and disciples to study the Book of Odes, and one of the most famous examples is “小子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 in the chapter on Yang Huo. The word ‘怨’ appears more than a dozen times in the Analects, most of which are used in a negative sense, meaning ‘one should not be hostile to others’, so it is difficult to know how to interpret ‘可以怨’, which means ‘one can be resentful’. In this paper, we have examined the theories of the past and found that the closest approximation to the original meaning of “『詩』, 可以怨” is “怨, 刺上政.” This is in the context of advice given by a vassal to his king, and “『詩』, 可以怨” implies that in this particular case, the vassal can reproach his king. However, such a complaint requires a requirement that makes it possible, which is a warm heart that is concerned about parents or king, and a technique of allegory(諷) that indirectly expresses that heart without hurting it. To fully understand this, we have examined the theories of Yu Bo-nam in the Qing Dynasty and Jeong Yak-yong in the Joseon Dynasty. As an example of this kind of reproach, I pointed out that the Mao-Shi(毛詩)’s prefaces to the Book of Poetry directly state that the poems criticize the kings, politics, or social conditions of the time, and concluded by discussing that Mao-Shi’s prefaces says is also based on the ‘fundamental spirit of reproachful but adoration(怨慕)’ and the ‘mode of expression of Allegory(諷諭)’.
목차
1. 머리말
2. 『論語』에 나오는 ‘怨’의 개념에 대한 검토
3. ‘『詩』, 可以怨’에 대한 古注와 新注
4. ‘『詩』, 可以怨’에 대한 淸代의 注와 茶山 丁若鏞의 견해 : 근본정신으로서의 ‘怨慕’와 표현방식으로서의 ‘諷諭’
5.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인문학 > 문학분야 BEST
- 근대 문학과 목격의 서사 : 이상 「날개」 연구
- 한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현대 사회에서의 재해석 -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 在日中国女性形象的话语建构研究 - 以≪朝日新闻≫和≪读卖新闻≫为例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