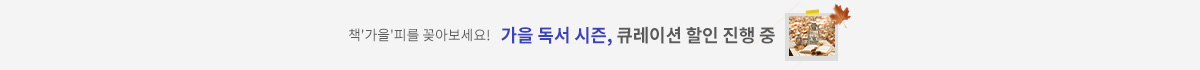- 영문명
- Study on How to Unify Font Name in Hangul Calligraphy
- 발행기관
- 한국서예학회
- 저자명
- 장지훈(Jang, Ji Hoon)
- 간행물 정보
- 『서예학연구』서예학연구 제27호, 400~426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예술체육 > 예술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한자서예의 서체는 시공을 초월하여 운필과 결구, 즉 서사의 형태에 따라 篆書 ․ 隸書 ․ 楷書 ․ 行書 ․ 草書 5체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한글서예의 서체는 약42종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서 마치 42종의 한글서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중 의 대부분은 한 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명칭이기 때문에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동일한 서체에 대해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결과이다. 40여 종의 한글서예 서체명칭은 형태적 특징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사용자 ․ 용도 ․ 책자 ․ 장소 등에 따라 임의로 부여되었다. 때문에 한글서예의 서체는 분류와 명칭에 있어서 서예학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마땅하다. 즉, 한글서예 서체의 분류와 명칭은 과거의 서체를 통섭하면서 현대를 아우르고, 후대로 계통성을 이어갈 수 있 도록 보편성과 체계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순수서예적 측면’에서 한글을 붓으로 서사하여 나타난 자형의 體勢가 지닌 ‘형태적 특징’에 따라 한글서체의 체계적인 분류와 명칭통일을 시도하 였다. 용필과 결구에 의한 서체의 분류는 일정한 시대나 특수한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여 형태적 계통성을 갖는 서체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곧음체’, ‘바름체’, ‘흘림체’, ‘진흘림체’ 4종으로 분류 ․ 제안하였다. 이 4종의 서체명칭과 분류체계는 서사자 ․ 장소 ․ 용도 ․ 도구 등의 조건에 상관 없이 붓으로 서사한 문자의 체세에 의한 형태적 특징에 따라 정리된다. 이는 산발 적으로 사용되었던 기존의 서체명칭과 분류에서 벗어나 ‘순수서예적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명명할 수 있는 방안이다. 수없이 다양한 서체를 포괄할 수 있 는 분류방법이며, 명칭 또한 순수한글로서 함축적이고 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Chinese calligraphy, the fonts a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 Zhuanshu, Lishu, Kaishu, Xingshu, and Caoshu - by the way of description such as the movement of brush or the structur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font of Hangul calligraphy, there have been used about 42 names so that it seems 42 different types of Hangul font are in use. Since a majority of them were made by one or two people, they are lack of universal validity in most cases, resulted from giving different names to the same font. About 40 kinds of font names in Hangul calligraphy have been classified not by physical feature but randomly by user, purpose, book, or place. Hence, the study in a calligraphic approach should be tried to establish the classification and name of the fonts of Hangul calligraphy. In other words, classification and name of the fonts of Hangul calligraphy should encompass the past and the modern while having universality and systemicity to be descended to the subsequent generation.
At the aspect of pure calligraphy, this study tries to make a systemic classification and the unity of names by physical feature in the shape of typeface presented in description of Hangul with brush. The classification of font by the use of brush and the structure is a way to classify the fonts as having physical systemicity not limited in specific times or certain situation, transcending time and space. In this way, this study makes classification, suggesting four types of font including Godeumche (Straight Font), Bareumche (Upright Font), Heulimche (Cursive Font), and Jinheulimche (Genuine Cursive Font). These four names of font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are arranged by physical feature in the shape of character described by brush, regardless of writer, place, purpose, or writing supplies. From the existing font name and classification sporadically used, this suggestion is the way of systemic classification and naming at the aspect of pure calligraphy. It is the classifying method that encompasses numerous different fonts and also makes it possible for the name of font itself to be recognized simply but implicitly as a pure word.
목차
Ⅰ. 서론
Ⅱ. 한글서예 서체명칭의 문제점
Ⅲ. 한글서예 서체분류와 명칭의 방향
Ⅳ. 형태적 특징에 따른 서체분류와 명칭통일 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東國眞體 서가의 독창적 自家體 창출에 관한 실증적 고찰
- 項穆 『書法雅言』의 創作論에 관한 고찰
- 근대 전북서단의 흐름에 관한 고찰
- 신라 서예의 다양성과 일관성 고찰
- 조선시대 한글 서체의 微加減法에 관한 고찰
- 한글서예 서체명칭의 통일방안 연구
- 조선중기 서화평론의 『장자』적 경향성에 관한 고찰
-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御筆形成에 관한 書藝的 考察
- 蔡邕 『筆論』에 나타난 ‘書者 散也’의 書藝美學的 考察
- 南漢山城 金石文의 書藝史的 考察
- ‘書如其人’에 대한 管窺
- 秋史 金正喜의 書藝精神論에 대한 考察
- 조선시대 한글 發記의 서예사적 意義 및 궁체의 典型 모색
- 『옥원중회연』 한글 필사본의 서지학 고찰과 서사기법
참고문헌
관련논문
예술체육 > 예술일반분야 BEST
- 생성형 AI 도구와 디자이너의 협업 프로세스 개발 - 이미지를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서 고해상도 렌더링까지
- 청소년기의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한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효과성 연구
-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예술체육 > 예술일반분야 NEW
- Z세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SNS 중독 경향성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즐거움과 몰입을 통한 수익성 기대가 NFT 구매 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분석: UTAUT2와 합리적 무관심(RI)을 중심으로
- 생태체험이 청소년의 자연친밀감, 환경태도,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