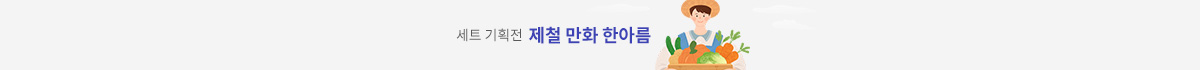- 영문명
- The study of excavated Baekje potteries from Songwon-ri tombs
- 발행기관
- 한국고대학회
- 저자명
- 조은하(Cho, Eun-Ha)
- 간행물 정보
- 『선사와 고대』先史와 古代 33輯, 301~34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7,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고는 송원리고분군에서 출토된 백제토기에 대한 연구로, 출토 토기의 분석과 부장양상의 검토를 통해 송원리고분군의 시간적 위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출토 토기 중 주요 기종을 중심으로 형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종 안에서 형식변화가 확인되며, 각 기종간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부장양상은 묘제별 특정과 공반기종의 변천을 통해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구토광 묘나 토광묘에 비해 횡혈식 석실묘에 부장되는 유물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이러한 양상은 무덤의 선택에 있어 위계에 따른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공반기종의 변천을 보면, 중형과 소형기종이 세트를 이루고 여기에 소형이나 대형 기종이 추가로 부장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중 중형기종이 단경호→광구장경호→광견호의 순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각 중형기종과 결합되는 소형기종으로는 삼족기 A형-단경호, 개배.외반구연소호-광구장경호, 개배.외반구연소호.심발형토기.고배-광견호 등이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었다. 유구의 선후관계와 부장양상의 검토를 통해 소형기종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대각의 부착’이라는 유사한 속성으로 기능적 유사성이 상정되는 대부직구소호와 고배는 유구의 중복관계를 통해 대부직구소호가 고배보다 선행하여 부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횡혈식 석실묘의 입지와 속성 변화를 통해 소형기종 중 개배와 심발형토기가 가장 늦은 시기까지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개별기종의 형식변천과 공반관계의 변화를 통해 송원리고분의 시간적 위치를 살펴보았다. 송원리고분군의 상한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은 KM-043호 토광묘 출토 원통형뚜껑으로 해당연대는 5세기 전엽에 속한다. 또한 웅진기에 확인되는 A-2 형 원통형기대와 역시 웅진기 이후로 편년되는 월평동 주거지 출토품과 일치하는 고배의 존재를 통해 475년 이후인 5세기 후엽까지 송원리고분군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송원리고분군의 축조 세력은 지방의 수장급에 해당하는 집단이었으나 수촌리 유적과 달리 위신재가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상급 위세를 가진 세력은 아니며, 수촌리에 비해 중앙과의 접촉이 적은 집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송원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지역양식의 고배, 광견호의 출토, 충청지역 고분에서 주로 확인되는 기종인 외반구연소호가 중요 기종인 점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As a study on excavated Baekje potteries from the Songwon-ri tombs, this paper aimed to discover the proper dating of the Songwon-ri tombs through an analysis of excavated potteries and a review of the pattern of their burial.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hape analysis focusing on the important potteries out of the excavated potteries, changes in form were confirmed within those potteries, and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order of the incidence between each type. Concerning the pattern of their burial, it was possible to discover the phase of change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by memorial service before a tomb and the transition of combined potteries. Compared to ditch tombs or pit tombs, the type of remains buried together in stone lined tombs and stone chamber tombs become diverse, and this pattern is achieved because of discrimination according to hierarchy in the selection of a tomb. Next, in looking into the transition of combined potteries, it was confirmed that medium-sized pottery and small-sized pottery are combined as a set, and small-sized pottery or large-sized pottery is additionally buried together in this set, in general. Then, the changes in the combination of their burial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um-sized pottery are observed. The burial of medium-sized pottery are identified as changing in the order of, short-necked jar→wide and long-necked jar→broad-shouldered jar through changes in combined pieces of pottery. Regarding small-sized pottery that are combined with each medium-sized pottery, tripod pottery. A type-short-necked jar, flat cup.small evaginate-necked jar-wide and long-necked jar, flat cup.small evaginate-necked jar.flat bottom deep bowl.mounted flat-cup-broad-shouldered jar were most frequently confirmed. Through the aforementioned transitional form of each piece of pottery and changes of the combined relationship, the proper dating of Songwon-ri tombs was considered. The upper limit of Songwon-ri tombs was found to be the early 5th century due to the cylinder-shaped lid excavated from the KM-043 pit tombs. Besides,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e central period as the 5th century through the wide and small-evaginate-necked jar and bowl stand. Also, through the A-2 type cylinder-shaped stand which was confirmed to be made during the Woongjin period, and the existence of a mounted flat cup that matches the excavated remains of the residential area of Wolpyeong-dong, which is chronicled after the Woongjin perio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Songwon-ri tombs existed until the latter 5th century, which is later than the year of 475.
목차
Ⅰ. 머리말
Ⅱ. 토기의 구성
Ⅲ. 부장양상
Ⅳ. 토기의 편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제강점기 ‘石器時代’의 조사와 인식
- 강원지역 구석기유적의 입지유형과 시기구분 연구
- 고고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대외교류 관계 검토
-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 일제강점기 한국미술사의 구축과 석굴암의 ‘再맥락화’
- 中國 永定河流域 前期 靑銅器時代 文化의 形成과 發展
- 중국 신석기시대 채도(彩陶)의 장식 개념과 목적
- 高句麗 壁畵古慣의 編年에 관한 檢討
- 송원리고분군 출토 백제토기 연구
- 일제강점기 '石器時代'의 조사와 인식
- 일본인의 신라고분 조사
- 百濟 西海岸地域 竹幕洞祭祀遺蹟에서 發見된 倭人의 浪逃과 그 意味
- 松隱 朴翊先生墓 出士遺物의 考古學的 解釋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