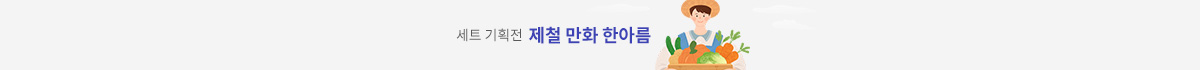- 영문명
- Research issues and controversies on the territory of Goguryeo
- 발행기관
- 백산학회
- 저자명
- 정호섭(Jung Hosub)
- 간행물 정보
- 『백산학보』第110號, 5~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4.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고구려 강역에 대한 주요 쟁점에 관해 살펴보았다. 700여 년 간 고구려의 세력권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고구려의 팽창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고구려 역사의 부침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따라서 고구려 세력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구려가 영토를 완전히 장악하여 장기간 직접지배가 가능하였던 1차적 강역과 일시적인 점유에 그쳤거나 세력 간의 중간지대 내지는 완충지대에 있었던 2차적 강역으로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다. 1차적 강역은 점의 집적을 통해 표시할 수 있는 바이지만 주로 자연지리적인 측면에서 강, 산맥 등을 수반한 어느 정도 선과 면의 개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일 것이고, 2차적 강역은 그런 표시가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상징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는 공간이면서 점유가 변화되는 공간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문화권’이라고 하는 관점은 강역과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각을 조금 달리해보면 고대국가에 있어서 강역은 당시 변경인들은 필요에 따라 이주 내지는 편입 등을 통해 삶을 영위하였을 가능성도 많고, 이종족의 존재양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역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러한 점도 착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구려가 같이 주변 여러 종족이 서로 접하고 있었던 상황과 다종족 국가임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일종의 변경지대는 세력 간의 갈등과 충돌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의 기능도 있어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특히 국경 지역은 그 정체성과 관할이 조정되고 재편되는 공간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강역의 범위를 쉽게 설정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강역을 연구함에 있어 고구려와 인접해있던 세력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역으로 추적해 본다면 고구려와의 경계에 대해 상호 보완되는 객관성을 담보해 낼 여지가 좀 더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다면 고대국가의 강역이나 경계는 선이 아니라 점의 집적 형태나 대역(일종의 zone)의 형태로 대략적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로 그러한 결과가 ‘세력권’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고구려 강역에 대한 연구도 ‘세력권’에 대한 이해로 귀결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력들 간의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이나 현상 그리고 인간들의 존재양태에 주목하여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로 이질적인 세력들이 만나고 충돌하며, 그런 가운데 같이 살아가면서 융합되고 공존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근거 없는 영역의 팽창 등으로 대표되는 의도된 서사의 역사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경계나 영역,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근거가 없거나 사료 비판 없이 무분별하게 설정하고 있는 관념적인 가상의 국경선들을 오히려 지워나가야 할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 이후 만들어진 강역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탈피하여야 역사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ddresses the main issues regarding the territory of Goguryeo. The spatial boundaries of Goguryeo had greatly changed over 700 years. The changes had corresponded with the trajectories of Goguryeo’s expansion and had been affected by the ebb and flow of Goguryeo’s power. Thus it is required to distinguish the primary territory under the long-term and direct Goguryeo rule and the secondary territory which had mostly been the buffering zone between neighbouring countries or temporarily controlled by Goguryeo.
The primary territory can be defined by not only connected dots in a map, but also geographical marks such as rivers, mountain ranges, creating the zones with lines. The secondary territory is more symbolically defined and its occupants had constantly changed. However, so-called ‘cultural domain’ is not considered synonymous with the territory.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frontiers in ancient kingdoms is significant because people living in marginal areas might have freely migrated by their needs and the habitation patterns of various tribes were varied. Considering Goguryeo as a nation of groups with multi-origins and the one facing many other countries,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the territories is crucial.
The marginal areas along the front line had played a role to buffer or avoid conflicts between power groups. In particular, defining the spatial boundary of certain country is difficult and must be carried out within historical contexts because its identities and governing bodies had constantly changed. On the other hand studies of territories can be supplemented by reviewing the cont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its neighbouring countries or power groups. Then it would ensure the objectivity in interpretations on territories.
In general, the boundaries or territories can be marked by the connected points in a map or the spatial zones. Such distinguished space can be understood as the zone with a certain political unit.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study of Goguryeo’s territory would be attributed to the issues of ‘power domain’ in future a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habitation patterns of human communities, and various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s.
Recognizing space where different groups had encountered, conflicted, compromised and co-existed is important. Thus we have to discard the conceptual or imaginary boundaries derived from the narratives of territorial expansionism and assumptions generated without firm evidence or critical reviews of the historical records. The objectivity of interpretations would be enhanced only if we abandon the collective and prejudiced concepts of the territory, which was form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modern nation-states.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고구려의 서ㆍ북쪽 강역에 대한 쟁점
Ⅲ. 고구려의 동ㆍ남쪽 강역에 대한 쟁점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