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Research on Singandaejabueumyeokmunsamju printed in Gabin-ja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저자명
- 김영진
- 간행물 정보
- 『동아한학연구』제21호, 149~18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어문학 > 언어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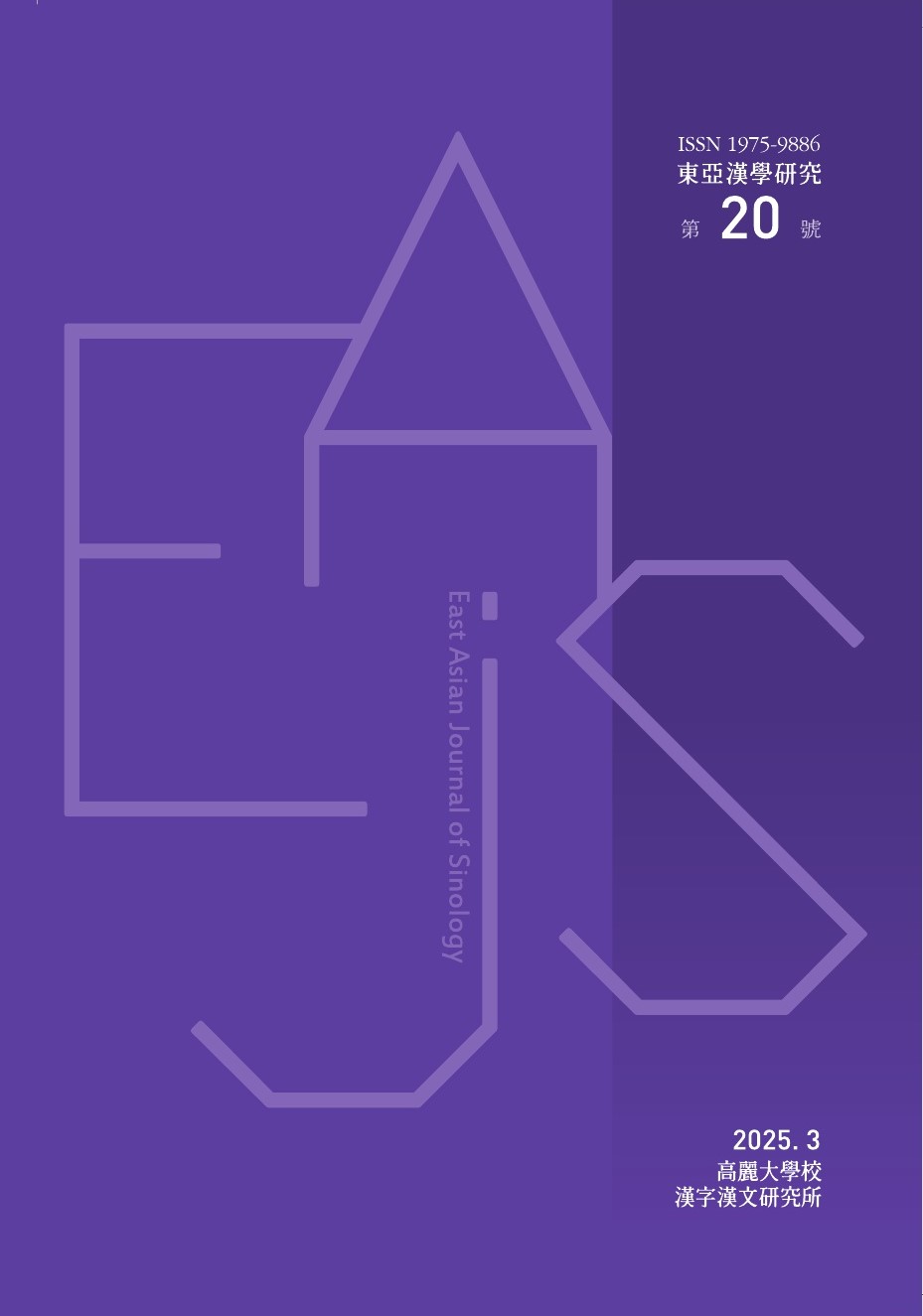
국문 초록
『新刊大字附音釋文三註』는 그 卷上-천자문, 卷中-영사시, 卷下-몽구로 구성되어 조선 중종 무렵 초주갑인자 금속활자로 간행된 책이다. 이 책은 원나라 때의 각본이 조선과 일본으로 유입되어 일본에서는 五山版으로 간행되고 조선은 갑인자로 간행되었음에도 이 자료의 실물과 이런 간행 사실은 최근에서야 알려지게 되었다. 住吉朋彦에 의해 慶應義塾大學 斯道文庫 소장 갑인자본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고, 이 갑인자본의 卷上인 천자문만을 따로 『新刊千字註釋』으로 목판 간행(1566年 淳昌 無量寺)된 사실이 沈慶昊에 의해 처음 거론되고 최근 朴徹庠에 의해 연구가 심화되었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서 『신간대자부음석문삼주』의 한・중・일 삼국에서의 유전 양상, 조선 갑인자본의 현존 양상 등을 종합 정리하면서 출판문화사적인 의의를 도출해보았다. 『신간대자부음석문삼주』는 조선 전기 초학 교재로서 중요한 의미를 띌 뿐 아니라 동아시아 삼국에서 유통과 수용이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에 현존 판본들에 대한 종합 정리와 연구성과를 재검토 함으로써 이 자료의 중요성을 재삼 환기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정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의 원나라 각본은 현재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명나라 각본 2종이 현존한다. 그 중 한 종은 상단에 그림이 있는 全相本이다. 원나라 각본은 조선에서는 16세기 초 초주갑인자본으로 다시 간행되었고 일본에서는 오산판으로 간행되어 유통되었다. 둘째, 조선 초주갑인자본은 현재 게이오대 사도문고 본이 가장 완정한 본이고, 임형택 본은 마지막에 두 장의 낙장이 있으나 역시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이 외에 연세대, 규장각, 계명대 본 등은 권별로 분책되어 있어 낱권 분책 유통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이 책의 필사본은 3권 1책의 완정한 것으로 조선에서 필사된 것이 임란 때 약탈되어 養安院에서 근세 島田翰으로 책의 소유 변천도 주목되는 사본이다. 셋째, 조선 갑인자본은 초학 교재로서의 많은 수요 때문에 이 책의 천자문만은 1566년 순창 무량사에서 목판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 책의 卷上 천자문은 주석본으로 음과 훈으로만 된 석봉 천자문이 조선에서 유행하기 이전의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주석본 천자문은 일본에서 오산판 이후에도 찬도부음증광고주천자문으로 17세기에도 여러 차례 간행되며 널리 전파되었다. 이 책의 卷中 영사시는 당나라 호증의 150수 연작으로, 이 역시 程敏政의 영사절구가 유행하기 전에 초학 교재로서의 호증 영사시의 유통을 보여주고 있다. 卷下 몽구는 당나라 이한이 유명 인물의 일화를 4언구 운문으로 지은 것을 송나라 때 서자광이 해당 일화의 원문과 주석을 보탠 것으로, 조선 전기에 일정한 초학 교재로 사용되다가 주자학적 요소가 훨씬 강화된 유희춘의 『속몽구분주』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에도 몽구가 여러 차례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 『舊註蒙求考異』가 간행되어(1800년, 1814년 두 차례 간행되었음) 일본에 있던 여러 이본들을 종합하여 상세한 고이가 진행된 본도 나왔다. 이 책의 저자인 龜田鵬齋(1752~1826)가 쓴 제요에는 조선판도 참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朝鮮本. 正統十一年(1446)全羅道錦山郡刻本. 倂注解千字文, 通爲四卷.”)
영문 초록
《新刊大字附音释文三注》由上卷《千字文》、中卷《咏史诗》、下卷《蒙求》三部分构成, 朝鲜中宗时期曾以金属活字——初铸甲寅字刊行。住吉朋彦首次揭示了日本庆应义塾大学斯道文库所藏甲寅字本的存在;沈庆昊则首次提及该甲寅字本的上卷《千字文》曾单独以《新刊千字注释》为题翻刻(1566年淳昌无量寺), 近期朴彻庠又对此进行了更深入的研究。 本文参照先行研究, 对《新刊大字附音释文三注》在韩、中、日三国的流传情况、朝鲜甲寅字本的现存状况等进行了综合梳理, 并从中考察了其在出版文化史方面的意义。《新刊大字附音释文三注》不仅作为朝鲜前期的蒙学教材具有重要意义, 从东亚三国的流通与接受层面来看也极为重要, 因此希望通过对其现存版本的全面梳理、对研究成果的重新审视, 再次唤起学界对此文献重要性的认识。 东亚范围内, 除朝鲜初铸甲寅字本外, 另有日本五山版, 中国明刻本两种。其中一种明刻本为上图下文的全相本。现存朝鲜初铸甲寅字本中, 目前庆应大学斯道文库本最为完整;林荧泽本末尾缺两叶, 但状态亦甚佳。此外, 延世大学、奎章阁、启明大学等藏本均按卷分册, 可见单卷分册流通的情况亦颇为常见。日本国会图书馆所藏此书的抄本为3卷1册的完整本, 是在朝鲜抄写后于壬辰倭乱时被掠夺, 后经养安院收藏, 近代归岛田翰所有, 其递藏状况也值得关注。因作为蒙学教材需求量大, 此书仅千字文部分于1566年在淳昌无量寺进行了木版刊行。 此书的上卷千字文为注释本, 是在仅有音训的石峰千字文流行于朝鲜之前的一份非常重要的资料。此注释本千字文在日本, 自五山版之后, 直至17世纪仍以《纂图附音增广古注千字文》之名多次刊行, 广为传播。中卷詠史诗是唐朝胡曾的150首组诗, 这也展现了在程敏政的《咏史绝句》流行之前, 胡曾咏史诗作为蒙学教材的流通情况。下卷蒙求, 是唐朝李瀚将名人轶事所撰四言句韵文, 宋朝徐子光为之增补相关轶事的原文及注释而成, 在朝鲜前期曾固定作为蒙学教材使用。后来出现了朱熹理学元素大为增强的柳希春所著《续蒙求分註》。此外, 在日本, 不仅江户时代蒙求曾多次刊行, 还刊行了《旧注蒙求考异》(于1800年、1814年两次刊行)。此书综合了在日本的多种异本, 进行了详细的校勘。该书作者龟田鹏斋(1752~1826)所写的题要中, 亦提及了朝鲜版。这是迄今为止完全未被知晓的非常重要信息。(“朝鲜本正统十一年(1446)全罗道锦山郡刻本并注解千字文, 通为四卷。”)
목차
1. 서론
2. 『新刊大字附音釋文三註』의 구성과 현존 갑인자본 판본
3. 『新刊千字註釋』의 목판본(1566년 순창 무량사 목판본)
4. 正統十一年(1446年) 全羅道 錦山郡 刊本의 정체
5.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