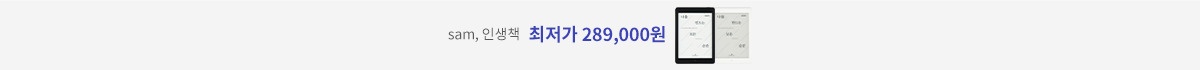- 영문명
- Generative AI and Copyright Law: The De Facto End of the Berne Convention Era and The Need for a Shift in the Public Paradigm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우미형(Mee Hyung WOO)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151호(38권 3호), 41~7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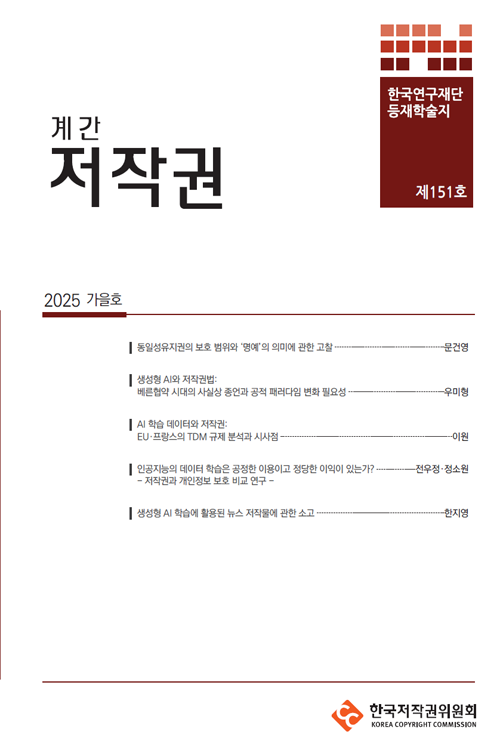
국문 초록
생성형 AI의 등장은 「저작권법」의 배타적 권리성과 속지주의 원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저작권 대책으로 논의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이라 한다) 면책이나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은 AI 모델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AI 기업과 저작권자 간의 계약에 맡기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는 문화행정에 책임을 지는 공적주체가 고려할 만한 대응방안으로는 미흡하다. 생성형 AI의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 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권리성에 대한 대폭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AI서비스의 초국경적 성격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속지주의에 대한 예외적 접근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학습 단계에서 법정허락제도의 확대나이에 준하는 이용허락 간주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탁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베른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규범 제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태생적으로 사적 권리 규율을 넘어 문화정책의 근간이자 공법적 규율로 기능해 왔으며, 생성형 AI 시대에는 문화와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e advent of generative AI is bringing fundamental changes to the exclusivity of copyright and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ereby requiring a shift in the public paradigm. Measures currently under discussion, such as text and data mining (TDM) exceptions or fair use, can hardly be regarded as appropriate frameworks to secure copyright protection at the training stage. Some have argued that the matter should be left to contractual arrangements between AI companies and copyright holders, but such an approach is insufficient as a policy response for public authorities charged with cultural governance.
To make copyright protection effective during the training phase of generative AI, a substantial paradigm shift in the understanding of copyright’s exclusivity is necessary, and given the transnational character of AI services, exceptional approaches to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re required to ensure fair competition for domestic enterprises. In the short term, the most effective response may be to guarantee proportional remuneration for copyright holders through the expansion of statutory licensing schemes, or an equivalent presumption of licensed use, at the training stage. In the longer term, improvements to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will be needed to reconcile copyright protection with technological progress, whil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ory framework to replace the Berne Convention will be essential.
Copyright law has, from its inception, functioned not merely as a regulation of private rights but as a cornerstone of cultural policy and a public regulatory framework. In the era of generative AI, its leading role is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ensur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e and cultural industries.
목차
Ⅰ. 서론
Ⅱ. 생성형 AI 모델 데이터 학습 기술의 특징과 저작권
Ⅲ. 생성형 AI의 등장과 베른협약의 미래
Ⅳ.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의 대응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민법분야 BEST
-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 저작권 침해와 저작물성의 사례와 분석
- AI 학습데이터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하나? - 저작권-인공지능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 > 민법분야 NEW
- 청렴사회를 위한 이재명정부의 역할: 반부패·청렴의 미래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AX 전환 정보보호 가이드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대학교육기관 적용 공정성 확립을 중심으로
-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 Cases and Theoretical Framework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