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Impossibility of Olfaction and Cinematic Representation: A Study on the Audiovisual Metonymy Strategy in Perfume: The Story of a Murderer
- 발행기관
- 한국영화학회
- 저자명
- 이명보(Myung Bo Lee)
- 간행물 정보
- 『영화연구』제105호, 733~76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예술체육 > 예술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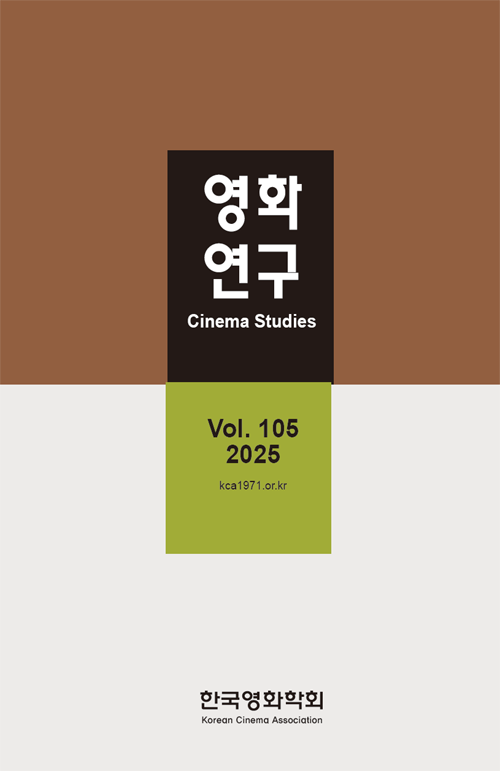
국문 초록
본고는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가 후각이라는 비물질적이며 재현 불가능한 감각을 시청각 매체 내부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감각화 하는지를 중심으로, 그미학적·윤리적·존재론적 함의를 분석한다. 후각은 형상도 구조도 가지지 않는 감각으로, 시각 중심의 영화 문법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감각이지만, 이 영화는 오히려그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서사적 동력으로 전환한다. 색채, 미장센, 카메라 무빙, 편집 리듬, 클로즈업, 사운드 디자인 등의 영화적 장치들은 후각의 질감과 정동성을 시각적·청각적 기호로 환유하고, 냄새의 여운과 감정을 감각적으로 전이한다. 특히 후각의 비가시성과 침투성을 청각적으로 매개하는 ‘청각적 후각화’ 전략은 감각 간 위계를 해체하고, 감각의 감응성과 침투성을 통해 주체-타자 관계의 윤리적 구조를 소환한다. 후각을 단순한 재현의 대상이 아닌, 감응의 기호이자 감각 정치학의 매개로 해석하며, 미셸 시옹의 아쿠스마식 사운드, 자크 랑시에르의 감성의 분할, 리처드 쉬스트먼의 소마에스테틱스 등 감각 이론들을 바탕으로 감각이 어떻게 윤리적 응답성과존재론적 불가능성의 층위로 확장되는지를 고찰한다. 감각은 타자에 대한 인지의 통로이자, 그 타자를 지우고 전유하는 폭력의 장치로 작동하며, 영화는 이러한 감각의양가성을 통해 감각의 미학을 철학적 사유로 치환한다. 결국 본 연구는 감각 간 환유와 감응의 리듬, 신체적 지각의 개입을 통해 영화가 어떻게 감각을 통한 존재론적 질문과 윤리적 사유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현대 영화 미학에서 감각 이론의 확장 가능성과 철학적 잠재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Perfume: The Story of a Murderer translates and renders the immaterial and unrepresentable sense of smell within the audiovisual medium of cinema, and analyzes its aesthetic, ethical, and ontological implications. Olfaction, lacking both visual form and structural clarity, fundamentally resists conventional film grammar based on visual primacy. Yet the film embraces this impossibility as a narrative and aesthetic engine. Through mise-en-scène, color, camera movement, editing rhythm, close-ups, and sound design, the film metonymically transfers the texture and affective resonance of smell into visual and sonic codes, transforming olfactory traces into sensory experience. In particular, the strategy of “auditory olfaction”—rendering smell through sonic elements—disrupts the sensory hierarchy and calls forth an ethical structure of relationality between self and other. This study interprets smell not as an object of representation, but as a sign of affective resonance and a medium of sensory politics. Drawing on Michel Chion’s theory of acousmatic sound, Jacques Rancière’s notion of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and Richard Shusterman’s somaesthetics, the analysis explores how sensory experience expands into domains of ethical responsiveness and ontological impossibility. As a mode of perception and also of erasure and appropriation, the sensory operates dually as both conduit and weapon. Ultimately, this paper argues that Perfume uses intersensory metonymy, affective rhythms, and embodied perception to transform cinematic aesthetics into a site of philosophical inquiry, thereby illuminating the theoretical potential of sensory discourse within contemporary film studie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후각의 불가능성과 영화적 재현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