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Emergence of Arirang's National Symbolization : Centered on the Ideological Influence of the Socail Class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 이경진(Kyung-Ji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세계』제7권 3호, 5~2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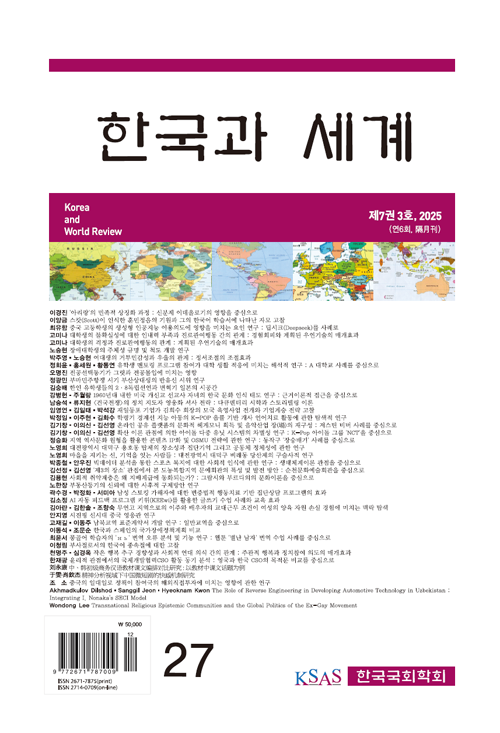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아리랑’이 어떻게 우리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별로 향유하는 음악 문화가 달랐으며, ‘아리랑’은 주로 하위 계층인 입창문화층에서 향유되었다.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20세기 초 근대 매체가 등장하면서 계층 간 음악 향유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1926년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은 민요였던 ‘아리랑’이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당시 영화라는 매체는 음반보다 대중적 접근성이 높아, 전 계층이 동일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는 ‘아리랑’의 상징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조선 사회의 신분 구조와 문화 향유 양식, 그리고 영화 산업의 대중성이라는 구조적 조건들과 ‘아리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아리랑’의 민족적 상징화는 사회 구조와 매체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how Arirang became a national symbol from a cultural sociology perspective.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musical enjoyment varied by social class, with Arirang primarily embraced by the lower class. However, the 1894 Gabo Reform legally abolished the social hierarchy, and the emergence of modern media in the early 20th century reshaped music consumption across classes. A turning point came in 1926 with Na Un-gyu's film Arirang, which elevated the song to a national emblem. As cinema offered greater accessibility than phonograph records, Arirang could transcend class divisions, reinforcing its symbolic status.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structure and media environment, arguing that Arirang's national symbolization resulted from these interconnected factors.
목차
Ⅰ. 서론
Ⅱ. 신분제 이데올로기와 ‘아리랑’의 향유층
Ⅲ. 1920년대 ‘아리랑’의 상징화 과정: 영화 매체의 영향력
Ⅳ.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