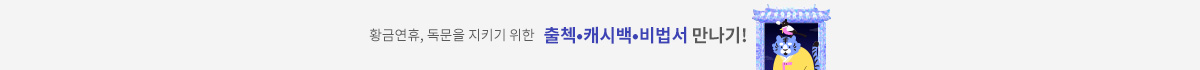- 영문명
- A Critical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VOD Service Provider on Copyright Act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고민수(Ko, Min Su)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5호(19권 3호), 4~13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0.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저작권법은 이른바 법정허락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저작자의 방송권 행사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하면서 방송권에 대한 제한과 같은 이른바 ‘강제허락제도(compulsory license)’를 두지 않았다.
물론, 입법자에게는 ‘같이 취급할 사항’과 ‘다르게 취급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가 무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자의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까지 형성의 자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저작물의 이용제공자를 제공방식에 따라 동시(同時)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느냐 아니면 이시(異時)에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저작물의 이용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도록 한 현행 저작권법상에서 전송권과 방송권의 구별이 ‘사항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지’에 대한 검토는 저작권법개정과정이나 이후 논의에서도 살펴보기 힘들다. 만약, 전송 특히 인터넷 망의 매스커뮤니케이션적 이용과 방송이‘사항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이를 다르게 취급하였다면 이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화될 수도 없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전면개정안이 발의되고 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적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인터넷 망의 매스커뮤니케이션적 이용행위가 과연 헌법상 방송의 보호영역과 구분되는 다른 새로운 생활영역인가에 관해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제공자로서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의 차별대우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입법적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2000, National Assembly revised Copyright Act and established a statutory basis for how copyright act applies to the internet and who should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facilitated by the existence o f the Internet.
Considering the ease of copying documents on the Internet, proponents of expanded protection fear that if
copyright owners are not given protection for their works distributed over the Internet, those owners will refuse to
make their works available, on the other hand, OSPs assert that there are too much regulation to using the works
being compared with the compulsory license for Broadcasters.
At the aspect, the revised copyright act makes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they are just limited at the old
way of technology and the definition itself o f broadcasting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at is a broadcasting
within the statutory meaning, but any legislative effort for defining or characterizing the new type of digital communication, during the discussions over the pending bill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ittees and session
beyond,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So, I suppose the need for a solution that is fair and reasonable for VOD Service Provider.
The legislative efforts for digital based copyright in South Korea should reflect the concept of the actual and
potential objects o f electronic mass communication activities as opposed to the definition itself of broadcasting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ich is a broadcasting within the traditional way of technology. In other words, the
key to the legislative effort for defining the concept of new type of communication based on electronic facility
and how to protect copyright owner for their works distributed over the Internet will lie in how to have respective
statutory conform to the nature of broadcasting as a mechanism for effective flow of information.
목차
I . 문제제기
II. 저작물 이용에 있어 차별적 대우
III.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의 위헌성
IV.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