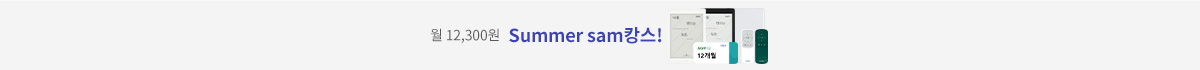- 영문명
- The Transmission and Reconstruction of Yi Sun-sin's Memory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Commemorative Projects from the Late Joseon Period to the Japanese Colonial Era
- 발행기관
-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 저자명
- 민장원(Jang-Won Min)
- 간행물 정보
- 『이순신연구논총』제41호, 91~13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0
국문 초록
이 글은 시대적‘요구’에 발맞춰 변주되어 온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 것이다. 이순신은 1598년(선조 31)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뒤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왔다. 그는 임진왜란을 위시한 전란(戰亂) 이후, 군공(軍功)을 세운 왕조 국가의 공신(功臣)으로서 회자되었다. 이후 그에 대한 현창과 기억의 양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가령 영조대 불거진 당파 간의 정쟁(政爭)과 무신란(戊申亂)은 이순신과 그의 가문을 각각 ‘충신(忠臣)’, ‘충량가(忠良家)’의 전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무신란 당시 이봉상, 이홍무 등 이순신의 후손들이 반란군에 맞서 내보였던 ‘충직’한 신자(臣子)로서의 면모가, 이순신을 다시금 ‘충신’의 원류로 회자케 한 것이었다. 정조대에 이르러, 이순신은 ‘충신’의 표상으로 그 위상을 굳건히 다지게 되었다. 정조는 정국 운영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788년(정조 12)부터, 국가 차원의 ‘충신’ 현창사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1795년(정조 19) 『이충무공전서』를 편찬하였다. 사가(私家)의 기록이 국왕 정조에 의해 공적 차원에서 수용 및 집대성된 순간이었다. 이는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작업으로써, 이순신을 ‘충신’의 표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이때 편찬된 『이충무공전서』는 후대의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전승과 평가에 기본 토대가 되었다. 이순신은 일제강점기에 또 한차례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었다. 특히 이순신의 ‘영웅적’ 면모가 항일의식 제고, 민족계몽 혹은 민족개조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거론되며, 변주를 거듭하였다. 이순신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비로소 민족을 구한 ‘구국성웅(救國聖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근래에는 ‘정의’와 ‘민주’의 상징으로서 이순신을 기억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보인다. 이처럼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전승과 재구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일련의 양상과 그 이면에 놓인 시대적 ‘요구’를 꿰뚫어 보는 작업은, 이순신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races the transformation of collective memory surrounding Yi Sun-sin in response to the evolving sociopolitical demands of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Since his death in the Battle of Noryang in 1598 (the 31st year of King Seonjo’s reign), Yi Sun-sin has been remembered in diverse ways. In the aftermath of the Imjin War and other national crises, he was initially commemorated as a meritorious subject (功臣) who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military achievements of the Joseon state. Over time, however, the modes and meanings of commemorating Yi Sun-sin continued to shift in accordance with changing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exts.
For instance, the political factionalism and the ‘Musin Revolt’ (戊申亂)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led to the elevation of Yi and his family as archetypes of loyal subjects (忠臣) and virtuous lineages (忠良家). The loyalty displayed by Yi’s descendants, such as Yi Bong-sang and Yi Hong-mu, who resisted the rebels during the ‘Musin Revolt’, reaffirmed Yi Sun-sin's legacy as the origin of unwavering loyalty. Under King Jeong-jo’s rule, Yi Sun-sin’s image as a model loyal subject was further solidified. In 1788, as the new regime gained stability, Jeong-jo launched a state-sponsored project to commemorate loyal subjects, culminating in the compilation of the Complete Works of Admiral Yi Sun-sin (『李忠武公全書』) in 1795. This marked the moment when previously private records were officially recognized and systematized under royal authority. The compilation not only reflected Jeong-jo’s intention to reconstruct Yi Sun-sin’s memory as the embodiment of loyalty but also became the foundational text for later generations’ understanding and remembrance of Yi.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Yi Sun-sin was once again reinterpreted, this time as a national hero. His heroic image was mobilized to inspire anti-Japanese sentiment and support movements for national enlightenment and reform. In this context, Yi was reborn as a ‘sacred hero who saved the nation’ (救國聖雄), a symbol suited to the needs of the time. In recent years, there have also been efforts to remember Yi as a symbol of justice and democracy. These evolving interpretations demonstrate that the transmission and reconstruction of Yi Sun-sin’s memory is an ongoing historical process. Understanding this trajectory and the sociopolitical needs embedded within it offers a critical lens through which to engage with Yi Sun-sin as a historical figure.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후기의 이순신 : 임진왜란의 공신(功臣)에서 ‘충신(忠臣)’의 표상으로
Ⅲ. 일제강점기의 이순신 : 다시, 민족의 ‘구국성웅(救國聖雄)’으로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