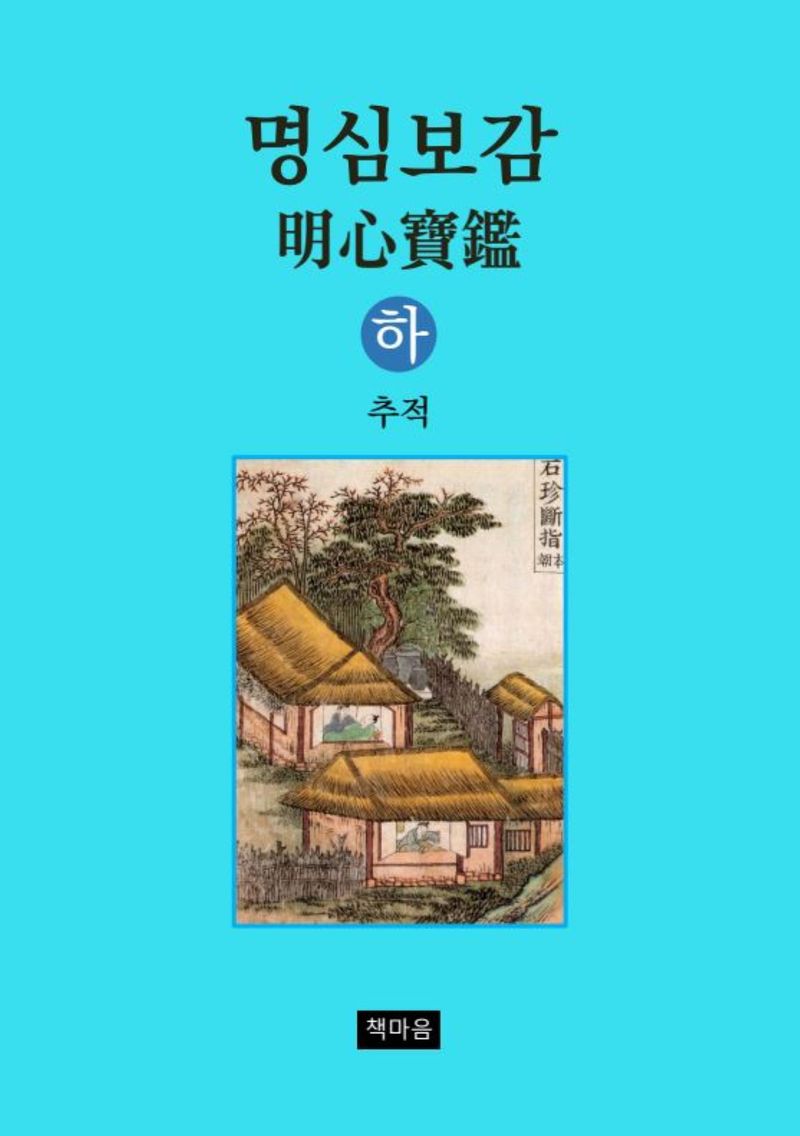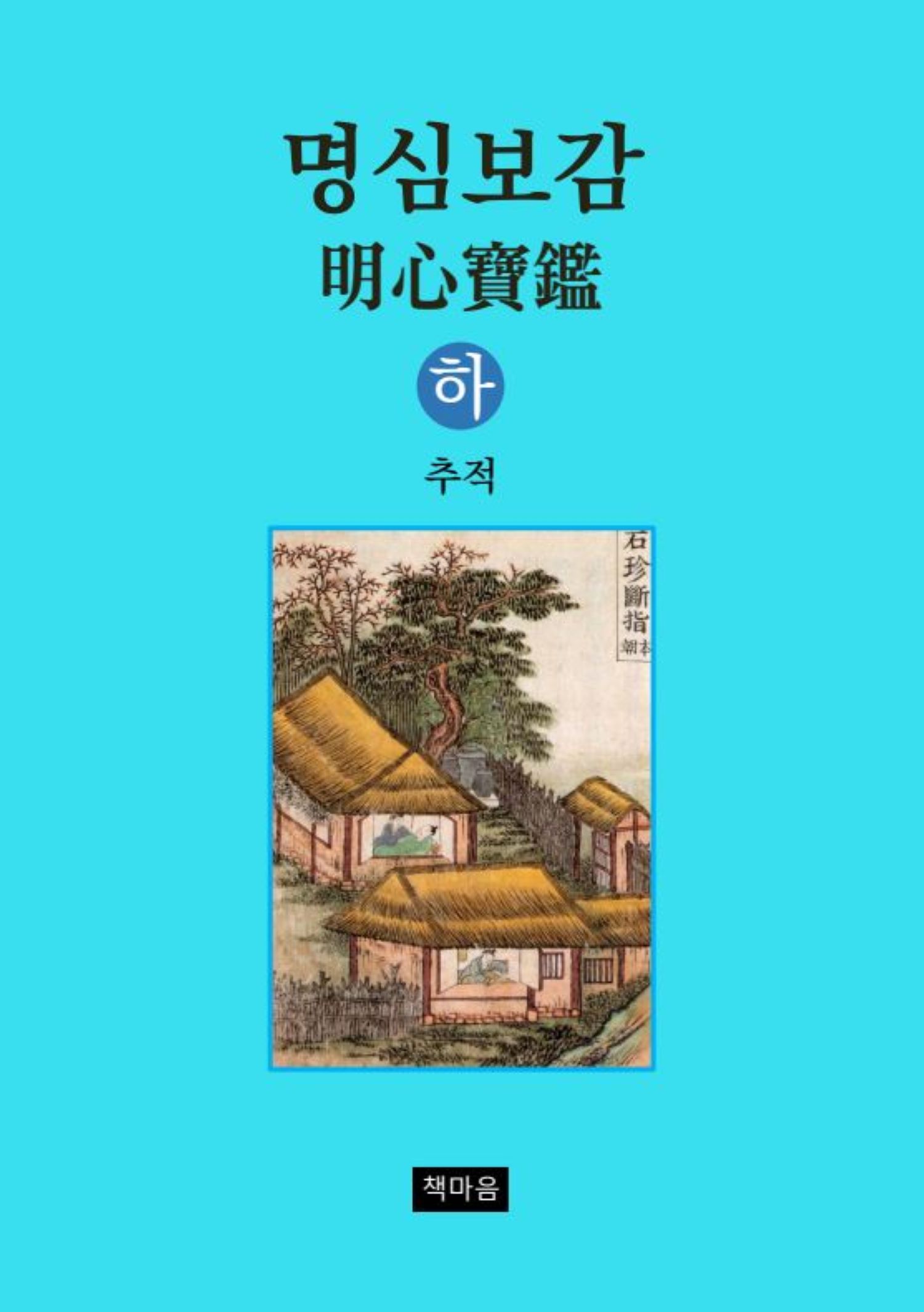명심보감 하
2025년 06월 28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ePUB (6.29MB)
- ISBN 9791191146578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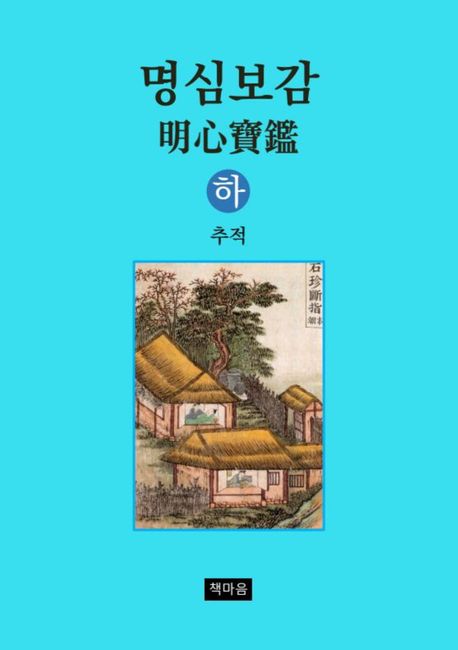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개요
명심보감은 19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을 망라하여 편찬한 책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이다. 단순히 쉬운 문장들로 구성되어 한문 학습을 돕는 역할만 했다면 그 위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간결한 문장 안에 담긴 선인들의 보배로운 말과 글은 인격 수양을 돕고, 나아가 인생의 잠언으로 두고두고 숙독해 왔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현인들의 지혜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 전통적인 동양 사상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다.
어느 한 편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인간 본연의 착한 심성을 강조하며, 지족(知足)과 겸양의 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명언은 경세(經世)를 위한 수양서이자 제세에 필요한 교훈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역사
추적(秋適)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을 모아서, 19편으로 구성하고 편찬한 책이다.
중국으로 건너간 명심보감을 명나라 사람 범입본(范立本)이, 사서삼경을 비롯해 공자가어, 소학, 근사록, 성심잡언 등의 유교 경전과 유학자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여러 고전에서 금언(金言), 명구(名句)를 추려내, 추적(秋適)이 발췌하지 못한 고전 문구를 추가, 편집, 내용을 주제별로 엮어 보강한 증편 명심보감(일명: 청주본)을 편찬하였다. 상하 2권 20편이다.
그 후 조선시대 초기에 중국에서 한반도로 역수입된 것으로 보이며, 처음에는 중국 판본만 유통되다가 1454년(조선 단종 2년)에 민건(閔騫)의 후원으로 청주유학교수관 유득화(庾得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행하였다. 이는 청주본 발문에서 밝히는 내용이며 해당 판본에는 저자 범립본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로 자신을 수양하고 반성하고 양심을 기르는 인격 수양의 목적으로 가르쳤다.
임진왜란 이후로는 청주본이 1980년대에 재발견되기까지는 잊힌 것으로 보이며, 1637년에 원본 분량의 3분의 1만 담고 있는 초략본이 간행되어 원본을 대체하여 유통되었다. 이 정축본에는 제17편 존신편(存信篇)이 결락되어 총 19편으로 편성되었고 도교, 불교적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출판 의도나 저자가 명시된 서문, 발문 등의 기록이 없이 출판되었다. 그 후에도 1664년, 1844년, 1868년에 간행된 판본도 서문과 발문이 없이 간행되었다.
이와 같이 저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869년에 추씨 가문의 인흥서원에서 자신들의 선조인 예문관대제학을 지낸 추적이 명심보감을 편찬하였다고 써넣었다(인흥재사본).
명심보감은 국내에만도 수십 종에 이르는 판본이 전하고, 1305년에 편찬된 이래 각국에 널리 소개되었다.
당시 고려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일대의 국가에 널리 알려졌다. 1592년에는 베이징에 체류하던 스페인 선교사 코보가 명심보감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동양 문헌이 처음으로 서양어로 번역된 사례다. 이후 네덜란드어나 독일어로 번역되어 서구에까지 유포되었다.
현대에는 일부 학교에서 징계 목적으로 명심보감을 쓰게 하기도 한다.
현재 전하는 판본은 고종 6년(1869년) 추세문이 출판한 인흥재사본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2010년 건국대학교 중문과 교수인 임동석(林東錫)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 수십 종에 이르는 흩어진 판본들을 모아서 통합본 명심보감을 출판하였다.
구성
1. 계선(繼善) 계(繼)는 이어간다는 뜻이며 선(善)은 착함이니, 인생을 착하게 살아가라고 권유. 계선 편은 10장으로 구성
2. 천명(天命) 천명(天命)은 ‘하늘의 명령’이니, 하늘을 두려워하며 양심에 따라 살라고 권유. 천명 편은 7장으로 구성
3. 순명(順命) 명(命)은 곧 천명(天命)이니,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주어진 命을 받아들이라고 권유. 5장으로 구성
4. 효행(孝行)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네(詩經) 등, 부모님께 효도할 것과 이를 통해 자식에게 본보기가 됨을 강조. 6장으로 구성
5. 정기(正己)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할 것을 권유. 26장으로 구성
6. 안분(安分) 안(安)은 편안함이요 분(分)은 분수이니,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를 편안히 받아들이라고 권유. 7장으로 구성
7. 존심(存心)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 20장으로 구성
8. 계성(戒性) 성품을 경계하라(戒性).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 동안의 근심을 면하리라. 인내의 덕목을 강조. 9장으로 구성
9. 근학(勤學) 인간답기 위해서는 배움에 힘써야 함을 강조. 8장으로 구성
10. 훈자(訓子) 부모로서 제대로 자식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 10장으로 구성
11. 성심(省心) 분량이 매우 많아 상하로 나뉘어있다. 충효, 검소 등의 생활덕목부터 성리학, 도교 등 사상이 담긴 여러형태의 글로 구성. 상하 총 90장으로 구성
12. 입교(立敎)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두 올바른 가르침(원칙)을 세워야 함을 강조. 15장으로 구성
13. 치정(治政) 치(治)는 다스림이요, 정(政)은 부정(不正)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니, 관직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침. 8장으로 구성
14. 치가(治家) 집안을 잘 다스려라. 즉, 가정 윤리를 제시. 8장으로 구성
15. 안의(安義) 부자라서 친하지 않고, 가난뱅이라서 멀리하지 않는 이가 대장부(大丈夫)이니(소동파), 의리있게 사는 인간관계를 강조. 3장으로 구성
16. 준례(遵禮) 준(遵)은 따른다는 뜻이니, 인간이 따라야(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강조. 7장으로 구성
17. 존신(尊信) 청주본에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정축본과 인흥재사본에는 없다.
18. 언어(言語)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門)이다(君平). 말을 조심하라고 권유. 7장으로 구성
19. 교우(交友) 친구 사귀기의 중요성을 강조. 8장으로 구성
20. 부행(婦行)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이야기. 8장으로 구성
초략본에는 원본에 없는 증보편(增補篇), 팔반가(八反歌), 효행편(孝行篇), 염의편(廉義篇), 권학편(勸學篇)이 덧붙여져 있다.
明心寶鑑(명심보감) • 3
추적(秋適) • 8
12. 省心篇 下(성심편 하)
01. 禍起傷身 皆是不仁之召(화기상신 개시불인지소) 14 / 02. 常思已往之非(상사이왕지비) 16 / 03. 盡是眞實而得(진시진실이득) 18 / 04. 欲識其人 先視其友(욕식기인 선시기우) 20 / 05. 水至淸則無魚(수지청즉무어) 22 / 06. 春雨如膏 行人 惡其泥濘(춘우여고 행인 오기니녕) 24 / 07. 大丈夫 重名節於泰山(대장부 중명절어태산) 25 / 08. 濟人之急 求人之危(제인지급 구인지위) 26 / 09. 背後之言 豈足深信(배후지언 기족심신) 27 / 10. 只恨他家苦井深(지한타가고정심) 28 / 11. 罪拘薄福人(죄구박복인) 29 / 12. 人若改常 不病則死(인약개상 불병즉사) 30 / 13. 國正天心順(국정천심순) 31 / 14. 人受諫則聖(인수간즉성) 33 / 15. 更有收人在後頭(갱유수인재후두) 35 / 16. 無故而得千金 必有大禍(무고이득천금 필유대화) 37 / 17. 人虧我是福(인휴아시복) 38 / 18. 良田萬頃 日食二升(양전만경 일식이승) 39 / 19. 頻來親也疎(빈래친야소) 40 / 20. 醉後添盃 不如無(취후첨배 불여무) 42 / 21. 酒不醉人人自醉(주불취인인자취) 43 / 22. 公心 若比私心 何事不辦(공심 약비사심 하사불판) 44 / 23. 巧者凶 拙者吉(교자흉 졸자길) 45 / 24. 智小而謀大 無禍者鮮矣(지소이모대 무화자선의) 48 / 25. 愼終如始(신종여시) 50 / 26. 人滿則喪(인만즉상) 52 / 27. 寸陰是競(촌음시경) 53 / 28. 衆口 難調(중구 난조) 54 / 29. 明智 可以涉危難(명지 가이섭위난) 55 / 30. 開口告人 難(개구고인 난) 56 / 31. 遠親 不如近隣(원친 불여근린) 57 / 32. 非災橫禍 不入愼家之門(비재횡화 불입신가지문) 58 / 33. 良田萬頃 不如薄藝隨身(양전만경 불여박예수신) 59 / 34.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 60 / 35. 酒色財氣 世人跳得出(주색재기 세인도득출) 62
13. 立敎篇(입교편)
01. 立身有義 而孝爲本(입신유의 이효위본) 64 / 02. 爲政之要 曰公與淸(위정지요 왈공요청) 67 / 03. 讀書 起家之本(독서 기가지본) 68 / 04. 一生之計 在於幼(일생지계 재어유) 70 / 05. 五敎 五倫(오교 오륜) 72 / 06. 三綱(삼강) 74 / 07. 忠臣 不事二君(충신 불사이군) 77 / 08. 治官 莫若平(치관 막약평) 79 / 09. 張思叔座右銘(장사숙좌우명) 81 / 10. 於存心修身 大有所害(어존심수신 대유소해) 84 / 11.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① 88 / 12.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② 90 / 13.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③ 93 / 14.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④ 95 / 15.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⑤ 97
14. 治政篇(치정편)
01. 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일명지사 구존심어애물) 100 / 02. 上天 難欺(상천 난기) 102 / 03. 當官之法 唯有三事(당관지법 유유삼사) 104 / 04. 當官者 必以暴怒爲戒(당관자 필이포노위계) 106 / 05. 處官事 如家事(처관사 여가사) 108 / 06. 若能以事父兄之道(약능이사부형지도) 110 / 07. 正己以格物(정기이격물) 112 / 08. 迎斧鉞而正諫(영부월이정간) 114
15. 治家篇(치가편)
01. 必咨稟於家長(필자품어가장) 118 / 02. 治家 不得不儉(치가 부득불검) 119 / 03. 痴人 畏婦(치인 외부) 120 / 04. 凡使奴僕 先念飢寒(범사노복 선념기한) 121 / 05.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 122 / 06. 夜夜備賊來(야야비적래) 123 / 07. 觀朝夕之早晏 可以興替(관조석지조안 가이흥체) 124 / 08. 婚娶而論財 夷虜之道也(혼취이론재 이로지도야) 125
16. 安義篇(안의편)
01. 一家之親 此三者而已矣(일가지친 차삼자이이의) 128 / 02. 兄弟爲手足 夫婦爲衣服(형제위수족 부부위의복) 130 / 03. 富不親兮貧不疎 大丈夫(부불친혜빈불소 대장부) 131
17. 遵禮篇(준례편)
01. 居家有禮故 長幼辨(거가유례고 장유변) 134 / 02. 君子有勇而無禮 爲亂(군자유용이무례 위란) 137 / 03. 三達尊(삼달존) 139 / 04. 老少長幼 天分秩序(노소장유 천분질서) 141 / 05. 出門 如見大賓(출문 여견대빈) 142 / 06. 無過我重人(무과아중인) 143 / 07. 子不談父之過(자부담부지과) 144
18. 言語篇(언어편)
01. 言不中理 不如不言(언부중리 불여불언) 146 / 02. 一言不中 千語無用(일언부중 천어무용) 147 / 03. 口舌者 禍患之門(구설자 화환지문) 148 / 04. 一言利人 重値千金(일언이인 중치천금) 149 / 05. 閉口深藏舌(폐구심장설) 150 / 06. 未可全抛一片心(미가전포일편심) 151 / 07. 話不投機一句多(화불투기일구다) 152
19. 交友篇(교우편)
01. 必愼其所與處者焉(필신기소여처자언) 154 / 02. 與好人同行 時時有潤(여호인동행 시시유윤) 157 / 03. 久而敬之(구이경지) 158 / 04. 知心能幾人(지심능기인) 160 / 05. 急難之朋 一個無(급난지붕 일개무) 161 / 06. 無義之朋 不可交(무의지붕 불가교) 162 / 07. 君子之交 淡如水(군자지교 담여수) 163 / 08. 日久見人心(일구견인심) 165
20. 婦行篇(부행편)
01.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① 168 / 02.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② 170 / 03.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③ 171 / 04.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④ 173 / 05. 婦人之禮 語必細(부인지례 어필세) 175 / 06. 賢婦 令夫貴(현부 영부귀) 176 / 07. 家有賢妻 夫不遭橫禍(가유현처 부부조횡화) 177 / 08. 賢婦 和六親(현부 화육친) 178
21. 增補篇(증보편)
01. 善不積 不足以成名(선부적 부족이성명) 180 / 02. 履霜 堅氷至(이상 견빙지) 182
22. 八反歌 八首(팔반가 팔수)
01. 八反歌 一首(팔반가 일수) 186 / 02. 八反歌 二首(팔반가 이수) 187 / 03. 八反歌 三首(팔반가 삼수) 189 / 04. 八反歌 四首(팔반가 사수) 191 / 05. 八反歌 五首(팔반가 오수) 192 / 06. 八反歌 六首(팔반가 육수) 193 / 07. 八反歌 七首(팔반가 칠수) 194 / 08. 八反歌 八首(팔반가 팔수) 195
23. 孝行篇 續(효행편 속)
01. 孫順 欲埋堀地 有石鐘(손순 욕매굴지 유석종) 198 / 02. 尙德 則刲髀肉食之(상덕 즉규비육사지) 201 / 03. 都氏家貧至孝(도씨가빈지효) 203
24. 廉義篇(염의편)
01. 印觀 暑調 二人相讓(인관 서조 이인상양) 208 / 02. 洪耆燮 劉哥(홍기섭 유가) 211 / 03. 溫達 高句麗平原王之女(온달 고구려평원왕지녀) 216
25. 勸學篇(권학편)
01. 朱子勸學文(주자권학문) 220 / 02.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로학난성) 222 / 03. 盛年不重來(성년부중래) 224 / 04. 不積蹞步 無以至千里(부적규보 무이지천리) 226
明心寶鑑
(명심보감)
하
책마음
365일 독자와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지혜와 풍요로운 삶의 지수를 높이는 책마음이 되겠습니다.
명심보감(明心寶鑑) (하)
발행 2025년 6월 28일
지은이 | 추적
옮긴이 | 우리고전연구회
펴낸이 | 김지숙
펴낸곳 | 도서출판 책마음
등록번호 | 제 2012-000047호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가산동 롯데 IT캐슬) B218호
전화 | 02-868-3018
팩스 | 02-868-3019
메일 | bookakdma@naver.com
I S B N | 세트 979-11-91146-55-4(05140)
하권 979-11-91146-57-8(05140)
값 세트 16,000원 각 권 8,000원
명심보감(明心寶鑑)
명심보감(明心寶鑑)은 고려 시대 충렬왕 때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낸 추적(秋適)이 1305년에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언(金言), 명구(名句)를 엮어서 저작했다. 후에 명나라 사람 범입본(范立本)이 추적(秋適)의 명심보감을 입수하여 증편하기도 했다.
개요
명심보감은 19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을 망라하여 편찬한 책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이다. 단순히 쉬운 문장들로 구성되어 한문 학습을 돕는 역할만 했다면 그 위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간결한 문장 안에 담긴 선인들의 보배로운 말과 글은 인격 수양을 돕고, 나아가 인생의 잠언으로 두고두고 숙독해 왔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현인들의 지혜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 전통적인 동양 사상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다.
어느 한 편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인간 본연의 착한 심성을 강조하며, 지족(知足)과 겸양의 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명언은 경세(經世)를 위한 수양서이자 제세에 필요한 교훈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역사
추적(秋適)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을 모아서, 19편으로 구성하고 편찬한 책이다.
중국으로 건너간 명심보감을 명나라 사람 범입본(范立本)이, 사서삼경을 비롯해 공자가어, 소학, 근사록, 성심잡언 등의 유교 경전과 유학자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여러 고전에서 금언(金言), 명구(名句)를 추려내, 추적(秋適)이 발췌하지 못한 고전 문구를 추가, 편집, 내용을 주제별로 엮어 보강한 증편 명심보감(일명: 청주본)을 편찬하였다. 상하 2권 20편이다.
그 후 조선시대 초기에 중국에서 한반도로 역수입된 것으로 보이며, 처음에는 중국 판본만 유통되다가 1454년(조선 단종 2년)에 민건(閔騫)의 후원으로 청주유학교수관 유득화(庾得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행하였다. 이는 청주본 발문에서 밝히는 내용이며 해당 판본에는 저자 범립본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로 자신을 수양하고 반성하고 양심을 기르는 인격 수양의 목적으로 가르쳤다.
임진왜란 이후로는 청주본이 1980년대에 재발견되기까지는 잊힌 것으로 보이며, 1637년에 원본 분량의 3분의 1만 담고 있는 초략본이 간행되어 원본을 대체하여 유통되었다. 이 정축본에는 제17편 존신편(存信篇)이 결락되어 총 19편으로 편성되었고 도교, 불교적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출판 의도나 저자가 명시된 서문, 발문 등의 기록이 없이 출판되었다. 그 후에도 1664년, 1844년, 1868년에 간행된 판본도 서문과 발문이 없이 간행되었다.
이와 같이 저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869년에 추씨 가문의 인흥서원에서 자신들의 선조인 예문관대제학을 지낸 추적이 명심보감을 편찬하였다고 써넣었다(인흥재사본).
명심보감은 국내에만도 수십 종에 이르는 판본이 전하고, 1305년에 편찬된 이래 각국에 널리 소개되었다.
당시 고려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일대의 국가에 널리 알려졌다. 1592년에는 베이징에 체류하던 스페인 선교사 코보가 명심보감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동양 문헌이 처음으로 서양어로 번역된 사례다. 이후 네덜란드어나 독일어로 번역되어 서구에까지 유포되었다.
현대에는 일부 학교에서 징계 목적으로 명심보감을 쓰게 하기도 한다.
현재 전하는 판본은 고종 6년(1869년) 추세문이 출판한 인흥재사본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2010년 건국대학교 중문과 교수인 임동석(林東錫)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 수십 종에 이르는 흩어진 판본들을 모아서 통합본 명심보감을 출판하였다.
구성
1. 계선(繼善) 계(繼)는 이어간다는 뜻이며 선(善)은 착함이니, 인생을 착하게 살아가라고 권유. 계선 편은 10장으로 구성
2. 천명(天命) 천명(天命)은 ‘하늘의 명령’이니, 하늘을 두려워하며 양심에 따라 살라고 권유. 천명 편은 7장으로 구성
3. 순명(順命) 명(命)은 곧 천명(天命)이니,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주어진 命을 받아들이라고 권유. 5장으로 구성
4. 효행(孝行)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네(詩經) 등, 부모님께 효도할 것과 이를 통해 자식에게 본보기가 됨을 강조. 6장으로 구성
5. 정기(正己)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할 것을 권유. 26장으로 구성
6. 안분(安分) 안(安)은 편안함이요 분(分)은 분수이니,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를 편안히 받아들이라고 권유. 7장으로 구성
7. 존심(存心)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 20장으로 구성
8. 계성(戒性) 성품을 경계하라(戒性).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 동안의 근심을 면하리라. 인내의 덕목을 강조. 9장으로 구성
9. 근학(勤學) 인간답기 위해서는 배움에 힘써야 함을 강조. 8장으로 구성
10. 훈자(訓子) 부모로서 제대로 자식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 10장으로 구성
11. 성심(省心) 분량이 매우 많아 상하로 나뉘어있다. 충효, 검소 등의 생활덕목부터 성리학, 도교 등 사상이 담긴 여러형태의 글로 구성. 상하 총 90장으로 구성
12. 입교(立敎)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두 올바른 가르침(원칙)을 세워야 함을 강조. 15장으로 구성
13. 치정(治政) 치(治)는 다스림이요, 정(政)은 부정(不正)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니, 관직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침. 8장으로 구성
14. 치가(治家) 집안을 잘 다스려라. 즉, 가정 윤리를 제시. 8장으로 구성
15. 안의(安義) 부자라서 친하지 않고, 가난뱅이라서 멀리하지 않는 이가 대장부(大丈夫)이니(소동파), 의리있게 사는 인간관계를 강조. 3장으로 구성
16. 준례(遵禮) 준(遵)은 따른다는 뜻이니, 인간이 따라야(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강조. 7장으로 구성
17. 존신(尊信) 청주본에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정축본과 인흥재사본에는 없다.
18. 언어(言語)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門)이다(君平). 말을 조심하라고 권유. 7장으로 구성
19. 교우(交友) 친구 사귀기의 중요성을 강조. 8장으로 구성
20. 부행(婦行)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이야기. 8장으로 구성
초략본에는 원본에 없는 증보편(增補篇), 팔반가(八反歌), 효행편(孝行篇), 염의편(廉義篇), 권학편(勸學篇)이 덧붙여져 있다.
편명과 조항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주본
(1454)
정축본
(1637)
인흥재사본
(1869)
계선(繼善)
47
11
11
천명(天命)
19
7
7
순명(順命)
16
5
5
효행(孝行)
19
5
5
정기(正己)
117
26
26
안분(安分)
18
5
6
존심(存心)
82
20
21
계성(戒性)
15
9
11
근학(勤學)
22
8
8
훈자(訓子)
17
9
9
성심(省心)
256
85
91
입교(立敎)
17
10
10
치정(治政)
22
8
8
치가(治家)
16
8
8
안의(安義)
5
3
3
준례(遵禮)
21
7
7
존신(存信)
7
0
0
언어(言語)
25
7
7
교우(交友)
24
8
8
부행(婦行)
9
5
5
추적(秋適)
출생 1246년 고려 양광도 양지현(現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사망 1317년(향년 72세) 고려 개경
본관 추계(秋溪)
별칭 자(字) 관중(慣中), 호(號) 노당(露堂), 시호(諡號) 문헌(文憲)
경력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추적(秋適, 1246년 ∼ 1317년)은 고려의 문신이다. 본관은 추계(秋溪). 자는 관중(慣中), 호는 노당(露堂)이다. 충렬왕 때,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역임하였다. 시랑(侍郞) 겸 국학 교수(國學敎授)로 재임할 때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집필하였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인흥서원(仁興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다.
노당(露堂) 추적(秋適)은 1246년(고려 고종 33년) 양광도에서 태어났다.
추적의 아버지인 추영수(秋永壽)는 1209년(고려 희종 5년) 국자시에 장원급제하여 문하시중을 역임하였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추적(秋適)은 성품이 활달하여 얽매임이 없었다고 한다.
1260년(고려 원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안동서기(安東書記), 직사관(直史館)을 거쳐 좌사간(左司諫)에 올랐다.
1298년(충렬왕 24) 환관 황석량(黃石良)이 권세를 이용하여, 황석량의 고향인 합덕부곡(合德部曲 : 현재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을 현(縣)으로 승격시키려고 할 때, 추적이 문안에 서명을 거부하자, 황석량은 내수(內竪) 석천보(石天補), 김광연(金光衍)과 함께 기회를 노려 추적을 참소하니, 왕이 형구를 채워 순마소(巡馬所)에 수감하게 했다. 압송하는 사람이 추적더러, 원한다면 골목길로 갈 수도 있다고 후의를 보였으나 추적은 거절했다. “죄를 저지른 자를 모두 해당 관청으로 보낼 때 대궐에서 형구를 채운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으니 내가 큰 거리를 지나면서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 간관(諫官)으로서 형구를 차는 것 또한 영광이니, 어찌 아녀자가 거리에서 얼굴 가리는 것처럼 행동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추적은 곧 복권되어 1299년 시랑으로 북계 용주(龍州)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1302년(충렬왕 28년) 찬성사(贊成事) 안향(安珦)에 의하여 시랑(侍郞) 겸 국학 교수(國學敎授)로 발탁되어 이성(李晟), 최원충(崔元冲) 등과 함께 7품 이하의 관리 혹은 생원들에 대한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안향(安珦)과 더불어 정주학(程朱學)의 도입을 꾀하였다. 1305년 시랑 국학교수로서 교양서인 《명심보감(明心寶鑑)》을 편찬하였다.
1306년(충렬왕 32년) 민부상서(民部尙書)를 역임하고,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이르렀다.
추적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다.
조선 순조 35년(1825) 10월 팔도 유림(儒林)과 추적의 20대손인 추세문(秋世文)이 뜻을 모아 창건한 대구의 인흥서원(仁興書院)에 배향되었다. 조선 고종 1년(1864년) 홍문관제학을 역임한 조선의 문신 해장 신석우(申錫愚, 1805~ 1865)가 비문을 지어 추적 신도비(秋適神道裨)를 건립하였다.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세운 주세붕(周世鵬)은 《무릉잡고(武陵雜稿)》에 노당 추적의 공적을 "해동에서 유교를 숭상하고 학교를 건립한 도(道)가 복초당 안선생 문성공 유와 노당 추선생 문헌공 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까지 누구라고 흠모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 고려와 조선의 유교가 안향과 추적 두 선생에서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다.
차 례
明心寶鑑(명심보감) • 3
추적(秋適) • 8
12. 省心篇 下(성심편 하)
01. 禍起傷身 皆是不仁之召(화기상신 개시불인지소) 14 / 02. 常思已往之非(상사이왕지비) 16 / 03. 盡是眞實而得(진시진실이득) 18 / 04. 欲識其人 先視其友(욕식기인 선시기우) 20 / 05. 水至淸則無魚(수지청즉무어) 22 / 06. 春雨如膏 行人 惡其泥濘(춘우여고 행인 오기니녕) 24 / 07. 大丈夫 重名節於泰山(대장부 중명절어태산) 25 / 08. 濟人之急 求人之危(제인지급 구인지위) 26 / 09. 背後之言 豈足深信(배후지언 기족심신) 27 / 10. 只恨他家苦井深(지한타가고정심) 28 / 11. 罪拘薄福人(죄구박복인) 29 / 12. 人若改常 不病則死(인약개상 불병즉사) 30 / 13. 國正天心順(국정천심순) 31 / 14. 人受諫則聖(인수간즉성) 33 / 15. 更有收人在後頭(갱유수인재후두) 35 / 16. 無故而得千金 必有大禍(무고이득천금 필유대화) 37 / 17. 人虧我是福(인휴아시복) 38 / 18. 良田萬頃 日食二升(양전만경 일식이승) 39 / 19. 頻來親也疎(빈래친야소) 40 / 20. 醉後添盃 不如無(취후첨배 불여무) 42 / 21. 酒不醉人人自醉(주불취인인자취) 43 / 22. 公心 若比私心 何事不辦(공심 약비사심 하사불판) 44 / 23. 巧者凶 拙者吉(교자흉 졸자길) 45 / 24. 智小而謀大 無禍者鮮矣(지소이모대 무화자선의) 48 / 25. 愼終如始(신종여시) 50 / 26. 人滿則喪(인만즉상) 52 / 27. 寸陰是競(촌음시경) 53 / 28. 衆口 難調(중구 난조) 54 / 29. 明智 可以涉危難(명지 가이섭위난) 55 / 30. 開口告人 難(개구고인 난) 56 / 31. 遠親 不如近隣(원친 불여근린) 57 / 32. 非災橫禍 不入愼家之門(비재횡화 불입신가지문) 58 / 33. 良田萬頃 不如薄藝隨身(양전만경 불여박예수신) 59 / 34.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 60 / 35. 酒色財氣 世人跳得出(주색재기 세인도득출) 62
13. 立敎篇(입교편)
01. 立身有義 而孝爲本(입신유의 이효위본) 64 / 02. 爲政之要 曰公與淸(위정지요 왈공요청) 67 / 03. 讀書 起家之本(독서 기가지본) 68 / 04. 一生之計 在於幼(일생지계 재어유) 70 / 05. 五敎 五倫(오교 오륜) 72 / 06. 三綱(삼강) 74 / 07. 忠臣 不事二君(충신 불사이군) 77 / 08. 治官 莫若平(치관 막약평) 79 / 09. 張思叔座右銘(장사숙좌우명) 81 / 10. 於存心修身 大有所害(어존심수신 대유소해) 84 / 11.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① 88 / 12.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② 90 / 13.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③ 93 / 14.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④ 95 / 15.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⑤ 97
14. 治政篇(치정편)
01. 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일명지사 구존심어애물) 100 / 02. 上天 難欺(상천 난기) 102 / 03. 當官之法 唯有三事(당관지법 유유삼사) 104 / 04. 當官者 必以暴怒爲戒(당관자 필이포노위계) 106 / 05. 處官事 如家事(처관사 여가사) 108 / 06. 若能以事父兄之道(약능이사부형지도) 110 / 07. 正己以格物(정기이격물) 112 / 08. 迎斧鉞而正諫(영부월이정간) 114
15. 治家篇(치가편)
01. 必咨稟於家長(필자품어가장) 118 / 02. 治家 不得不儉(치가 부득불검) 119 / 03. 痴人 畏婦(치인 외부) 120 / 04. 凡使奴僕 先念飢寒(범사노복 선념기한) 121 / 05.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 122 / 06. 夜夜備賊來(야야비적래) 123 / 07. 觀朝夕之早晏 可以興替(관조석지조안 가이흥체) 124 / 08. 婚娶而論財 夷虜之道也(혼취이론재 이로지도야) 125
16. 安義篇(안의편)
01. 一家之親 此三者而已矣(일가지친 차삼자이이의) 128 / 02. 兄弟爲手足 夫婦爲衣服(형제위수족 부부위의복) 130 / 03. 富不親兮貧不疎 大丈夫(부불친혜빈불소 대장부) 131
17. 遵禮篇(준례편)
01. 居家有禮故 長幼辨(거가유례고 장유변) 134 / 02. 君子有勇而無禮 爲亂(군자유용이무례 위란) 137 / 03. 三達尊(삼달존) 139 / 04. 老少長幼 天分秩序(노소장유 천분질서) 141 / 05. 出門 如見大賓(출문 여견대빈) 142 / 06. 無過我重人(무과아중인) 143 / 07. 子不談父之過(자부담부지과) 144
18. 言語篇(언어편)
01. 言不中理 不如不言(언부중리 불여불언) 146 / 02. 一言不中 千語無用(일언부중 천어무용) 147 / 03. 口舌者 禍患之門(구설자 화환지문) 148 / 04. 一言利人 重値千金(일언이인 중치천금) 149 / 05. 閉口深藏舌(폐구심장설) 150 / 06. 未可全抛一片心(미가전포일편심) 151 / 07. 話不投機一句多(화불투기일구다) 152
19. 交友篇(교우편)
01. 必愼其所與處者焉(필신기소여처자언) 154 / 02. 與好人同行 時時有潤(여호인동행 시시유윤) 157 / 03. 久而敬之(구이경지) 158 / 04. 知心能幾人(지심능기인) 160 / 05. 急難之朋 一個無(급난지붕 일개무) 161 / 06. 無義之朋 不可交(무의지붕 불가교) 162 / 07. 君子之交 淡如水(군자지교 담여수) 163 / 08. 日久見人心(일구견인심) 165
20. 婦行篇(부행편)
01.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① 168 / 02.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② 170 / 03.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③ 171 / 04.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④ 173 / 05. 婦人之禮 語必細(부인지례 어필세) 175 / 06. 賢婦 令夫貴(현부 영부귀) 176 / 07. 家有賢妻 夫不遭橫禍(가유현처 부부조횡화) 177 / 08. 賢婦 和六親(현부 화육친) 178
21. 增補篇(증보편)
01. 善不積 不足以成名(선부적 부족이성명) 180 / 02. 履霜 堅氷至(이상 견빙지) 182
22. 八反歌 八首(팔반가 팔수)
01. 八反歌 一首(팔반가 일수) 186 / 02. 八反歌 二首(팔반가 이수) 187 / 03. 八反歌 三首(팔반가 삼수) 189 / 04. 八反歌 四首(팔반가 사수) 191 / 05. 八反歌 五首(팔반가 오수) 192 / 06. 八反歌 六首(팔반가 육수) 193 / 07. 八反歌 七首(팔반가 칠수) 194 / 08. 八反歌 八首(팔반가 팔수) 195
23. 孝行篇 續(효행편 속)
01. 孫順 欲埋堀地 有石鐘(손순 욕매굴지 유석종) 198 / 02. 尙德 則刲髀肉食之(상덕 즉규비육사지) 201 / 03. 都氏家貧至孝(도씨가빈지효) 203
24. 廉義篇(염의편)
01. 印觀 暑調 二人相讓(인관 서조 이인상양) 208 / 02. 洪耆燮 劉哥(홍기섭 유가) 211 / 03. 溫達 高句麗平原王之女(온달 고구려평원왕지녀) 216
25. 勸學篇(권학편)
01. 朱子勸學文(주자권학문) 220 / 02.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로학난성) 222 / 03. 盛年不重來(성년부중래) 224 / 04. 不積蹞步 無以至千里(부적규보 무이지천리) 226
12. 省心篇 下(성심편 하)
성심편은 충효, 검소 등 생활덕목 형태의 글로, 상하 총 9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편도 〈省心篇 上(성심편 상)〉과 마찬가지로 마음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말하고 있다. 세상을 살면서 접하는 일이나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유의할 점을 나열하고 있다.
역시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편안한 내면 상태의 유지를 권고한다. 남에 대한 선(善)의 유지, 재물에 관해 대수롭지 않은 태도, 쩨쩨하지 않은 삶 등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낯익은 명언도 이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01. 禍起傷身 皆是不仁之召(화기상신 개시불인지소)
재앙과 몸이 상함은 어질지 못한 탓이다
禍起傷身 皆是不仁之召
眞宗皇帝御製曰(진종황제어제 眞宗皇帝(진종황제)(宋 眞宗, 968년~1022년) : 중국 송나라 제3대 임금으로, 이름은 항(恒), 태종(太宗)의 셋째 아들, 재위 25년(997~1022), 연호는 함평(咸平), 경덕(景德), 대중상부(大中祥符), 천희(天禧), 건흥(乾興) 5가지였다. [고문진보] 01. 眞宗皇帝勸學(진종황제권학) - 眞宗皇帝(진종황제) 참고. 御製(어제) : 제왕이 직접 지은 글을 가리킨다.
왈)
知危識險(지위식험)이면 終無羅網之門(종무라망 羅網(라망) : ‘羅’를 罹(리: 걸리다)로 보아 ‘그물에 걸리다’로 새기는 방법도 있다. 또 ‘羅網’은 그대로 쓰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網羅(망라)’, 곧 ‘그물’, ‘그물질하다’, ‘그물에 걸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고전에 가끔 발견된다.
지문)이요
擧善薦賢(거선천 薦(천) : 천거할 ‘천’. 천거하다. 드리다.
현)이면 自有安身之路(자유안신지로)라
施仁布德(시인포덕)은 乃世代之榮昌(내세대지영창)이요
懷妬報寃(회투보원) 懷妬報寃(회투보원) :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에 보복함. 妬는 샘낼 ‘투’. 寃은 원통할 ‘원’
은 與子孫之危患(여자손지위환)이라
損人利己(손인이기) 損人利己(손인이기) : ‘남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덜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면 終無顯達雲仍(종무현달운잉 雲仍(운잉) : 후손, 자손의 의미인데, ‘雲礽(운잉)’으로 쓰기도 한다. 자기의 7, 8代 되는 손, 곧 구름이 멀리 떠 있듯이, 먼 후손이다. 이것을 표로 만들면 이러하다. 나-子①-孫②-曾孫③-玄(高)孫④-來孫⑤-昆孫⑥-仍孫⑦-雲孫⑧
)이요
害衆成家(해중성가)면 豈有長久富貴(기유장구부귀)리요
改名異體(개명이체)는 皆因巧語而生(개인교어이생)이요 改名(개명) : 여기서는 죄를 지어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異體(이체) : 殊死(수사: 殊는 ‘베이다, 끊어지다’는 의미로, 殊死는 목이 베이는 형벌)에 처해 몸과 목이 따로 놓이는 상태를 말한다. 改名異體(개명이체)는 皆因巧語而生(개인교언이생)이요 : ‘죄를 지어 이름을 바꾸고 목 베이는 형벌로 몸과 머리가 따로 놓이는 것은 교활한 말 때문에 생긴다.’는 의미이다.
禍起傷身(화기상신)은 皆是不仁之召(개시불인지소)니라
《진종황제어제(眞宗皇帝御製)》에 말하였다.
“위태로움을 알고 험한 것을 알면 마침내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요,
선한 사람을 받들어 쓰고 어진 사람을 천거하면 몸을 편안히 하는 길이 저절로 있다.
인(仁)을 베풀고 덕(德)을 폄은 곧 대대로 영화롭고 창성하는 것이요,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에 보복함은 자손에게 위태로움과 재앙을 끼쳐주는 것이다.
남을 해쳐 자기를 이롭게 하면 마침내 현달하는 자손[운잉雲仍]이 없고,
뭇사람을 해롭게 해서 집안을 크게 이룬다면 어찌 장구한 부귀가 있겠는가?
(죄를 지어) 이름을 고치고 (목이 베이어 죽는 형벌에 처해 머리와) 몸이 따로 놓임은 모두 교묘한 말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몸이 상하게 됨은 다 어질지 못함이 부르는 것이다.”
[해설]
여기서 건강한 삶의 태도, 곧 인(仁)한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죄를 지어 이름을 고치고 형벌에 처해 목과 몸이 따로 있게 되는 것은 모두 교묘한 말 때문에 생기고, 재앙이 일어나고 몸이 상하게 하는 것은 불인(不仁)의 소치(所致)임을 말하고 있다.
02. 常思已往之非(상사이왕지비)
언제나 지나간 잘못을 생각하라
常思已往之非
神宗皇帝御製曰(신종황제어제 神宗皇帝(신종황제) : 송나라 제6대 임금. 이름은 頊(욱), 영종(英宗)의 맏아들로 왕안석(王安石)을 등용하여 신법(新法)을 시행했으므로 크게 민중의 원망을 샀다. 재위 기간은 18년(1067~ 1085)으로, 38세에 세상을 떴다. 御製(어제) : 제왕이 직접 지은 글을 가리킨다.
왈)
遠非道之財(원비도 非道(비도) : ‘도리에 어긋난’의 의미이다.
지재)하고 戒過度之酒(계과도지주)하며
居必擇隣(거필택 擇(택) : 가릴 ‘택’. 가리다. 고르다.
린)하고 交必擇友(교필택우)하며
嫉妬(질투)를 勿起於心(물기어심)하고
讒言(참언) 讒言(참언) : 거짓 꾸며서 남을 비방하는 말이다. 讒은 참소(讒訴)할 ‘참’.
을 勿宣於口(물선 宣(선) : 베풀 ‘선’. 베풀다.
어구)하며
骨肉貧者(골육빈자)를 莫疎(막 莫(막) : 모두 ‘勿(말 ’물’: 말아라)의 의미이다.
소)하고
他人富者(타인부자)를 莫厚(막후)하며
克己(극기) 克己(극기) : 본래 私慾(欲), 곧 공적이지 못한 개인에 국한된 사사로운 욕구나 욕심을 이겨 내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論語(논어)》 〈顔淵(안연) 一章〉에 나오는 ‘克己復禮(극기복례)’가 이 점을 잘 말해준다.
는 以勤儉爲先(이근검위선)하고
愛衆(애중)은 以謙和爲首(이겸화위수)하며
常思已往之非(상사이왕지비)하고 每念未來之咎(매념미래지구 咎(구) : 허물 ‘구’. 허물.
)하라
若依朕之斯言(약의짐 朕(짐) : 황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사언)이면 治國家而可久(치국가이 而(이) : 즉(卽)의 의미로서, ‘곧’(~하면), ‘~은’(주격)의 뜻에 준한다.
가구)니라
《신종황제어제(神宗皇帝御製)》에 말하였다.
“도리(道理)가 아닌 재물은 멀리하고 도(度)에 지나치는 술을 경계하며,
거처함에 반드시 이웃을 가리고, 사귈 때는 벗을 가리며
질투를 마음에 일으키지 말고, 남을 헐뜯는 말을 입에서 내지 말며,
동기 간(同氣間)에 가난한 자를 멀리하지 말고,
타인 가운데 부유한 자를 후하게 대하지 말고,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는 일은 근검(勤儉)을 첫째로 삼고,
대중을 사랑함은 겸손과 화목을 첫째로 삼을 것이며,
언제나 지나간 나의 잘못을 생각하고, 매양 미래의 허물을 생각하라.
만약 이 말에 의거한다면 나라와 집안을 다스림이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설]
이 글은 제왕의 자리에서 마음의 성찰을 요구한 것이다. 도리가 아닌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에 지나치는 술을 경계하며, 반드시 이웃을 가려 살고, 벗을 가려 사귀며,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남을 헐뜯어 말하지 말며, 동기 간에 가난한 자를 소홀히 하지 말고, 부유한 자에게 아첨하지 말고,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는 것은 근검을 첫째로 삼고, 대중을 사랑하는 일에는 겸손함과 조화를 첫째로 삼을 것이며, 언제나 이미 지나간 나의 잘못됨을 생각하고, 또 앞날 저지를지도 모를 허물을 생각하여야 나라와 집안을 다스림이 오래도록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03. 盡是眞實而得(진시진실이득)
다 진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盡是眞實而得
高宗皇帝御製曰(고종황제 高宗皇帝(고종황제) : 남송(南宋)의 초대 임금이다. 흠종(欽宗) 원년(1126)에 금(金)나라가 대군(大軍)을 몰아 공격해 왔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없어 땅을 떼어 주고 배상금을 물어 숙질(叔侄)의 의(義)를 맺어 화평했는데 송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금(金)나라는 다시 쳐들어와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이 붙잡혀 가 이듬해 흠종의 아우 강왕(康王)이 즉위하였으니 이 사람이 곧 고종(高宗)이다.
어제왈)
一星之火(일성 一星(일성) : 一星은 아주 작은 한 점의 불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화)도 能燒萬頃之薪(능소만경지신 燒(소) : 불사를 ‘소’. 불사르다. 萬頃(만경) :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일컫는 말. 매우 넓은 부분을 역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頃은 이랑 ‘경’. 薪(신) : 섶 ‘신’. 섶(땔나무). 잡초.
)하고
半句非言(반구 半句(반구) : ‘반 마디’보다는 ‘한마디’로 해석하는 것도 좋다.
비언)도 誤損平生之德(오손평생지덕)이라
身被一縷(신피일루 縷(루, 누) : 실 ‘루’. 실.
)나 常思織女之勞(상사직녀지로)하고
日食三飧(일식삼손 飧(손) : 저녁밥 ‘손’. 飱(손)과 같이 쓰이는데, 아침밥을 ‘饔(옹)’이라 하고, 저녁밥을 ‘飧(손)’이라 한다. 그러나 대략 끼니를 가리킬 때 손(飧)이라 한다.
)이나 每念農夫之苦(매념농부지고)하라
苟貪妬損(구 苟(구) : 구차할 ‘구’. 여기서는 ‘구차하다’는 뜻이다. 조건절을 만드는 부사(진실로 ~한다면, 만약 ~한다면)로도 많이 쓰인다.
탐투손)이면 終無十載安康(종무십재 十載(십재) : 10년. 載는 실을 ‘재’. 여기서는 ‘해(年) 재’의 뜻이다.
안강)이요
積善存仁(적선존인)이면 必有榮華後裔(필유영화후예 後裔(후예) : 핏줄을 이은 먼 후손. 裔는 후손 ‘예’.
)니라
福緣善慶(복연선경) 福緣善慶(복연선경) : 복은 착한 일에서 오는 것이니, 착한 일을 하면 경사가 옴. 《주역》〈坤卦(곤괘) 文言傳(문언전)〉의 ‘積善之家(적선지가) 必有餘慶(필요여경)’에서 나온 말로 복은 선행을 쌓는데 연유한다는 말이다.
은 多因積行而生(다인적행이생)이요
入聖超凡(입성초범)은 盡是眞實而得(진시진실이득)이니라
《고종황제어제(高宗皇帝御製)》에 말하였다.
“한 점 작은 불티도 능히 만경(萬頃)의 섶을 태우고,
한마디 그릇된 말도 평생의 덕을 그르치고 훼손한다.
몸에 한 오라기의 실을 걸쳐도 항상 베 짜는 여자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니의 밥을 먹어도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구차하게 탐내고 시기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마침내 10년의 편안함도 없을 것이요,
선(善)을 쌓고 인(仁)을 보존하면 반드시 후손들에게 영화가 있으리라.
복(福)은 대부분 선행(善行)을 쌓는 것을 통해서 생기고,
성인(聖人)의 경지에 들어가고 평범을 초월하는 것은
다 진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해설]
이 글은 자못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한 점의 불티, 한 오라기의 실, 한마디 말, 한 끼니 밥과 같은 작은 일에도 늘 조심하고 탐냄과 시기, 선(善)과 복(福), 성인(聖人)과 진실(眞實) 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출전]
《천자문(千字文)》에 ‘福緣善慶(복연선경)’이라는 말이 보인다.
04. 欲識其人 先視其友(욕식기인 선시기우)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친구를 보라
欲識其人 先視其友
王良曰(왕량 王良(왕량) : 춘추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말을 잘 끌었던 사람이라는 설(說)과 후한(後漢) 때 사람이라는 설이 있다. 그는 자(字)가 중자(仲子)로, 신(新)나라 왕망(王莽)이 벼슬을 주었으나 응하지 않았고,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 대사도(大司徒)가 되었는데, 청렴하여 집안이 몹시 가난하였다고 한다. 포회(鮑恢)가 찾아갔는데, 마침 그의 아내가 산에서 땔나무 해 오는 것을 보고 크게 감탄하였다. 친구가 헐뜯는 말을 듣고는 벼슬을 그만두고 다시는 벼슬하지 않았다고 한다.
왈)
欲知其君(욕 欲(욕) : 여기서는 모두 ‘~하기를 바라다’ 또는 ‘~하고자 하다’라는 의미의 조동사로 해석해도 좋다.
지기군)인대 先視其臣(선시기신)하고
欲識其人(욕식기인)인대 先視其友(선시기우)하고
欲知其父(욕지기부)인대 先視其子(선시기자)하라
君聖臣忠(군성신충)하고 父慈子孝(부자자효)니라
왕량(王良)이 말하였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신하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벗을 살펴보고,
그 아비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살펴보라.
임금이 성스러우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비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도한다.”
[해설]
이 글은 한 집단 구성원끼리의 유사성, 유유상종(類類相從)이 주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곧 임금을 파악하려면 그 신하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 벗을 살펴보고, 아버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 자식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출전]
당나라 때의 강공보(姜公輔)가 지은 《태공가교(太公家教)》에 유사한 문장이 실려 있다.
太公家教 第八章
欲知其君(욕지기군) 使其所使(사기소사) 欲知其父(욕지기부) 先視其子(선시기자) 欲作其木(욕작기목) 視其文理(시기문리) 欲知其人(욕지기인) 先視奴婢(선시노비)
05. 水至淸則無魚(수지청즉무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水至淸則無魚
家語云(가어 家語(가어) : 《孔子家語(공자가어)》를 말하는데, 공자의 언행(言行)과 문인(門人)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것이다. 원래 27권으로 되어 있었으나 상당 부분 흩어져 없어지고, 위(魏)나라 왕숙(王肅)이 10권 44편으로 엮어 만들어 주(註)를 달았다. 따라서 《공자가어》는 그의 위작(僞作)이라고도 한다.
운)
水至淸則無魚(수지청즉무어)하고
人至察則無徒(인지찰즉무도 人至察(인지찰) : ‘사람이 지나치게 재거나 살피는 것’이다. 察은 살필 ‘찰’. 徒(도) : 무리 ‘도’. 무리. 동아리.
)니라
《가어(家語)》에 말하였다.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극히 살피면 친구가 없다.”
[해설]
이 글은 완벽을 추구하는 일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출전]
1) 《大戴禮記(대대례기)》 〈子張問入官(자장문입관)〉에 보인다.
자장이 공자에게 벼슬살이하는 것에 관해 묻자, 공자는 ‘安身取譽爲難(안신취예위난) 몸을 편안히 하고 명예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安身取譽如何(안신취예여하) 몸을 편안히 하고 명예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공자가 대답한 말 속에 들어 있다.
大戴禮記 子張問入官 6
今臨之明王之成功(금림지명왕지성공) 而民嚴而不迎也(이민엄이불영야) 道以數年之業(도이수년지업) 則民疾(즉민질) 疾者辟矣(질자벽의) 故古者冕而前旒(고고자면이전류) 所以蔽明也(소이폐명야) 統絖塞耳(통광색이) 所以弇聰也(소이엄총야) 故水至清則無魚(고수지청칙무어) 人至察則無徒(인지찰즉무도)
2) 통행본 《공자가어》에 보이지 않는다.
3) 《增廣賢文(증광현문)》에는 ‘水太淸則無魚(수태청즉무어)하고 人太察則無謀(인태찰즉무모)니라.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남들이 그를 위해 도모해 주지 않는다.’로 소개되어 있다.
4) 문선 동방삭 답객난(文選 東方朔 答客難)에 보인다.
水至清則無魚(수지청칙무어) 人至察則無徒(인지찰칙무도) 冕而前旒(면이전류) 所以蔽明(소이폐명) 黈纊充耳(주광충이) 所以塞聰(소이색총)
06. 春雨如膏 行人 惡其泥濘(춘우여고 행인 오기니녕)
인생살이의 잣대는 상대적이다
春雨如膏 行人 惡其泥濘
許敬宗曰(허경종 許敬宗(허경종) : 당(唐)나라 때 사람으로 자(字)는 연족(延族)이다. 그는 글을 잘했으나 몰래 무후(武后)에게 아부하고, 저수량(褚遂良),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을 죽이거나 축출했으며, 고조(高祖), 태종(太宗)의 실록을 마구 고쳤다.
왈)
春雨如膏(춘우여고)나 行人(행인)은 惡其泥濘(오기니녕)하고 春雨(춘우) 如膏(여고)나 行人(행인)은 惡其泥濘(오기니녕)하고 : 부사절+주절의 대구(對句)로 이루어진 이 글은 인생살이의 잣대는 상대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膏(고) : 기름 ‘고’. 惡(악, 오) : 미워할 ‘오’. 싫어하다. 泥濘(이녕) : 진창. 땅이 질어서 질퍽질퍽하게 된 곳. 泥는 진흙 ‘니(이)’. 濘은 진창 ‘녕(영)’.
秋月揚輝(추월양휘 揚輝(양휘) : 들어서 빛냄. 밝게 비추다. 揚은 날릴 ‘양’. 輝는 빛날 ‘휘’.
)나 盜者(도자)는 憎其照鑑(증기조감 憎(증) : 미울 ‘증’. 밉다. 미워하다. 鑑(감) : 거울 ‘감’. 비칠 ‘감’. 거울. 비추다.
)이니라
허경종(許敬宗)이 말하였다.
“봄비는 기름과 같으나 길 가는 사람은 그 진창을 싫어하고,
가을 달이 밝게 비치나 도둑은 그 밝게 비추는 것을 싫어한다.”
[해설]
사람들의 입장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 또는 대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07. 大丈夫 重名節於泰山(대장부 중명절어태산)
대장부는 명분과 절의를 중하게 여긴다
大丈夫 重名節於泰山
景行錄云(경행록운)
大丈夫(대장부)
見善明(견선명) 故(고)로 見善明故(견선명고) : 원문에서 모두 故자 앞에서 구두를 끊어, ‘大丈夫見善明이라 故로 重名節於泰山하고 用心精이라 故로 輕死生於鴻毛니라’로 끊어도 좋다.
重名節於泰山(중명절어태산)하고
用心精(용심정) 故(고)로 輕死生於鴻毛(경사생여홍모 鴻毛(홍모) : 기러기의 털. 아주 가벼운 사물(事物)의 비유. 鴻은 기러기 ‘홍’.
)니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대장부는
선(善)을 보는 것이 밝은 까닭에 명분과 절의를 태산보다 중히 여기고,
마음 쓰는 것이 깨끗한 까닭에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긴다.”
[해설]
선(善)과 정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대장부는 명분과 절의를 중하게 여기고, 생사(生死)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다.
[출전]
1) 《景行錄(경행록)》은 송(宋)나라 때 만들어진 책이라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2) 중국 송(宋)나라 이방헌(李邦獻)이 지은 《성심잡언(省心雜言)》 <正文(정문)>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大丈夫見善明 故重名節於泰山 用心剛 故輕生死如鴻毛
08. 濟人之急 求人之危(제인지급 구인지위)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겨라
濟人之急 求人之危
悶人之凶(민인지흉)하고 樂人之善(낙인지선)하며
濟人之急(제인지급)하고 求人之危(구인지위)니라 悶人之凶(민인지흉)하고…… 求人之危(구인지위)니라 : 여기서는 토(吐)를 ‘~하며(고) ~하며(고) ~하며(고) ~니라’로 해도 무방하다. 대체로 대등한 의미의 말을 나열하는 경우, ‘A하고 A하며 B하고 B니라’ 하거나 ‘A하며(고) B하며(고) C하며(고) D니라’로 吐를 단다. 悶(민) : 민망할 ‘민’. 민망하다. 근심하다. 濟(제) : 건널 ‘제’. 건너다. 돕다. 구제하다.
남의 흉한 일을 근심하고, 남의 선행을 즐거워하며,
남의 급한 처지를 구제하고, 남의 위태로움을 구해주니라.
[해설]
사람의 어려운 경우와 좋은 것을 각별히 배려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출전]
중국의 도교 경전인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태상감응편은 송대 이창령(李昌齡)이 〈포박자 抱朴子〉에서 초록(抄錄)한 것이라고 하며, 진덕수(眞德秀)가 서(序)를 지었다.
宜憫人之凶(의민인지흉) 樂人之善(낙인지선) 濟人之急(제인지급) 救人之危(구인지위) 見人之得(견인지득) 如己之得(여기지득) 見人之失(견인지실) 如其之失(여기지실) 사람들의 흉한 일을 근심하며 사람들의 선행을 즐거워하며, 사람들의 급한 처지를 구제해 주며, 사람들을 위태로움에서 구하여주며, 사람들의 이득을 보면 내가 이득을 얻은 것과 같이 여기며, 사람들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과 같이 여기라.
09. 背後之言 豈足深信(배후지언 기족심신)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믿으랴
背後之言 豈足深信
經目之事(경 經(경) : 지날 ‘경’. 지나다. 경험하다.
목지사)도 恐未皆眞(공미개 未皆(미개) : 부정어에 전체를 나타내는 부사가 붙어 있어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 ‘모두(다) ~이지는 않다’로 해석된다.
진)이어늘
背後之言(배후지언)을 豈足深信(기족 豈(기) : 어찌 ‘기’. 어찌, 어찌하여. 足(족) : 가능을 나타내므로 ‘~할 수 있다’의 조동사로 해석하면 좋다.
심신)이리오
눈으로 경험한 일도 모두 다 참되지는 아니할까 두렵거늘,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족히 깊이 믿을 수 있으리오?
[해설]
직접 눈으로 본 것도 다 진실한 것이 아닐까 두려운 법인데, 간접적으로 들은 말이야말로 그대로 믿어서는 더욱 안 된다는 말이다.
[출전]
불교의 자심관(慈心觀)에 같은 내용이 보인다. 자심관은 자비희사(慈悲喜捨)로 구성된 사종(四種) 선법문(禪法門) 중 하나이다.
慈心法門
經目之事(경목지신) 猶恐未真(유공미진) 背後之言(배후지언) 豈足深信(기족심신)
10. 只恨他家苦井深(지한타가고정심)
어리석은 자가 남을 탓하려 든다
只恨他家苦井深
不恨自家汲繩短(불한자가급승 恨(한) : 한 ‘한’. 한탄하다. 汲繩(급승) : 두레박 줄. 汲은 길을 급. (물을 긷다) . 繩은 노끈 ‘승’. 노끈. 줄.
단)하고
只恨他家苦井深(지 只(지) : 다만 ‘지’. 다만. 단지.
한타가고정심)이로다
자기 집 두레박 끈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단지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
[해설]
대체로 인간이란 자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출전]
《증광현문(增廣賢文)》에 유사한 문장이 있다.
不說自己井繩短(불설자기정승단) 反說他人箍井深(반설타인고정심)
※ 箍(고) : 테 ‘고’. 테. 둘레.
11. 罪拘薄福人(죄구박복인)
박복(薄福)한 사람만 법망(法網)에 걸려든다
罪拘薄福人
贓濫(장람)이 滿天下(만천하)하되
罪拘薄福人(죄구박복인)이니라 臟濫(장람)이……罪拘薄福人(죄구박복인)이니라 : 이 글에서 ‘罪는 拘薄福人이니라’로 끊어 읽으면 ‘부사절(주어+술어+보어)+주절(주어+술어+보어)’의 문장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贓(장) : 장물 ‘장’. 뇌물 받을 ‘장’. 장물. (뇌물을) 받다. 濫(람, 남) : 넘칠 ‘람’. 넘치다. 拘(구) : 잡을 ‘구’. 잡다. 薄福(박복) : 복이 적음. 복이 없음. 薄은 엷을 ‘박’.
부정한 재물을 취하는 사람이 천하에 가득하되,
죄는 복이 없는 사람에게 걸린다.
[해설]
부정한 재물을 취한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함에도, 재수 없이 박복(薄福)한 사람만 법망(法網)에 걸려든다는 의미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한숨을 자아내게 하는 글이다.
明心寶鑑
(명심보감)
하
책마음
365일 독자와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지혜와 풍요로운 삶의 지수를 높이는 책마음이 되겠습니다.
명심보감(明心寶鑑) (하)
발행 2025년 6월 28일
지은이 | 추적
옮긴이 | 우리고전연구회
펴낸이 | 김지숙
펴낸곳 | 도서출판 책마음
등록번호 | 제 2012-000047호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가산동 롯데 IT캐슬) B218호
전화 | 02-868-3018
팩스 | 02-868-3019
메일 | bookakdma@naver.com
I S B N | 세트 979-11-91146-55-4(05140)
하권 979-11-91146-57-8(05140)
값 세트 16,000원 각 권 8,000원
명심보감(明心寶鑑)
명심보감(明心寶鑑)은 고려 시대 충렬왕 때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낸 추적(秋適)이 1305년에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언(金言), 명구(名句)를 엮어서 저작했다. 후에 명나라 사람 범입본(范立本)이 추적(秋適)의 명심보감을 입수하여 증편하기도 했다.
개요
명심보감은 19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을 망라하여 편찬한 책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이다. 단순히 쉬운 문장들로 구성되어 한문 학습을 돕는 역할만 했다면 그 위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간결한 문장 안에 담긴 선인들의 보배로운 말과 글은 인격 수양을 돕고, 나아가 인생의 잠언으로 두고두고 숙독해 왔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현인들의 지혜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 전통적인 동양 사상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다.
어느 한 편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인간 본연의 착한 심성을 강조하며, 지족(知足)과 겸양의 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명언은 경세(經世)를 위한 수양서이자 제세에 필요한 교훈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역사
추적(秋適)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을 모아서, 19편으로 구성하고 편찬한 책이다.
중국으로 건너간 명심보감을 명나라 사람 범입본(范立本)이, 사서삼경을 비롯해 공자가어, 소학, 근사록, 성심잡언 등의 유교 경전과 유학자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여러 고전에서 금언(金言), 명구(名句)를 추려내, 추적(秋適)이 발췌하지 못한 고전 문구를 추가, 편집, 내용을 주제별로 엮어 보강한 증편 명심보감(일명: 청주본)을 편찬하였다. 상하 2권 20편이다.
그 후 조선시대 초기에 중국에서 한반도로 역수입된 것으로 보이며, 처음에는 중국 판본만 유통되다가 1454년(조선 단종 2년)에 민건(閔騫)의 후원으로 청주유학교수관 유득화(庾得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행하였다. 이는 청주본 발문에서 밝히는 내용이며 해당 판본에는 저자 범립본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로 자신을 수양하고 반성하고 양심을 기르는 인격 수양의 목적으로 가르쳤다.
임진왜란 이후로는 청주본이 1980년대에 재발견되기까지는 잊힌 것으로 보이며, 1637년에 원본 분량의 3분의 1만 담고 있는 초략본이 간행되어 원본을 대체하여 유통되었다. 이 정축본에는 제17편 존신편(存信篇)이 결락되어 총 19편으로 편성되었고 도교, 불교적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출판 의도나 저자가 명시된 서문, 발문 등의 기록이 없이 출판되었다. 그 후에도 1664년, 1844년, 1868년에 간행된 판본도 서문과 발문이 없이 간행되었다.
이와 같이 저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869년에 추씨 가문의 인흥서원에서 자신들의 선조인 예문관대제학을 지낸 추적이 명심보감을 편찬하였다고 써넣었다(인흥재사본).
명심보감은 국내에만도 수십 종에 이르는 판본이 전하고, 1305년에 편찬된 이래 각국에 널리 소개되었다.
당시 고려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일대의 국가에 널리 알려졌다. 1592년에는 베이징에 체류하던 스페인 선교사 코보가 명심보감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동양 문헌이 처음으로 서양어로 번역된 사례다. 이후 네덜란드어나 독일어로 번역되어 서구에까지 유포되었다.
현대에는 일부 학교에서 징계 목적으로 명심보감을 쓰게 하기도 한다.
현재 전하는 판본은 고종 6년(1869년) 추세문이 출판한 인흥재사본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2010년 건국대학교 중문과 교수인 임동석(林東錫)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 수십 종에 이르는 흩어진 판본들을 모아서 통합본 명심보감을 출판하였다.
구성
1. 계선(繼善) 계(繼)는 이어간다는 뜻이며 선(善)은 착함이니, 인생을 착하게 살아가라고 권유. 계선 편은 10장으로 구성
2. 천명(天命) 천명(天命)은 ‘하늘의 명령’이니, 하늘을 두려워하며 양심에 따라 살라고 권유. 천명 편은 7장으로 구성
3. 순명(順命) 명(命)은 곧 천명(天命)이니,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주어진 命을 받아들이라고 권유. 5장으로 구성
4. 효행(孝行)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네(詩經) 등, 부모님께 효도할 것과 이를 통해 자식에게 본보기가 됨을 강조. 6장으로 구성
5. 정기(正己)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할 것을 권유. 26장으로 구성
6. 안분(安分) 안(安)은 편안함이요 분(分)은 분수이니,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를 편안히 받아들이라고 권유. 7장으로 구성
7. 존심(存心)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 20장으로 구성
8. 계성(戒性) 성품을 경계하라(戒性).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 동안의 근심을 면하리라. 인내의 덕목을 강조. 9장으로 구성
9. 근학(勤學) 인간답기 위해서는 배움에 힘써야 함을 강조. 8장으로 구성
10. 훈자(訓子) 부모로서 제대로 자식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 10장으로 구성
11. 성심(省心) 분량이 매우 많아 상하로 나뉘어있다. 충효, 검소 등의 생활덕목부터 성리학, 도교 등 사상이 담긴 여러형태의 글로 구성. 상하 총 90장으로 구성
12. 입교(立敎)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두 올바른 가르침(원칙)을 세워야 함을 강조. 15장으로 구성
13. 치정(治政) 치(治)는 다스림이요, 정(政)은 부정(不正)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니, 관직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침. 8장으로 구성
14. 치가(治家) 집안을 잘 다스려라. 즉, 가정 윤리를 제시. 8장으로 구성
15. 안의(安義) 부자라서 친하지 않고, 가난뱅이라서 멀리하지 않는 이가 대장부(大丈夫)이니(소동파), 의리있게 사는 인간관계를 강조. 3장으로 구성
16. 준례(遵禮) 준(遵)은 따른다는 뜻이니, 인간이 따라야(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강조. 7장으로 구성
17. 존신(尊信) 청주본에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정축본과 인흥재사본에는 없다.
18. 언어(言語)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門)이다(君平). 말을 조심하라고 권유. 7장으로 구성
19. 교우(交友) 친구 사귀기의 중요성을 강조. 8장으로 구성
20. 부행(婦行)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이야기. 8장으로 구성
초략본에는 원본에 없는 증보편(增補篇), 팔반가(八反歌), 효행편(孝行篇), 염의편(廉義篇), 권학편(勸學篇)이 덧붙여져 있다.
편명과 조항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주본
(1454)
정축본
(1637)
인흥재사본
(1869)
계선(繼善)
47
11
11
천명(天命)
19
7
7
순명(順命)
16
5
5
효행(孝行)
19
5
5
정기(正己)
117
26
26
안분(安分)
18
5
6
존심(存心)
82
20
21
계성(戒性)
15
9
11
근학(勤學)
22
8
8
훈자(訓子)
17
9
9
성심(省心)
256
85
91
입교(立敎)
17
10
10
치정(治政)
22
8
8
치가(治家)
16
8
8
안의(安義)
5
3
3
준례(遵禮)
21
7
7
존신(存信)
7
0
0
언어(言語)
25
7
7
교우(交友)
24
8
8
부행(婦行)
9
5
5
추적(秋適)
출생 1246년 고려 양광도 양지현(現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사망 1317년(향년 72세) 고려 개경
본관 추계(秋溪)
별칭 자(字) 관중(慣中), 호(號) 노당(露堂), 시호(諡號) 문헌(文憲)
경력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추적(秋適, 1246년 ∼ 1317년)은 고려의 문신이다. 본관은 추계(秋溪). 자는 관중(慣中), 호는 노당(露堂)이다. 충렬왕 때,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역임하였다. 시랑(侍郞) 겸 국학 교수(國學敎授)로 재임할 때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집필하였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인흥서원(仁興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다.
노당(露堂) 추적(秋適)은 1246년(고려 고종 33년) 양광도에서 태어났다.
추적의 아버지인 추영수(秋永壽)는 1209년(고려 희종 5년) 국자시에 장원급제하여 문하시중을 역임하였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추적(秋適)은 성품이 활달하여 얽매임이 없었다고 한다.
1260년(고려 원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안동서기(安東書記), 직사관(直史館)을 거쳐 좌사간(左司諫)에 올랐다.
1298년(충렬왕 24) 환관 황석량(黃石良)이 권세를 이용하여, 황석량의 고향인 합덕부곡(合德部曲 : 현재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을 현(縣)으로 승격시키려고 할 때, 추적이 문안에 서명을 거부하자, 황석량은 내수(內竪) 석천보(石天補), 김광연(金光衍)과 함께 기회를 노려 추적을 참소하니, 왕이 형구를 채워 순마소(巡馬所)에 수감하게 했다. 압송하는 사람이 추적더러, 원한다면 골목길로 갈 수도 있다고 후의를 보였으나 추적은 거절했다. “죄를 저지른 자를 모두 해당 관청으로 보낼 때 대궐에서 형구를 채운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으니 내가 큰 거리를 지나면서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 간관(諫官)으로서 형구를 차는 것 또한 영광이니, 어찌 아녀자가 거리에서 얼굴 가리는 것처럼 행동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추적은 곧 복권되어 1299년 시랑으로 북계 용주(龍州)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1302년(충렬왕 28년) 찬성사(贊成事) 안향(安珦)에 의하여 시랑(侍郞) 겸 국학 교수(國學敎授)로 발탁되어 이성(李晟), 최원충(崔元冲) 등과 함께 7품 이하의 관리 혹은 생원들에 대한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안향(安珦)과 더불어 정주학(程朱學)의 도입을 꾀하였다. 1305년 시랑 국학교수로서 교양서인 《명심보감(明心寶鑑)》을 편찬하였다.
1306년(충렬왕 32년) 민부상서(民部尙書)를 역임하고,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이르렀다.
추적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다.
조선 순조 35년(1825) 10월 팔도 유림(儒林)과 추적의 20대손인 추세문(秋世文)이 뜻을 모아 창건한 대구의 인흥서원(仁興書院)에 배향되었다. 조선 고종 1년(1864년) 홍문관제학을 역임한 조선의 문신 해장 신석우(申錫愚, 1805~ 1865)가 비문을 지어 추적 신도비(秋適神道裨)를 건립하였다.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세운 주세붕(周世鵬)은 《무릉잡고(武陵雜稿)》에 노당 추적의 공적을 "해동에서 유교를 숭상하고 학교를 건립한 도(道)가 복초당 안선생 문성공 유와 노당 추선생 문헌공 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까지 누구라고 흠모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 고려와 조선의 유교가 안향과 추적 두 선생에서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다.
차 례
明心寶鑑(명심보감) • 3
추적(秋適) • 8
12. 省心篇 下(성심편 하)
01. 禍起傷身 皆是不仁之召(화기상신 개시불인지소) 14 / 02. 常思已往之非(상사이왕지비) 16 / 03. 盡是眞實而得(진시진실이득) 18 / 04. 欲識其人 先視其友(욕식기인 선시기우) 20 / 05. 水至淸則無魚(수지청즉무어) 22 / 06. 春雨如膏 行人 惡其泥濘(춘우여고 행인 오기니녕) 24 / 07. 大丈夫 重名節於泰山(대장부 중명절어태산) 25 / 08. 濟人之急 求人之危(제인지급 구인지위) 26 / 09. 背後之言 豈足深信(배후지언 기족심신) 27 / 10. 只恨他家苦井深(지한타가고정심) 28 / 11. 罪拘薄福人(죄구박복인) 29 / 12. 人若改常 不病則死(인약개상 불병즉사) 30 / 13. 國正天心順(국정천심순) 31 / 14. 人受諫則聖(인수간즉성) 33 / 15. 更有收人在後頭(갱유수인재후두) 35 / 16. 無故而得千金 必有大禍(무고이득천금 필유대화) 37 / 17. 人虧我是福(인휴아시복) 38 / 18. 良田萬頃 日食二升(양전만경 일식이승) 39 / 19. 頻來親也疎(빈래친야소) 40 / 20. 醉後添盃 不如無(취후첨배 불여무) 42 / 21. 酒不醉人人自醉(주불취인인자취) 43 / 22. 公心 若比私心 何事不辦(공심 약비사심 하사불판) 44 / 23. 巧者凶 拙者吉(교자흉 졸자길) 45 / 24. 智小而謀大 無禍者鮮矣(지소이모대 무화자선의) 48 / 25. 愼終如始(신종여시) 50 / 26. 人滿則喪(인만즉상) 52 / 27. 寸陰是競(촌음시경) 53 / 28. 衆口 難調(중구 난조) 54 / 29. 明智 可以涉危難(명지 가이섭위난) 55 / 30. 開口告人 難(개구고인 난) 56 / 31. 遠親 不如近隣(원친 불여근린) 57 / 32. 非災橫禍 不入愼家之門(비재횡화 불입신가지문) 58 / 33. 良田萬頃 不如薄藝隨身(양전만경 불여박예수신) 59 / 34.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 60 / 35. 酒色財氣 世人跳得出(주색재기 세인도득출) 62
13. 立敎篇(입교편)
01. 立身有義 而孝爲本(입신유의 이효위본) 64 / 02. 爲政之要 曰公與淸(위정지요 왈공요청) 67 / 03. 讀書 起家之本(독서 기가지본) 68 / 04. 一生之計 在於幼(일생지계 재어유) 70 / 05. 五敎 五倫(오교 오륜) 72 / 06. 三綱(삼강) 74 / 07. 忠臣 不事二君(충신 불사이군) 77 / 08. 治官 莫若平(치관 막약평) 79 / 09. 張思叔座右銘(장사숙좌우명) 81 / 10. 於存心修身 大有所害(어존심수신 대유소해) 84 / 11.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① 88 / 12.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② 90 / 13.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③ 93 / 14.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④ 95 / 15. 十盜 三耗(십도 삼모) ⑤ 97
14. 治政篇(치정편)
01. 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일명지사 구존심어애물) 100 / 02. 上天 難欺(상천 난기) 102 / 03. 當官之法 唯有三事(당관지법 유유삼사) 104 / 04. 當官者 必以暴怒爲戒(당관자 필이포노위계) 106 / 05. 處官事 如家事(처관사 여가사) 108 / 06. 若能以事父兄之道(약능이사부형지도) 110 / 07. 正己以格物(정기이격물) 112 / 08. 迎斧鉞而正諫(영부월이정간) 114
15. 治家篇(치가편)
01. 必咨稟於家長(필자품어가장) 118 / 02. 治家 不得不儉(치가 부득불검) 119 / 03. 痴人 畏婦(치인 외부) 120 / 04. 凡使奴僕 先念飢寒(범사노복 선념기한) 121 / 05.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 122 / 06. 夜夜備賊來(야야비적래) 123 / 07. 觀朝夕之早晏 可以興替(관조석지조안 가이흥체) 124 / 08. 婚娶而論財 夷虜之道也(혼취이론재 이로지도야) 125
16. 安義篇(안의편)
01. 一家之親 此三者而已矣(일가지친 차삼자이이의) 128 / 02. 兄弟爲手足 夫婦爲衣服(형제위수족 부부위의복) 130 / 03. 富不親兮貧不疎 大丈夫(부불친혜빈불소 대장부) 131
17. 遵禮篇(준례편)
01. 居家有禮故 長幼辨(거가유례고 장유변) 134 / 02. 君子有勇而無禮 爲亂(군자유용이무례 위란) 137 / 03. 三達尊(삼달존) 139 / 04. 老少長幼 天分秩序(노소장유 천분질서) 141 / 05. 出門 如見大賓(출문 여견대빈) 142 / 06. 無過我重人(무과아중인) 143 / 07. 子不談父之過(자부담부지과) 144
18. 言語篇(언어편)
01. 言不中理 不如不言(언부중리 불여불언) 146 / 02. 一言不中 千語無用(일언부중 천어무용) 147 / 03. 口舌者 禍患之門(구설자 화환지문) 148 / 04. 一言利人 重値千金(일언이인 중치천금) 149 / 05. 閉口深藏舌(폐구심장설) 150 / 06. 未可全抛一片心(미가전포일편심) 151 / 07. 話不投機一句多(화불투기일구다) 152
19. 交友篇(교우편)
01. 必愼其所與處者焉(필신기소여처자언) 154 / 02. 與好人同行 時時有潤(여호인동행 시시유윤) 157 / 03. 久而敬之(구이경지) 158 / 04. 知心能幾人(지심능기인) 160 / 05. 急難之朋 一個無(급난지붕 일개무) 161 / 06. 無義之朋 不可交(무의지붕 불가교) 162 / 07. 君子之交 淡如水(군자지교 담여수) 163 / 08. 日久見人心(일구견인심) 165
20. 婦行篇(부행편)
01.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① 168 / 02.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② 170 / 03.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③ 171 / 04. 女有四德之譽(여유사덕지예) ④ 173 / 05. 婦人之禮 語必細(부인지례 어필세) 175 / 06. 賢婦 令夫貴(현부 영부귀) 176 / 07. 家有賢妻 夫不遭橫禍(가유현처 부부조횡화) 177 / 08. 賢婦 和六親(현부 화육친) 178
21. 增補篇(증보편)
01. 善不積 不足以成名(선부적 부족이성명) 180 / 02. 履霜 堅氷至(이상 견빙지) 182
22. 八反歌 八首(팔반가 팔수)
01. 八反歌 一首(팔반가 일수) 186 / 02. 八反歌 二首(팔반가 이수) 187 / 03. 八反歌 三首(팔반가 삼수) 189 / 04. 八反歌 四首(팔반가 사수) 191 / 05. 八反歌 五首(팔반가 오수) 192 / 06. 八反歌 六首(팔반가 육수) 193 / 07. 八反歌 七首(팔반가 칠수) 194 / 08. 八反歌 八首(팔반가 팔수) 195
23. 孝行篇 續(효행편 속)
01. 孫順 欲埋堀地 有石鐘(손순 욕매굴지 유석종) 198 / 02. 尙德 則刲髀肉食之(상덕 즉규비육사지) 201 / 03. 都氏家貧至孝(도씨가빈지효) 203
24. 廉義篇(염의편)
01. 印觀 暑調 二人相讓(인관 서조 이인상양) 208 / 02. 洪耆燮 劉哥(홍기섭 유가) 211 / 03. 溫達 高句麗平原王之女(온달 고구려평원왕지녀) 216
25. 勸學篇(권학편)
01. 朱子勸學文(주자권학문) 220 / 02.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로학난성) 222 / 03. 盛年不重來(성년부중래) 224 / 04. 不積蹞步 無以至千里(부적규보 무이지천리) 226
12. 省心篇 下(성심편 하)
성심편은 충효, 검소 등 생활덕목 형태의 글로, 상하 총 9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편도 〈省心篇 上(성심편 상)〉과 마찬가지로 마음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말하고 있다. 세상을 살면서 접하는 일이나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유의할 점을 나열하고 있다.
역시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편안한 내면 상태의 유지를 권고한다. 남에 대한 선(善)의 유지, 재물에 관해 대수롭지 않은 태도, 쩨쩨하지 않은 삶 등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낯익은 명언도 이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01. 禍起傷身 皆是不仁之召(화기상신 개시불인지소)
재앙과 몸이 상함은 어질지 못한 탓이다
禍起傷身 皆是不仁之召
眞宗皇帝御製曰(진종황제어제 眞宗皇帝(진종황제)(宋 眞宗, 968년~1022년) : 중국 송나라 제3대 임금으로, 이름은 항(恒), 태종(太宗)의 셋째 아들, 재위 25년(997~1022), 연호는 함평(咸平), 경덕(景德), 대중상부(大中祥符), 천희(天禧), 건흥(乾興) 5가지였다. [고문진보] 01. 眞宗皇帝勸學(진종황제권학) - 眞宗皇帝(진종황제) 참고. 御製(어제) : 제왕이 직접 지은 글을 가리킨다.
왈)
知危識險(지위식험)이면 終無羅網之門(종무라망 羅網(라망) : ‘羅’를 罹(리: 걸리다)로 보아 ‘그물에 걸리다’로 새기는 방법도 있다. 또 ‘羅網’은 그대로 쓰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網羅(망라)’, 곧 ‘그물’, ‘그물질하다’, ‘그물에 걸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고전에 가끔 발견된다.
지문)이요
擧善薦賢(거선천 薦(천) : 천거할 ‘천’. 천거하다. 드리다.
현)이면 自有安身之路(자유안신지로)라
施仁布德(시인포덕)은 乃世代之榮昌(내세대지영창)이요
懷妬報寃(회투보원) 懷妬報寃(회투보원) :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에 보복함. 妬는 샘낼 ‘투’. 寃은 원통할 ‘원’
은 與子孫之危患(여자손지위환)이라
損人利己(손인이기) 損人利己(손인이기) : ‘남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덜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면 終無顯達雲仍(종무현달운잉 雲仍(운잉) : 후손, 자손의 의미인데, ‘雲礽(운잉)’으로 쓰기도 한다. 자기의 7, 8代 되는 손, 곧 구름이 멀리 떠 있듯이, 먼 후손이다. 이것을 표로 만들면 이러하다. 나-子①-孫②-曾孫③-玄(高)孫④-來孫⑤-昆孫⑥-仍孫⑦-雲孫⑧
)이요
害衆成家(해중성가)면 豈有長久富貴(기유장구부귀)리요
改名異體(개명이체)는 皆因巧語而生(개인교어이생)이요 改名(개명) : 여기서는 죄를 지어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異體(이체) : 殊死(수사: 殊는 ‘베이다, 끊어지다’는 의미로, 殊死는 목이 베이는 형벌)에 처해 몸과 목이 따로 놓이는 상태를 말한다. 改名異體(개명이체)는 皆因巧語而生(개인교언이생)이요 : ‘죄를 지어 이름을 바꾸고 목 베이는 형벌로 몸과 머리가 따로 놓이는 것은 교활한 말 때문에 생긴다.’는 의미이다.
禍起傷身(화기상신)은 皆是不仁之召(개시불인지소)니라
《진종황제어제(眞宗皇帝御製)》에 말하였다.
“위태로움을 알고 험한 것을 알면 마침내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요,
선한 사람을 받들어 쓰고 어진 사람을 천거하면 몸을 편안히 하는 길이 저절로 있다.
인(仁)을 베풀고 덕(德)을 폄은 곧 대대로 영화롭고 창성하는 것이요,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에 보복함은 자손에게 위태로움과 재앙을 끼쳐주는 것이다.
남을 해쳐 자기를 이롭게 하면 마침내 현달하는 자손[운잉雲仍]이 없고,
뭇사람을 해롭게 해서 집안을 크게 이룬다면 어찌 장구한 부귀가 있겠는가?
(죄를 지어) 이름을 고치고 (목이 베이어 죽는 형벌에 처해 머리와) 몸이 따로 놓임은 모두 교묘한 말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몸이 상하게 됨은 다 어질지 못함이 부르는 것이다.”
[해설]
여기서 건강한 삶의 태도, 곧 인(仁)한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죄를 지어 이름을 고치고 형벌에 처해 목과 몸이 따로 있게 되는 것은 모두 교묘한 말 때문에 생기고, 재앙이 일어나고 몸이 상하게 하는 것은 불인(不仁)의 소치(所致)임을 말하고 있다.
02. 常思已往之非(상사이왕지비)
언제나 지나간 잘못을 생각하라
常思已往之非
神宗皇帝御製曰(신종황제어제 神宗皇帝(신종황제) : 송나라 제6대 임금. 이름은 頊(욱), 영종(英宗)의 맏아들로 왕안석(王安石)을 등용하여 신법(新法)을 시행했으므로 크게 민중의 원망을 샀다. 재위 기간은 18년(1067~ 1085)으로, 38세에 세상을 떴다. 御製(어제) : 제왕이 직접 지은 글을 가리킨다.
왈)
遠非道之財(원비도 非道(비도) : ‘도리에 어긋난’의 의미이다.
지재)하고 戒過度之酒(계과도지주)하며
居必擇隣(거필택 擇(택) : 가릴 ‘택’. 가리다. 고르다.
린)하고 交必擇友(교필택우)하며
嫉妬(질투)를 勿起於心(물기어심)하고
讒言(참언) 讒言(참언) : 거짓 꾸며서 남을 비방하는 말이다. 讒은 참소(讒訴)할 ‘참’.
을 勿宣於口(물선 宣(선) : 베풀 ‘선’. 베풀다.
어구)하며
骨肉貧者(골육빈자)를 莫疎(막 莫(막) : 모두 ‘勿(말 ’물’: 말아라)의 의미이다.
소)하고
他人富者(타인부자)를 莫厚(막후)하며
克己(극기) 克己(극기) : 본래 私慾(欲), 곧 공적이지 못한 개인에 국한된 사사로운 욕구나 욕심을 이겨 내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論語(논어)》 〈顔淵(안연) 一章〉에 나오는 ‘克己復禮(극기복례)’가 이 점을 잘 말해준다.
는 以勤儉爲先(이근검위선)하고
愛衆(애중)은 以謙和爲首(이겸화위수)하며
常思已往之非(상사이왕지비)하고 每念未來之咎(매념미래지구 咎(구) : 허물 ‘구’. 허물.
)하라
若依朕之斯言(약의짐 朕(짐) : 황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사언)이면 治國家而可久(치국가이 而(이) : 즉(卽)의 의미로서, ‘곧’(~하면), ‘~은’(주격)의 뜻에 준한다.
가구)니라
《신종황제어제(神宗皇帝御製)》에 말하였다.
“도리(道理)가 아닌 재물은 멀리하고 도(度)에 지나치는 술을 경계하며,
거처함에 반드시 이웃을 가리고, 사귈 때는 벗을 가리며
질투를 마음에 일으키지 말고, 남을 헐뜯는 말을 입에서 내지 말며,
동기 간(同氣間)에 가난한 자를 멀리하지 말고,
타인 가운데 부유한 자를 후하게 대하지 말고,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는 일은 근검(勤儉)을 첫째로 삼고,
대중을 사랑함은 겸손과 화목을 첫째로 삼을 것이며,
언제나 지나간 나의 잘못을 생각하고, 매양 미래의 허물을 생각하라.
만약 이 말에 의거한다면 나라와 집안을 다스림이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설]
이 글은 제왕의 자리에서 마음의 성찰을 요구한 것이다. 도리가 아닌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에 지나치는 술을 경계하며, 반드시 이웃을 가려 살고, 벗을 가려 사귀며,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남을 헐뜯어 말하지 말며, 동기 간에 가난한 자를 소홀히 하지 말고, 부유한 자에게 아첨하지 말고,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는 것은 근검을 첫째로 삼고, 대중을 사랑하는 일에는 겸손함과 조화를 첫째로 삼을 것이며, 언제나 이미 지나간 나의 잘못됨을 생각하고, 또 앞날 저지를지도 모를 허물을 생각하여야 나라와 집안을 다스림이 오래도록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03. 盡是眞實而得(진시진실이득)
다 진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盡是眞實而得
高宗皇帝御製曰(고종황제 高宗皇帝(고종황제) : 남송(南宋)의 초대 임금이다. 흠종(欽宗) 원년(1126)에 금(金)나라가 대군(大軍)을 몰아 공격해 왔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없어 땅을 떼어 주고 배상금을 물어 숙질(叔侄)의 의(義)를 맺어 화평했는데 송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금(金)나라는 다시 쳐들어와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이 붙잡혀 가 이듬해 흠종의 아우 강왕(康王)이 즉위하였으니 이 사람이 곧 고종(高宗)이다.
어제왈)
一星之火(일성 一星(일성) : 一星은 아주 작은 한 점의 불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화)도 能燒萬頃之薪(능소만경지신 燒(소) : 불사를 ‘소’. 불사르다. 萬頃(만경) :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일컫는 말. 매우 넓은 부분을 역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頃은 이랑 ‘경’. 薪(신) : 섶 ‘신’. 섶(땔나무). 잡초.
)하고
半句非言(반구 半句(반구) : ‘반 마디’보다는 ‘한마디’로 해석하는 것도 좋다.
비언)도 誤損平生之德(오손평생지덕)이라
身被一縷(신피일루 縷(루, 누) : 실 ‘루’. 실.
)나 常思織女之勞(상사직녀지로)하고
日食三飧(일식삼손 飧(손) : 저녁밥 ‘손’. 飱(손)과 같이 쓰이는데, 아침밥을 ‘饔(옹)’이라 하고, 저녁밥을 ‘飧(손)’이라 한다. 그러나 대략 끼니를 가리킬 때 손(飧)이라 한다.
)이나 每念農夫之苦(매념농부지고)하라
苟貪妬損(구 苟(구) : 구차할 ‘구’. 여기서는 ‘구차하다’는 뜻이다. 조건절을 만드는 부사(진실로 ~한다면, 만약 ~한다면)로도 많이 쓰인다.
탐투손)이면 終無十載安康(종무십재 十載(십재) : 10년. 載는 실을 ‘재’. 여기서는 ‘해(年) 재’의 뜻이다.
안강)이요
積善存仁(적선존인)이면 必有榮華後裔(필유영화후예 後裔(후예) : 핏줄을 이은 먼 후손. 裔는 후손 ‘예’.
)니라
福緣善慶(복연선경) 福緣善慶(복연선경) : 복은 착한 일에서 오는 것이니, 착한 일을 하면 경사가 옴. 《주역》〈坤卦(곤괘) 文言傳(문언전)〉의 ‘積善之家(적선지가) 必有餘慶(필요여경)’에서 나온 말로 복은 선행을 쌓는데 연유한다는 말이다.
은 多因積行而生(다인적행이생)이요
入聖超凡(입성초범)은 盡是眞實而得(진시진실이득)이니라
《고종황제어제(高宗皇帝御製)》에 말하였다.
“한 점 작은 불티도 능히 만경(萬頃)의 섶을 태우고,
한마디 그릇된 말도 평생의 덕을 그르치고 훼손한다.
몸에 한 오라기의 실을 걸쳐도 항상 베 짜는 여자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니의 밥을 먹어도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구차하게 탐내고 시기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마침내 10년의 편안함도 없을 것이요,
선(善)을 쌓고 인(仁)을 보존하면 반드시 후손들에게 영화가 있으리라.
복(福)은 대부분 선행(善行)을 쌓는 것을 통해서 생기고,
성인(聖人)의 경지에 들어가고 평범을 초월하는 것은
다 진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해설]
이 글은 자못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한 점의 불티, 한 오라기의 실, 한마디 말, 한 끼니 밥과 같은 작은 일에도 늘 조심하고 탐냄과 시기, 선(善)과 복(福), 성인(聖人)과 진실(眞實) 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출전]
《천자문(千字文)》에 ‘福緣善慶(복연선경)’이라는 말이 보인다.
04. 欲識其人 先視其友(욕식기인 선시기우)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친구를 보라
欲識其人 先視其友
王良曰(왕량 王良(왕량) : 춘추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말을 잘 끌었던 사람이라는 설(說)과 후한(後漢) 때 사람이라는 설이 있다. 그는 자(字)가 중자(仲子)로, 신(新)나라 왕망(王莽)이 벼슬을 주었으나 응하지 않았고,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 대사도(大司徒)가 되었는데, 청렴하여 집안이 몹시 가난하였다고 한다. 포회(鮑恢)가 찾아갔는데, 마침 그의 아내가 산에서 땔나무 해 오는 것을 보고 크게 감탄하였다. 친구가 헐뜯는 말을 듣고는 벼슬을 그만두고 다시는 벼슬하지 않았다고 한다.
왈)
欲知其君(욕 欲(욕) : 여기서는 모두 ‘~하기를 바라다’ 또는 ‘~하고자 하다’라는 의미의 조동사로 해석해도 좋다.
지기군)인대 先視其臣(선시기신)하고
欲識其人(욕식기인)인대 先視其友(선시기우)하고
欲知其父(욕지기부)인대 先視其子(선시기자)하라
君聖臣忠(군성신충)하고 父慈子孝(부자자효)니라
왕량(王良)이 말하였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신하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벗을 살펴보고,
그 아비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살펴보라.
임금이 성스러우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비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도한다.”
[해설]
이 글은 한 집단 구성원끼리의 유사성, 유유상종(類類相從)이 주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곧 임금을 파악하려면 그 신하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 벗을 살펴보고, 아버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 자식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출전]
당나라 때의 강공보(姜公輔)가 지은 《태공가교(太公家教)》에 유사한 문장이 실려 있다.
太公家教 第八章
欲知其君(욕지기군) 使其所使(사기소사) 欲知其父(욕지기부) 先視其子(선시기자) 欲作其木(욕작기목) 視其文理(시기문리) 欲知其人(욕지기인) 先視奴婢(선시노비)
05. 水至淸則無魚(수지청즉무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水至淸則無魚
家語云(가어 家語(가어) : 《孔子家語(공자가어)》를 말하는데, 공자의 언행(言行)과 문인(門人)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것이다. 원래 27권으로 되어 있었으나 상당 부분 흩어져 없어지고, 위(魏)나라 왕숙(王肅)이 10권 44편으로 엮어 만들어 주(註)를 달았다. 따라서 《공자가어》는 그의 위작(僞作)이라고도 한다.
운)
水至淸則無魚(수지청즉무어)하고
人至察則無徒(인지찰즉무도 人至察(인지찰) : ‘사람이 지나치게 재거나 살피는 것’이다. 察은 살필 ‘찰’. 徒(도) : 무리 ‘도’. 무리. 동아리.
)니라
《가어(家語)》에 말하였다.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극히 살피면 친구가 없다.”
[해설]
이 글은 완벽을 추구하는 일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출전]
1) 《大戴禮記(대대례기)》 〈子張問入官(자장문입관)〉에 보인다.
자장이 공자에게 벼슬살이하는 것에 관해 묻자, 공자는 ‘安身取譽爲難(안신취예위난) 몸을 편안히 하고 명예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安身取譽如何(안신취예여하) 몸을 편안히 하고 명예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공자가 대답한 말 속에 들어 있다.
大戴禮記 子張問入官 6
今臨之明王之成功(금림지명왕지성공) 而民嚴而不迎也(이민엄이불영야) 道以數年之業(도이수년지업) 則民疾(즉민질) 疾者辟矣(질자벽의) 故古者冕而前旒(고고자면이전류) 所以蔽明也(소이폐명야) 統絖塞耳(통광색이) 所以弇聰也(소이엄총야) 故水至清則無魚(고수지청칙무어) 人至察則無徒(인지찰즉무도)
2) 통행본 《공자가어》에 보이지 않는다.
3) 《增廣賢文(증광현문)》에는 ‘水太淸則無魚(수태청즉무어)하고 人太察則無謀(인태찰즉무모)니라.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남들이 그를 위해 도모해 주지 않는다.’로 소개되어 있다.
4) 문선 동방삭 답객난(文選 東方朔 答客難)에 보인다.
水至清則無魚(수지청칙무어) 人至察則無徒(인지찰칙무도) 冕而前旒(면이전류) 所以蔽明(소이폐명) 黈纊充耳(주광충이) 所以塞聰(소이색총)
06. 春雨如膏 行人 惡其泥濘(춘우여고 행인 오기니녕)
인생살이의 잣대는 상대적이다
春雨如膏 行人 惡其泥濘
許敬宗曰(허경종 許敬宗(허경종) : 당(唐)나라 때 사람으로 자(字)는 연족(延族)이다. 그는 글을 잘했으나 몰래 무후(武后)에게 아부하고, 저수량(褚遂良),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을 죽이거나 축출했으며, 고조(高祖), 태종(太宗)의 실록을 마구 고쳤다.
왈)
春雨如膏(춘우여고)나 行人(행인)은 惡其泥濘(오기니녕)하고 春雨(춘우) 如膏(여고)나 行人(행인)은 惡其泥濘(오기니녕)하고 : 부사절+주절의 대구(對句)로 이루어진 이 글은 인생살이의 잣대는 상대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膏(고) : 기름 ‘고’. 惡(악, 오) : 미워할 ‘오’. 싫어하다. 泥濘(이녕) : 진창. 땅이 질어서 질퍽질퍽하게 된 곳. 泥는 진흙 ‘니(이)’. 濘은 진창 ‘녕(영)’.
秋月揚輝(추월양휘 揚輝(양휘) : 들어서 빛냄. 밝게 비추다. 揚은 날릴 ‘양’. 輝는 빛날 ‘휘’.
)나 盜者(도자)는 憎其照鑑(증기조감 憎(증) : 미울 ‘증’. 밉다. 미워하다. 鑑(감) : 거울 ‘감’. 비칠 ‘감’. 거울. 비추다.
)이니라
허경종(許敬宗)이 말하였다.
“봄비는 기름과 같으나 길 가는 사람은 그 진창을 싫어하고,
가을 달이 밝게 비치나 도둑은 그 밝게 비추는 것을 싫어한다.”
[해설]
사람들의 입장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 또는 대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07. 大丈夫 重名節於泰山(대장부 중명절어태산)
대장부는 명분과 절의를 중하게 여긴다
大丈夫 重名節於泰山
景行錄云(경행록운)
大丈夫(대장부)
見善明(견선명) 故(고)로 見善明故(견선명고) : 원문에서 모두 故자 앞에서 구두를 끊어, ‘大丈夫見善明이라 故로 重名節於泰山하고 用心精이라 故로 輕死生於鴻毛니라’로 끊어도 좋다.
重名節於泰山(중명절어태산)하고
用心精(용심정) 故(고)로 輕死生於鴻毛(경사생여홍모 鴻毛(홍모) : 기러기의 털. 아주 가벼운 사물(事物)의 비유. 鴻은 기러기 ‘홍’.
)니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대장부는
선(善)을 보는 것이 밝은 까닭에 명분과 절의를 태산보다 중히 여기고,
마음 쓰는 것이 깨끗한 까닭에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긴다.”
[해설]
선(善)과 정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대장부는 명분과 절의를 중하게 여기고, 생사(生死)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다.
[출전]
1) 《景行錄(경행록)》은 송(宋)나라 때 만들어진 책이라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2) 중국 송(宋)나라 이방헌(李邦獻)이 지은 《성심잡언(省心雜言)》 <正文(정문)>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大丈夫見善明 故重名節於泰山 用心剛 故輕生死如鴻毛
08. 濟人之急 求人之危(제인지급 구인지위)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겨라
濟人之急 求人之危
悶人之凶(민인지흉)하고 樂人之善(낙인지선)하며
濟人之急(제인지급)하고 求人之危(구인지위)니라 悶人之凶(민인지흉)하고…… 求人之危(구인지위)니라 : 여기서는 토(吐)를 ‘~하며(고) ~하며(고) ~하며(고) ~니라’로 해도 무방하다. 대체로 대등한 의미의 말을 나열하는 경우, ‘A하고 A하며 B하고 B니라’ 하거나 ‘A하며(고) B하며(고) C하며(고) D니라’로 吐를 단다. 悶(민) : 민망할 ‘민’. 민망하다. 근심하다. 濟(제) : 건널 ‘제’. 건너다. 돕다. 구제하다.
남의 흉한 일을 근심하고, 남의 선행을 즐거워하며,
남의 급한 처지를 구제하고, 남의 위태로움을 구해주니라.
[해설]
사람의 어려운 경우와 좋은 것을 각별히 배려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출전]
중국의 도교 경전인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태상감응편은 송대 이창령(李昌齡)이 〈포박자 抱朴子〉에서 초록(抄錄)한 것이라고 하며, 진덕수(眞德秀)가 서(序)를 지었다.
宜憫人之凶(의민인지흉) 樂人之善(낙인지선) 濟人之急(제인지급) 救人之危(구인지위) 見人之得(견인지득) 如己之得(여기지득) 見人之失(견인지실) 如其之失(여기지실) 사람들의 흉한 일을 근심하며 사람들의 선행을 즐거워하며, 사람들의 급한 처지를 구제해 주며, 사람들을 위태로움에서 구하여주며, 사람들의 이득을 보면 내가 이득을 얻은 것과 같이 여기며, 사람들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과 같이 여기라.
09. 背後之言 豈足深信(배후지언 기족심신)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믿으랴
背後之言 豈足深信
經目之事(경 經(경) : 지날 ‘경’. 지나다. 경험하다.
목지사)도 恐未皆眞(공미개 未皆(미개) : 부정어에 전체를 나타내는 부사가 붙어 있어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 ‘모두(다) ~이지는 않다’로 해석된다.
진)이어늘
背後之言(배후지언)을 豈足深信(기족 豈(기) : 어찌 ‘기’. 어찌, 어찌하여. 足(족) : 가능을 나타내므로 ‘~할 수 있다’의 조동사로 해석하면 좋다.
심신)이리오
눈으로 경험한 일도 모두 다 참되지는 아니할까 두렵거늘,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족히 깊이 믿을 수 있으리오?
[해설]
직접 눈으로 본 것도 다 진실한 것이 아닐까 두려운 법인데, 간접적으로 들은 말이야말로 그대로 믿어서는 더욱 안 된다는 말이다.
[출전]
불교의 자심관(慈心觀)에 같은 내용이 보인다. 자심관은 자비희사(慈悲喜捨)로 구성된 사종(四種) 선법문(禪法門) 중 하나이다.
慈心法門
經目之事(경목지신) 猶恐未真(유공미진) 背後之言(배후지언) 豈足深信(기족심신)
10. 只恨他家苦井深(지한타가고정심)
어리석은 자가 남을 탓하려 든다
只恨他家苦井深
不恨自家汲繩短(불한자가급승 恨(한) : 한 ‘한’. 한탄하다. 汲繩(급승) : 두레박 줄. 汲은 길을 급. (물을 긷다) . 繩은 노끈 ‘승’. 노끈. 줄.
단)하고
只恨他家苦井深(지 只(지) : 다만 ‘지’. 다만. 단지.
한타가고정심)이로다
자기 집 두레박 끈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단지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
[해설]
대체로 인간이란 자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출전]
《증광현문(增廣賢文)》에 유사한 문장이 있다.
不說自己井繩短(불설자기정승단) 反說他人箍井深(반설타인고정심)
※ 箍(고) : 테 ‘고’. 테. 둘레.
11. 罪拘薄福人(죄구박복인)
박복(薄福)한 사람만 법망(法網)에 걸려든다
罪拘薄福人
贓濫(장람)이 滿天下(만천하)하되
罪拘薄福人(죄구박복인)이니라 臟濫(장람)이……罪拘薄福人(죄구박복인)이니라 : 이 글에서 ‘罪는 拘薄福人이니라’로 끊어 읽으면 ‘부사절(주어+술어+보어)+주절(주어+술어+보어)’의 문장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贓(장) : 장물 ‘장’. 뇌물 받을 ‘장’. 장물. (뇌물을) 받다. 濫(람, 남) : 넘칠 ‘람’. 넘치다. 拘(구) : 잡을 ‘구’. 잡다. 薄福(박복) : 복이 적음. 복이 없음. 薄은 엷을 ‘박’.
부정한 재물을 취하는 사람이 천하에 가득하되,
죄는 복이 없는 사람에게 걸린다.
[해설]
부정한 재물을 취한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함에도, 재수 없이 박복(薄福)한 사람만 법망(法網)에 걸려든다는 의미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한숨을 자아내게 하는 글이다.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권장 도서로서 첫손가락에 꼽는 <명심보감>은 예로부터 수신의 지침서로 읽히며 시대를 초월하여 만인의 인생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명심보감>은 삶의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 안에서 자기의 삶을 책임 있게 꾸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한다.
<명심보감(明心寶鑑)>이란 글자 뜻 그대로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된다.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 나아가 스승과 제자, 친구,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 거래관계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관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진다. <명심보감>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명심보감>은 삶의 교훈서로서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개선하여 올바르게 관계해 나갈 길을 말해준다.
총 25개의 편으로 나누어 인간의 자기 수양과 윤리, 도덕, 처세 등에 관한 예지를 수록하여 제목 그대로 마음을 밝게 해주어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세상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스스로 반성하게 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또 인생을 더 값지게 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삶의 지혜를 일깨운다.
서평
원문에 충실하였으며, 한자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하여 한자 옆에 훈을 달았다. 번역은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려 옮겼고, 해설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최소한으로 했으며, 원문의 출전을 밝히려고 애썼다.
한 권으로 엮기에는 분량이 많아 상, 하 두 권으로 나누었다.
부모를 화수분 내지는 금고 정도로 생각하며 존속살인까지 자행하는 세태에 ‘효’와 ‘자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리라 기대하며, 또 입시 경쟁에 등 떠밀려 친구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요즘 세상에 ‘우정’을 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스승이나 사표는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선생님을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직장인쯤으로 여기는 요즘, 참 스승의 길과 제자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부 관계를 그저 계약쯤으로 여겨 이혼율이 급증한 요즘 세태에 이상적인 부부 관을 제고하고, 직장에서 동료를 경쟁자나 내 밥그릇을 뺏는 사람으로 여기는 이들은 동료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명심보감> 속 지혜를 품을 수 있다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추적
추적(秋適)
출생 1246년 고려 양광도 양지현(現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사망 1317년(향년 72세) 고려 개경
본관 추계(秋溪)
별칭 자(字) 관중(慣中), 호(號) 노당(露堂), 시호(諡號) 문헌(文憲)
경력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추적(秋適, 1246년 ∼ 1317년)은 고려의 문신이다. 본관은 추계(秋溪). 자는 관중(慣中), 호는 노당(露堂)이다. 충렬왕 때,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역임하였다. 시랑(侍郞) 겸 국학 교수(國學敎授)로 재임할 때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집필하였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인흥서원(仁興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다.
노당(露堂) 추적(秋適)은 1246년(고려 고종 33년) 양광도에서 태어났다.
추적의 아버지인 추영수(秋永壽)는 1209년(고려 희종 5년) 국자시에 장원급제하여 문하시중을 역임하였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추적(秋適)은 성품이 활달하여 얽매임이 없었다고 한다.
1260년(고려 원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안동서기(安東書記), 직사관(直史館)을 거쳐 좌사간(左司諫)에 올랐다.
1298년(충렬왕 24) 환관 황석량(黃石良)이 권세를 이용하여, 황석량의 고향인 합덕부곡(合德部曲 : 현재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을 현(縣)으로 승격시키려고 할 때, 추적이 문안에 서명을 거부하자, 황석량은 내수(內竪) 석천보(石天補), 김광연(金光衍)과 함께 기회를 노려 추적을 참소하니, 왕이 형구를 채워 순마소(巡馬所)에 수감하게 했다. 압송하는 사람이 추적더러, 원한다면 골목길로 갈 수도 있다고 후의를 보였으나 추적은 거절했다. “죄를 저지른 자를 모두 해당 관청으로 보낼 때 대궐에서 형구를 채운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으니 내가 큰 거리를 지나면서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 간관(諫官)으로서 형구를 차는 것 또한 영광이니, 어찌 아녀자가 거리에서 얼굴 가리는 것처럼 행동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추적은 곧 복권되어 1299년 시랑으로 북계 용주(龍州)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1302년(충렬왕 28년) 찬성사(贊成事) 안향(安珦)에 의하여 시랑(侍郞) 겸 국학 교수(國學敎授)로 발탁되어 이성(李晟), 최원충(崔元冲) 등과 함께 7품 이하의 관리 혹은 생원들에 대한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안향(安珦)과 더불어 정주학(程朱學)의 도입을 꾀하였다. 1305년 시랑 국학교수로서 교양서인 《명심보감(明心寶鑑)》을 편찬하였다.
1306년(충렬왕 32년) 민부상서(民部尙書)를 역임하고,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이르렀다.
추적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다.
조선 순조 35년(1825) 10월 팔도 유림(儒林)과 추적의 20대손인 추세문(秋世文)이 뜻을 모아 창건한 대구의 인흥서원(仁興書院)에 배향되었다. 조선 고종 1년(1864년) 홍문관제학을 역임한 조선의 문신 해장 신석우(申錫愚, 1805~ 1865)가 비문을 지어 추적 신도비(秋適神道裨)를 건립하였다.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세운 주세붕(周世鵬)은 《무릉잡고(武陵雜稿)》에 노당 추적의 공적을 "해동에서 유교를 숭상하고 학교를 건립한 도(道)가 복초당 안선생 문성공 유와 노당 추선생 문헌공 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까지 누구라고 흠모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 고려와 조선의 유교가 안향과 추적 두 선생에서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