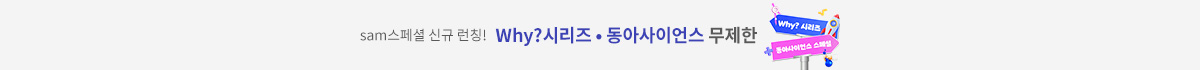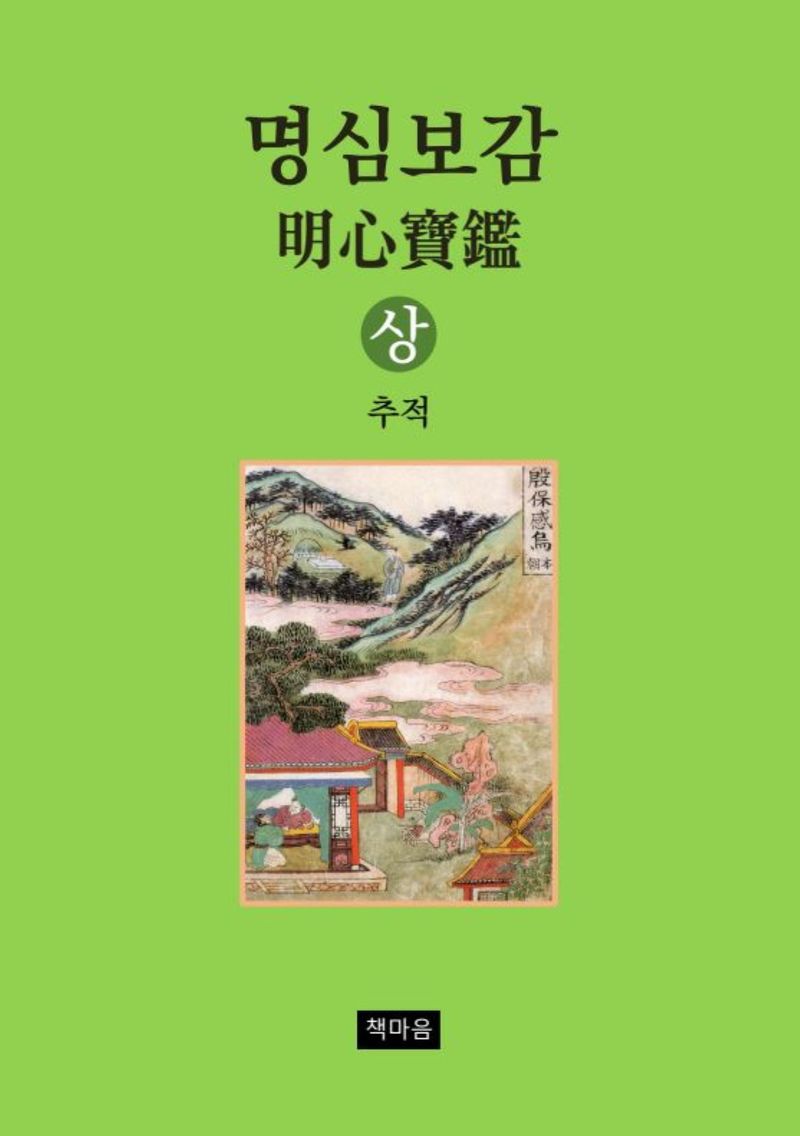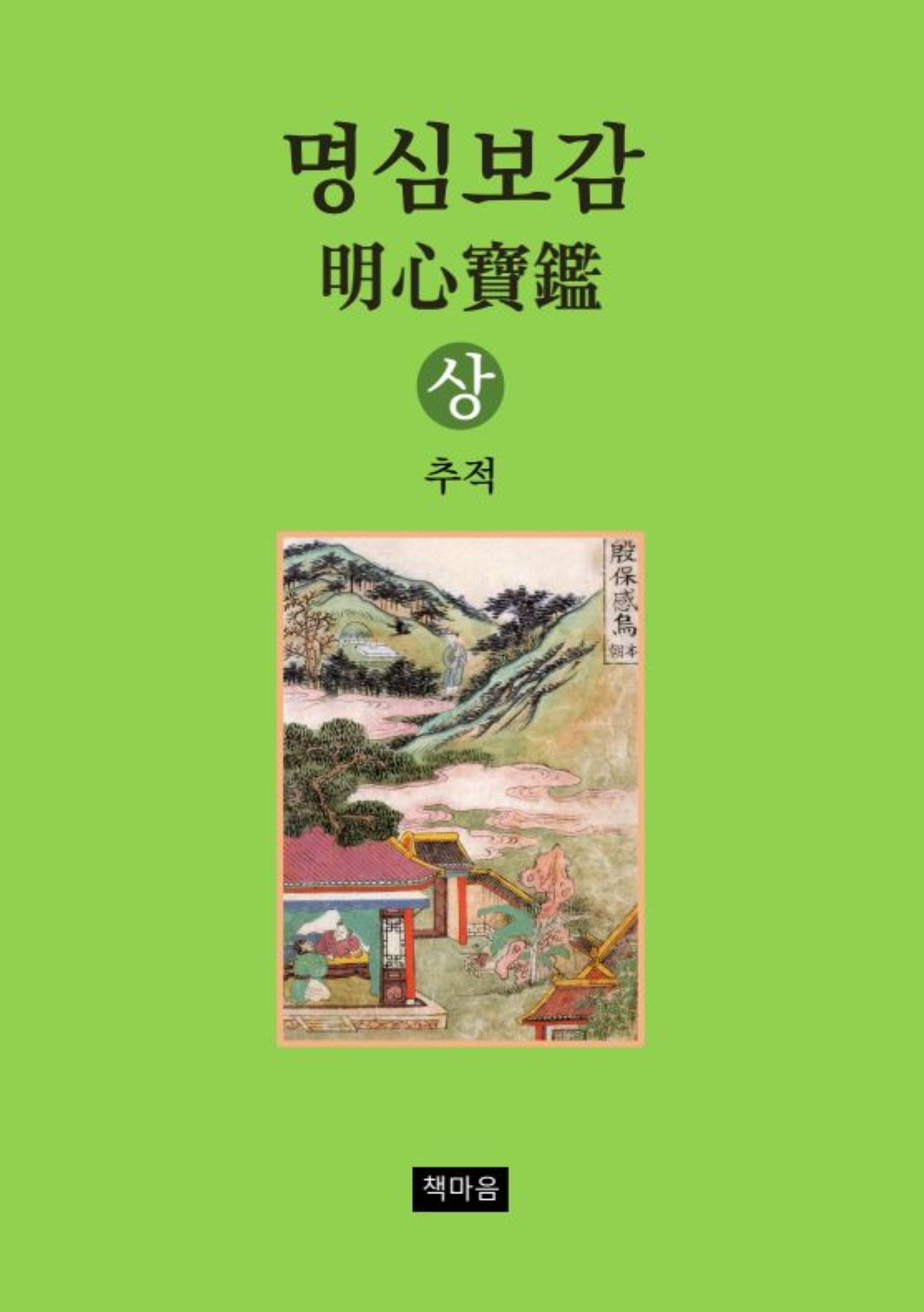명심보감 상
2025년 06월 28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ePUB (6.35MB) | 약 12.1만 자
- ISBN 9791191146561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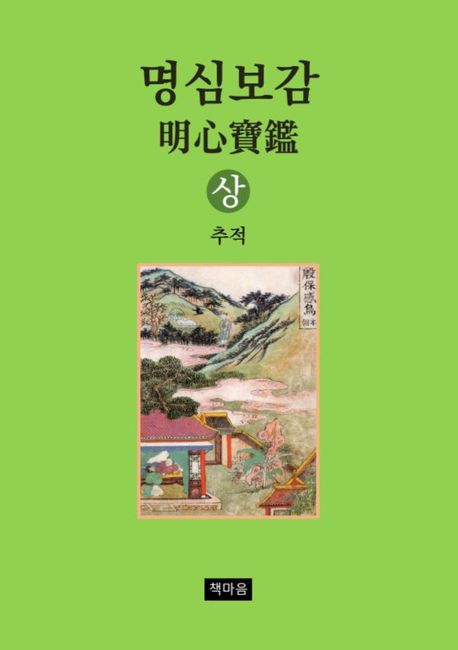
쿠폰적용가 7,200원
10% 할인 | 5%P 적립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개요
명심보감은 19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을 망라하여 편찬한 책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이다. 단순히 쉬운 문장들로 구성되어 한문 학습을 돕는 역할만 했다면 그 위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간결한 문장 안에 담긴 선인들의 보배로운 말과 글은 인격 수양을 돕고, 나아가 인생의 잠언으로 두고두고 숙독해 왔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현인들의 지혜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 전통적인 동양 사상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다.
어느 한 편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인간 본연의 착한 심성을 강조하며, 지족(知足)과 겸양의 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명언은 경세(經世)를 위한 수양서이자 제세에 필요한 교훈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역사
추적(秋適)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을 모아서, 19편으로 구성하고 편찬한 책이다.
중국으로 건너간 명심보감을 명나라 사람 범입본(范立本)이, 사서삼경을 비롯해 공자가어, 소학, 근사록, 성심잡언 등의 유교 경전과 유학자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여러 고전에서 금언(金言), 명구(名句)를 추려내, 추적(秋適)이 발췌하지 못한 고전 문구를 추가, 편집, 내용을 주제별로 엮어 보강한 증편 명심보감(일명: 청주본)을 편찬하였다. 상하 2권 20편이다.
그 후 조선시대 초기에 중국에서 한반도로 역수입된 것으로 보이며, 처음에는 중국 판본만 유통되다가 1454년(조선 단종 2년)에 민건(閔騫)의 후원으로 청주유학교수관 유득화(庾得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행하였다. 이는 청주본 발문에서 밝히는 내용이며 해당 판본에는 저자 범립본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로 자신을 수양하고 반성하고 양심을 기르는 인격 수양의 목적으로 가르쳤다.
임진왜란 이후로는 청주본이 1980년대에 재발견되기까지는 잊힌 것으로 보이며, 1637년에 원본 분량의 3분의 1만 담고 있는 초략본이 간행되어 원본을 대체하여 유통되었다. 이 정축본에는 제17편 존신편(存信篇)이 결락되어 총 19편으로 편성되었고 도교, 불교적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출판 의도나 저자가 명시된 서문, 발문 등의 기록이 없이 출판되었다. 그 후에도 1664년, 1844년, 1868년에 간행된 판본도 서문과 발문이 없이 간행되었다.
이와 같이 저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869년에 추씨 가문의 인흥서원에서 자신들의 선조인 예문관대제학을 지낸 추적이 명심보감을 편찬하였다고 써넣었다(인흥재사본).
명심보감은 국내에만도 수십 종에 이르는 판본이 전하고, 1305년에 편찬된 이래 각국에 널리 소개되었다.
당시 고려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일대의 국가에 널리 알려졌다. 1592년에는 베이징에 체류하던 스페인 선교사 코보가 명심보감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동양 문헌이 처음으로 서양어로 번역된 사례다. 이후 네덜란드어나 독일어로 번역되어 서구에까지 유포되었다.
현대에는 일부 학교에서 징계 목적으로 명심보감을 쓰게 하기도 한다.
현재 전하는 판본은 고종 6년(1869년) 추세문이 출판한 인흥재사본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2010년 건국대학교 중문과 교수인 임동석(林東錫)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 수십 종에 이르는 흩어진 판본들을 모아서 통합본 명심보감을 출판하였다.
구성
1. 계선(繼善) 계(繼)는 이어간다는 뜻이며 선(善)은 착함이니, 인생을 착하게 살아가라고 권유. 계선 편은 10장으로 구성
2. 천명(天命) 천명(天命)은 ‘하늘의 명령’이니, 하늘을 두려워하며 양심에 따라 살라고 권유. 천명 편은 7장으로 구성
3. 순명(順命) 명(命)은 곧 천명(天命)이니,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주어진 命을 받아들이라고 권유. 5장으로 구성
4. 효행(孝行)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네(詩經) 등, 부모님께 효도할 것과 이를 통해 자식에게 본보기가 됨을 강조. 6장으로 구성
5. 정기(正己)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할 것을 권유. 26장으로 구성
6. 안분(安分) 안(安)은 편안함이요 분(分)은 분수이니,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를 편안히 받아들이라고 권유. 7장으로 구성
7. 존심(存心)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 20장으로 구성
8. 계성(戒性) 성품을 경계하라(戒性).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 동안의 근심을 면하리라. 인내의 덕목을 강조. 9장으로 구성
9. 근학(勤學) 인간답기 위해서는 배움에 힘써야 함을 강조. 8장으로 구성
10. 훈자(訓子) 부모로서 제대로 자식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 10장으로 구성
11. 성심(省心) 분량이 매우 많아 상하로 나뉘어있다. 충효, 검소 등의 생활덕목부터 성리학, 도교 등 사상이 담긴 여러형태의 글로 구성. 상하 총 90장으로 구성
12. 입교(立敎)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두 올바른 가르침(원칙)을 세워야 함을 강조. 15장으로 구성
13. 치정(治政) 치(治)는 다스림이요, 정(政)은 부정(不正)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니, 관직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침. 8장으로 구성
14. 치가(治家) 집안을 잘 다스려라. 즉, 가정 윤리를 제시. 8장으로 구성
15. 안의(安義) 부자라서 친하지 않고, 가난뱅이라서 멀리하지 않는 이가 대장부(大丈夫)이니(소동파), 의리있게 사는 인간관계를 강조. 3장으로 구성
16. 준례(遵禮) 준(遵)은 따른다는 뜻이니, 인간이 따라야(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강조. 7장으로 구성
17. 존신(尊信) 청주본에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정축본과 인흥재사본에는 없다.
18. 언어(言語)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門)이다(君平). 말을 조심하라고 권유. 7장으로 구성
19. 교우(交友) 친구 사귀기의 중요성을 강조. 8장으로 구성
20. 부행(婦行)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이야기. 8장으로 구성
초략본에는 원본에 없는 증보편(增補篇), 팔반가(八反歌), 효행편(孝行篇), 염의편(廉義篇), 권학편(勸學篇)이 덧붙여져 있다.
明心寶鑑(명심보감) • 3
추적(秋適) • 8
1. 繼善篇(계선편)
01. 爲善者 天報之以福(위선자 천보지이복) 14 / 02. 勿以善小而不爲(물이선소이불위) 17 / 03. 一日不念善 諸惡 皆自起(일일불념선 제악 개자기) 19 / 04. 聞惡如聾(문악여롱) 20 / 05. 終身行善 善猶不足(종신행선 선유부족) 21 / 06.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불여적음덕어명명지중) 23 / 07. 路逢狹處 難回避(노봉협처 난회피) 25 / 08. 我旣於人 無惡 無惡哉(아기어인 무악 무악재) 27 / 09. 行惡之人 如磨刀之石(행악지인 여마도지석) 28 / 10. 見不善如探湯(견불선여탐탕) 30
2. 天命篇(천명편)
01. 逆天者 亡(역천자 망) 34 / 02. 天聽 都只在人心(천청 도지재인심) 36 / 03. 暗室欺心 神目 如電(암실기심 신목 여전) 38 / 04. 惡鑵 若滿 天必誅之(악관 약만 천필주지) 39 / 05. 人雖不害 天必戮之(인수불해 천필륙지) 40 / 06. 天網 踈而不漏(천망 소이불루) 42 / 07. 獲罪於天 無所禱也(획죄어천 무소도야) 44
3. 순명편(順命篇)
01. 死生 有命(사생 유명) 48 / 02. 萬事分已定(만사분이정) 50 / 03. 禍不可倖免(화불가행면) 51 / 04. 時來風送騰王閣(시래풍송등왕각) 52 / 05. 算來由命不由人(산래유명불유인) 54
4. 효행편(孝行篇)
01. 父兮生我 母兮鞠我(부혜생아 모혜국아) 58 / 02. 孝子之事親也(효자지사친야) 60 / 03. 父母在 不遠遊(부모재 불원유) 62 / 04. 父命召 唯而不諾(부명소 유이불락) 64 / 05. 孝於親 子亦孝之(효어친 자역효지) 66 / 06. 但看簷頭水(단간첨두수) 67
5. 正己篇(정기편)
01. 見人之善 而尋己之善(견인지선 이심기지선) 70 / 02. 無爲人所容(무위인소용) 72 / 03. 勿以貴己而賤人(물이귀기이천인) 74 / 04. 聞人之過失 口不可言也(문인지과실 구불가언야) 76 / 05. 聞人之善 又從而喜之(문인지선 우종이희지) 78 / 06. 道吾惡者 是吾師(도오악자 시오사) 81 / 07. 愼是護身之符(신시호신지부) 83 / 08. 無名 難(무명 난) 84 / 09. 君子有三戒(군자유삼계) 85 / 10. 勿使悲歡極(물사비환극) 87 / 11. 心淸夢寐安(심청몽매안) 89 / 12. 定心應物(정심응물) 90 / 13. 懲忿如救火(징분여구화) 91 / 14. 避色如避讐(피색여피수) 93 / 15. 無用之辯 棄而勿治(무용지변 기이물치) 94 / 16. 衆 惡之 必察焉(중 오지 필찰언) 96 / 17. 酒中不語 眞君子(주중불어 진군자) 98 / 18. 萬事從寬(만사종관) 99 / 19. 易地思之(역지사지) 100 / 20. 勤有功 戲無益(근유공 희무익) 103 / 21. 瓜田不納履(과전불납리) 104 / 22. 逸生於勞而常休(일생어로이상휴) 106 / 23. 耳不聞人之非(이불문인지비) 108 / 24. 言出於口 不可不愼(언출어구 불가불신) 109 / 25. 朽木 不可雕也(후목 불가조야) 111 / 26. 惟正可守 心不可欺(유정가수 심불가기) 114
6. 安分篇(안분편)
01. 知足可樂 務貪則憂(지족가락 무탐즉우) 120 / 02. 知足者 貧賤亦樂(지족자 빈천역락) 22 / 03. 濫想 徒傷神(남상 도상신) 123 / 04. 知止常止 終身無恥(지지상지 종신무치) 124 / 05. 滿招損 謙受益(만초손 겸수익) 126 / 06. 安分身無辱(안분신무욕) 128 / 07. 不在其位 不謀其政(부재기위 불모기정) 129
7. 存心篇(존심편)
01. 坐密室 如通衢(좌밀실 여통구) 132 / 02. 富貴 如將智力求(부귀 여장지력구) 133 / 03. 但常以責人之心 責己(단상이책인지심 책기) 135 / 04. 守之以讓(수지이양) 137 / 05. 薄施厚望者 不報(박시후망자 불보) 139 / 06. 施恩 勿求報(시은 물구보) 142 / 07. 膽欲大而心欲小(담욕대이심욕소) 143 / 08. 念念要如臨戰日(염념요여임전일) 144 / 09. 懼法朝朝樂(구법조조락) 145 / 10. 守口如甁(수구여병) 146 / 11. 心不負人 面無慙色(심불부인 면무참색) 148 / 12. 人無百歲人 枉作千年計(인무백세인 왕작천년계) 149 / 13. 六悔銘(육회명) 150 / 14. 寧無事而家貧(영무사이가빈) 153 / 15. 心安茅屋穩(심안모옥온) 154 / 16. 自恕者 不改過(자서자 불개과) 155 / 17. 夙興夜寐(숙흥야매) 157 / 18. 以愛妻子之心 事親(이애처자지심 사친) 159 / 19. 爾謀不臧 悔之何及(이모부장 회지하급) 161 / 20. 生事事生 省事事省(생사사생 생사사생) 162
8. 戒性篇(계성편)
01. 人性 如水(인성 여수) 164 / 02. 忍一時之忿 免百日之憂(인일시지분 면백일지우) 166 / 03. 得忍且忍(득인차인) 167 / 04. 是非無實相(시비무실상) 168 / 05. 百行之本 忍之爲上(백행지본 인지위상) 170 / 06. 不忍非人(불인비인) 172 / 07. 好勝者 必遇敵(호승자 필우적) 174 / 08. 仰天而唾(앙천이타) 176 / 09. 我若被人罵 佯聾不分說(아약피인매 양롱불분설) 178 / 10. 凡事 留人情(범사 유인정) 179
9. 勤學篇(근학편)
01. 博學而篤志(박학이독지) 182 / 02. 人之不學 如登天而無術(인지불학 여등천이무술) 185 / 03. 玉不琢 不成器(옥불탁 불성기) 186 / 04. 人生不學 冥冥如夜行(인생불학 명명여야행) 188 / 05. 人不通古今 馬牛而襟裾(인불통고금 마우이금거) 190 / 06. 學者 乃身之寶 乃世之珍(학자 내신지보 내세지진) 191 / 07. 不學者 悔之已老(불학자 회지이로) 193 / 08. 學如不及(학여불급) 195
10. 訓子篇(훈자편)
01. 賓客不來 門戶俗(빈객불래 문호속) 198 / 02. 子雖賢 不敎 不明(자수현 불교 불명) 199 / 03. 不如敎子一經(불여교자일경) 200 / 04. 至樂莫如讀書(지락막여독서) 202 / 05. 外無嚴師友 有成者 鮮矣(외무엄사우 유성자 선의) 203 / 06. 失敎 長必頑愚(실교 장필완우) 205 / 07. 男年長大 莫習樂酒(남년장대 막습락주) 206 / 08. 嚴父 出孝子(엄부 출효자) 207 / 09. 憎兒 多與食(증아 다여식) 208 / 10. 我愛子孫賢(아애자손현) 209
11. 省心篇 上(성심편 상)
01. 忠孝 享之無窮(충효 향지무궁) 212 / 02. 家和貧也好(가화빈야호) 213 / 03. 夫無煩惱是妻賢(부무번뇌시처현) 214 / 04. 旣取非常樂 須防不測憂(기취비상락 수방불측우) 215 / 05. 居安慮危(거안려위) 216 / 06. 榮輕辱淺 利重害深(영경욕천 이중해심) 217 / 07. 甚藏必甚亡(심장필심망) 218 / 08. 不觀巨海 何以知風波(불관거해 하이지풍파) 220 / 09. 欲知未來 先察已然(욕지미래 선찰이연) 222 / 10. 往者 所以知今(왕자 소이지금) 223 / 11. 未來事 暗似漆(미래사 암사칠) 225 / 12. 明朝之事 薄暮 不可必(명조지사 박모 불가필) 226 / 13. 人有朝夕禍福(인유조석화복) 228 / 14. 難保百年身(난보백년신) 229 / 15. 人有所養 可不養哉(인유소양 가불양재) 230 / 16. 吳越同舟(오월동주) 232 / 17. 用人勿疑(용인물의) 234 / 18. 咫尺人心不可料(지척인심불가료) 235 / 19. 知人知面不知心(지인지면부지심) 237 / 20. 對面共話 心隔千山(대면공화 심격천산) 238 / 21. 人死不知心(인사부지심) 239 / 22. 凡人 不可逆相(범인 불가역상) 240 / 23. 結怨於人 謂之種禍(결원어인 위지종화) 242 / 24. 若聽一面說 便見相離別(약청일면설 변견상이별) 243 / 25. 飽煖 思淫慾(포난 사음욕) 244 / 26. 多財則損其志(다재즉손기지) 245 / 27. 人貧智短(인빈지단) 246 / 28. 不經一事 不長一智(불경일사 부장일지) 247 / 29. 是非終日有 不聽自然無(시비종일유 불청자연무) 248 / 30. 來說是非者 便是是非人(내설시비자 변시시비인) 249 / 31. 不作皺眉事 應無切齒人(부작추미사 응무절치인) 250 / 32. 有麝自然香(유사자연향) 252 / 33. 有福莫享盡(유복막향진) 254 / 34. 四留銘(사류명) 255 / 35. 得人一語 勝千金(득인일어 승천금) 257 / 36. 苦者 樂之母(고자 낙지모) 258 / 37. 小船 難堪重載(소선 난감중재) 259 / 38. 安樂 値錢多(안락 치전다) 260 / 39. 出外 方知少主人(출외 방지소주인) 261 / 40. 貧居鬧市無相識(빈거뇨시무상식) 262 / 41. 世情 便向有錢家(세정 변향유전가) 263 / 42. 難塞鼻下橫(난색비하횡) 264 / 43. 人情 皆爲窘中疎(인정 개위군중소) 265 / 44. 酒有成敗而不可泛飮之(주유성패이불가범음지) 266 / 45. 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치악의악식자 미족여의) 267 / 46. 士有妬友則賢交不親(사유투우즉현교불친) 269 / 47. 天不生無祿之人(천불생무록지인) 270 / 48. 小富 由勤(소부 유근) 271 / 49. 成家之兒 惜糞如金(성가지아 석분여금) 272 / 50. 不若病前能自防(불약병전능자방) 273 / 51. 天地自然皆有報(천지자연개유보) 275 / 52. 天意於人 無厚薄(천의어인 무후박) 277 / 53. 若將狡譎爲生計(약장교휼위생계) 279 / 54. 有錢難買子孫賢(유전난매자손현) 281 | 55. 一日淸閑 一日仙(일일청한 일일선) 282
明心寶鑑
(명심보감)
상
책마음
365일 독자와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지혜와 풍요로운 삶의 지수를 높이는 책마음이 되겠습니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상)
발행 2025년 6월 28일
지은이 | 추적
옮긴이 | 우리고전연구회
펴낸이 | 김지숙
펴낸곳 | 도서출판 책마음
등록번호 | 제 2012-000047호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가산동 롯데 IT캐슬) B218호
전화 | 02-868-3018
팩스 | 02-868-3019
메일 | bookakdma@naver.com
I S B N | 세트 979-11-91146-55-4(05140)
상권 979-11-91146-56-1(05140)
값 세트 16,000원 각 권 8,000원
명심보감(明心寶鑑)
명심보감(明心寶鑑)은 고려 시대 충렬왕 때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낸 추적(秋適)이 1305년에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언(金言), 명구(名句)를 엮어서 저작했다. 후에 명나라 사람 범입본(范立本)이 추적(秋適)의 명심보감을 입수하여 증편하기도 했다.
개요
명심보감은 19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을 망라하여 편찬한 책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이다. 단순히 쉬운 문장들로 구성되어 한문 학습을 돕는 역할만 했다면 그 위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간결한 문장 안에 담긴 선인들의 보배로운 말과 글은 인격 수양을 돕고, 나아가 인생의 잠언으로 두고두고 숙독해 왔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현인들의 지혜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 전통적인 동양 사상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다.
어느 한 편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인간 본연의 착한 심성을 강조하며, 지족(知足)과 겸양의 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명언은 경세(經世)를 위한 수양서이자 제세에 필요한 교훈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역사
추적(秋適)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을 모아서, 19편으로 구성하고 편찬한 책이다.
중국으로 건너간 명심보감을 명나라 사람 범입본(范立本)이, 사서삼경을 비롯해 공자가어, 소학, 근사록, 성심잡언 등의 유교 경전과 유학자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여러 고전에서 금언(金言), 명구(名句)를 추려내, 추적(秋適)이 발췌하지 못한 고전 문구를 추가, 편집, 내용을 주제별로 엮어 보강한 증편 명심보감(일명: 청주본)을 편찬하였다. 상하 2권 20편이다.
그 후 조선시대 초기에 중국에서 한반도로 역수입된 것으로 보이며, 처음에는 중국 판본만 유통되다가 1454년(조선 단종 2년)에 민건(閔騫)의 후원으로 청주유학교수관 유득화(庾得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행하였다. 이는 청주본 발문에서 밝히는 내용이며 해당 판본에는 저자 범립본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로 자신을 수양하고 반성하고 양심을 기르는 인격 수양의 목적으로 가르쳤다.
임진왜란 이후로는 청주본이 1980년대에 재발견되기까지는 잊힌 것으로 보이며, 1637년에 원본 분량의 3분의 1만 담고 있는 초략본이 간행되어 원본을 대체하여 유통되었다. 이 정축본에는 제17편 존신편(存信篇)이 결락되어 총 19편으로 편성되었고 도교, 불교적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출판 의도나 저자가 명시된 서문, 발문 등의 기록이 없이 출판되었다. 그 후에도 1664년, 1844년, 1868년에 간행된 판본도 서문과 발문이 없이 간행되었다.
이와 같이 저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869년에 추씨 가문의 인흥서원에서 자신들의 선조인 예문관대제학을 지낸 추적이 명심보감을 편찬하였다고 써넣었다(인흥재사본).
명심보감은 국내에만도 수십 종에 이르는 판본이 전하고, 1305년에 편찬된 이래 각국에 널리 소개되었다.
당시 고려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일대의 국가에 널리 알려졌다. 1592년에는 베이징에 체류하던 스페인 선교사 코보가 명심보감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동양 문헌이 처음으로 서양어로 번역된 사례다. 이후 네덜란드어나 독일어로 번역되어 서구에까지 유포되었다.
현대에는 일부 학교에서 징계 목적으로 명심보감을 쓰게 하기도 한다.
현재 전하는 판본은 고종 6년(1869년) 추세문이 출판한 인흥재사본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2010년 건국대학교 중문과 교수인 임동석(林東錫)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 수십 종에 이르는 흩어진 판본들을 모아서 통합본 명심보감을 출판하였다.
구성
1. 계선(繼善) 계(繼)는 이어간다는 뜻이며 선(善)은 착함이니, 인생을 착하게 살아가라고 권유. 계선 편은 10장으로 구성
2. 천명(天命) 천명(天命)은 ‘하늘의 명령’이니, 하늘을 두려워하며 양심에 따라 살라고 권유. 천명 편은 7장으로 구성
3. 순명(順命) 명(命)은 곧 천명(天命)이니,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주어진 命을 받아들이라고 권유. 5장으로 구성
4. 효행(孝行)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네(詩經) 등, 부모님께 효도할 것과 이를 통해 자식에게 본보기가 됨을 강조. 6장으로 구성
5. 정기(正己)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할 것을 권유. 26장으로 구성
6. 안분(安分) 안(安)은 편안함이요 분(分)은 분수이니,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를 편안히 받아들이라고 권유. 7장으로 구성
7. 존심(存心)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 20장으로 구성
8. 계성(戒性) 성품을 경계하라(戒性).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 동안의 근심을 면하리라. 인내의 덕목을 강조. 9장으로 구성
9. 근학(勤學) 인간답기 위해서는 배움에 힘써야 함을 강조. 8장으로 구성
10. 훈자(訓子) 부모로서 제대로 자식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 10장으로 구성
11. 성심(省心) 분량이 매우 많아 상하로 나뉘어있다. 충효, 검소 등의 생활덕목부터 성리학, 도교 등 사상이 담긴 여러형태의 글로 구성. 상하 총 90장으로 구성
12. 입교(立敎)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두 올바른 가르침(원칙)을 세워야 함을 강조. 15장으로 구성
13. 치정(治政) 치(治)는 다스림이요, 정(政)은 부정(不正)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니, 관직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침. 8장으로 구성
14. 치가(治家) 집안을 잘 다스려라. 즉, 가정 윤리를 제시. 8장으로 구성
15. 안의(安義) 부자라서 친하지 않고, 가난뱅이라서 멀리하지 않는 이가 대장부(大丈夫)이니(소동파), 의리있게 사는 인간관계를 강조. 3장으로 구성
16. 준례(遵禮) 준(遵)은 따른다는 뜻이니, 인간이 따라야(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강조. 7장으로 구성
17. 존신(尊信) 청주본에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정축본과 인흥재사본에는 없다.
18. 언어(言語)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門)이다(君平). 말을 조심하라고 권유. 7장으로 구성
19. 교우(交友) 친구 사귀기의 중요성을 강조. 8장으로 구성
20. 부행(婦行)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이야기. 8장으로 구성
초략본에는 원본에 없는 증보편(增補篇), 팔반가(八反歌), 효행편(孝行篇), 염의편(廉義篇), 권학편(勸學篇)이 덧붙여져 있다.
편명과 조항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주본
(1454)
정축본
(1637)
인흥재사본
(1869)
계선(繼善)
47
11
11
천명(天命)
19
7
7
순명(順命)
16
5
5
효행(孝行)
19
5
5
정기(正己)
117
26
26
안분(安分)
18
5
6
존심(存心)
82
20
21
계성(戒性)
15
9
11
근학(勤學)
22
8
8
훈자(訓子)
17
9
9
성심(省心)
256
85
91
입교(立敎)
17
10
10
치정(治政)
22
8
8
치가(治家)
16
8
8
안의(安義)
5
3
3
준례(遵禮)
21
7
7
존신(存信)
7
0
0
언어(言語)
25
7
7
교우(交友)
24
8
8
부행(婦行)
9
5
5
추적(秋適)
출생 1246년 고려 양광도 양지현(現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사망 1317년(향년 72세) 고려 개경
본관 추계(秋溪)
별칭 자(字) 관중(慣中), 호(號) 노당(露堂), 시호(諡號) 문헌(文憲)
경력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추적(秋適, 1246년 ∼ 1317년)은 고려의 문신이다. 본관은 추계(秋溪). 자는 관중(慣中), 호는 노당(露堂)이다. 충렬왕 때,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역임하였다. 시랑(侍郞) 겸 국학 교수(國學敎授)로 재임할 때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집필하였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인흥서원(仁興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다.
노당(露堂) 추적(秋適)은 1246년(고려 고종 33년) 양광도에서 태어났다.
추적의 아버지인 추영수(秋永壽)는 1209년(고려 희종 5년) 국자시에 장원급제하여 문하시중을 역임하였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추적(秋適)은 성품이 활달하여 얽매임이 없었다고 한다.
1260년(고려 원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안동서기(安東書記), 직사관(直史館)을 거쳐 좌사간(左司諫)에 올랐다.
1298년(충렬왕 24) 환관 황석량(黃石良)이 권세를 이용하여, 황석량의 고향인 합덕부곡(合德部曲 : 현재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을 현(縣)으로 승격시키려고 할 때, 추적이 문안에 서명을 거부하자, 황석량은 내수(內竪) 석천보(石天補), 김광연(金光衍)과 함께 기회를 노려 추적을 참소하니, 왕이 형구를 채워 순마소(巡馬所)에 수감하게 했다. 압송하는 사람이 추적더러, 원한다면 골목길로 갈 수도 있다고 후의를 보였으나 추적은 거절했다. “죄를 저지른 자를 모두 해당 관청으로 보낼 때 대궐에서 형구를 채운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으니 내가 큰 거리를 지나면서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 간관(諫官)으로서 형구를 차는 것 또한 영광이니, 어찌 아녀자가 거리에서 얼굴 가리는 것처럼 행동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추적은 곧 복권되어 1299년 시랑으로 북계 용주(龍州)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1302년(충렬왕 28년) 찬성사(贊成事) 안향(安珦)에 의하여 시랑(侍郞) 겸 국학 교수(國學敎授)로 발탁되어 이성(李晟), 최원충(崔元冲) 등과 함께 7품 이하의 관리 혹은 생원들에 대한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안향(安珦)과 더불어 정주학(程朱學)의 도입을 꾀하였다. 1305년 시랑 국학교수로서 교양서인 《명심보감(明心寶鑑)》을 편찬하였다.
1306년(충렬왕 32년) 민부상서(民部尙書)를 역임하고,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이르렀다.
추적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다.
조선 순조 35년(1825) 10월 팔도 유림(儒林)과 추적의 20대손인 추세문(秋世文)이 뜻을 모아 창건한 대구의 인흥서원(仁興書院)에 배향되었다. 조선 고종 1년(1864년) 홍문관제학을 역임한 조선의 문신 해장 신석우(申錫愚, 1805~ 1865)가 비문을 지어 추적 신도비(秋適神道裨)를 건립하였다.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세운 주세붕(周世鵬)은 《무릉잡고(武陵雜稿)》에 노당 추적의 공적을 "해동에서 유교를 숭상하고 학교를 건립한 도(道)가 복초당 안선생 문성공 유와 노당 추선생 문헌공 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까지 누구라고 흠모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 고려와 조선의 유교가 안향과 추적 두 선생에서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다.
차 례
明心寶鑑(명심보감) • 3
추적(秋適) • 8
1. 繼善篇(계선편)
01. 爲善者 天報之以福(위선자 천보지이복) 14 / 02. 勿以善小而不爲(물이선소이불위) 17 / 03. 一日不念善 諸惡 皆自起(일일불념선 제악 개자기) 19 / 04. 聞惡如聾(문악여롱) 20 / 05. 終身行善 善猶不足(종신행선 선유부족) 21 / 06.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불여적음덕어명명지중) 23 / 07. 路逢狹處 難回避(노봉협처 난회피) 25 / 08. 我旣於人 無惡 無惡哉(아기어인 무악 무악재) 27 / 09. 行惡之人 如磨刀之石(행악지인 여마도지석) 28 / 10. 見不善如探湯(견불선여탐탕) 30
2. 天命篇(천명편)
01. 逆天者 亡(역천자 망) 34 / 02. 天聽 都只在人心(천청 도지재인심) 36 / 03. 暗室欺心 神目 如電(암실기심 신목 여전) 38 / 04. 惡鑵 若滿 天必誅之(악관 약만 천필주지) 39 / 05. 人雖不害 天必戮之(인수불해 천필륙지) 40 / 06. 天網 踈而不漏(천망 소이불루) 42 / 07. 獲罪於天 無所禱也(획죄어천 무소도야) 44
3. 순명편(順命篇)
01. 死生 有命(사생 유명) 48 / 02. 萬事分已定(만사분이정) 50 / 03. 禍不可倖免(화불가행면) 51 / 04. 時來風送騰王閣(시래풍송등왕각) 52 / 05. 算來由命不由人(산래유명불유인) 54
4. 효행편(孝行篇)
01. 父兮生我 母兮鞠我(부혜생아 모혜국아) 58 / 02. 孝子之事親也(효자지사친야) 60 / 03. 父母在 不遠遊(부모재 불원유) 62 / 04. 父命召 唯而不諾(부명소 유이불락) 64 / 05. 孝於親 子亦孝之(효어친 자역효지) 66 / 06. 但看簷頭水(단간첨두수) 67
5. 正己篇(정기편)
01. 見人之善 而尋己之善(견인지선 이심기지선) 70 / 02. 無爲人所容(무위인소용) 72 / 03. 勿以貴己而賤人(물이귀기이천인) 74 / 04. 聞人之過失 口不可言也(문인지과실 구불가언야) 76 / 05. 聞人之善 又從而喜之(문인지선 우종이희지) 78 / 06. 道吾惡者 是吾師(도오악자 시오사) 81 / 07. 愼是護身之符(신시호신지부) 83 / 08. 無名 難(무명 난) 84 / 09. 君子有三戒(군자유삼계) 85 / 10. 勿使悲歡極(물사비환극) 87 / 11. 心淸夢寐安(심청몽매안) 89 / 12. 定心應物(정심응물) 90 / 13. 懲忿如救火(징분여구화) 91 / 14. 避色如避讐(피색여피수) 93 / 15. 無用之辯 棄而勿治(무용지변 기이물치) 94 / 16. 衆 惡之 必察焉(중 오지 필찰언) 96 / 17. 酒中不語 眞君子(주중불어 진군자) 98 / 18. 萬事從寬(만사종관) 99 / 19. 易地思之(역지사지) 100 / 20. 勤有功 戲無益(근유공 희무익) 103 / 21. 瓜田不納履(과전불납리) 104 / 22. 逸生於勞而常休(일생어로이상휴) 106 / 23. 耳不聞人之非(이불문인지비) 108 / 24. 言出於口 不可不愼(언출어구 불가불신) 109 / 25. 朽木 不可雕也(후목 불가조야) 111 / 26. 惟正可守 心不可欺(유정가수 심불가기) 114
6. 安分篇(안분편)
01. 知足可樂 務貪則憂(지족가락 무탐즉우) 120 / 02. 知足者 貧賤亦樂(지족자 빈천역락) 22 / 03. 濫想 徒傷神(남상 도상신) 123 / 04. 知止常止 終身無恥(지지상지 종신무치) 124 / 05. 滿招損 謙受益(만초손 겸수익) 126 / 06. 安分身無辱(안분신무욕) 128 / 07. 不在其位 不謀其政(부재기위 불모기정) 129
7. 存心篇(존심편)
01. 坐密室 如通衢(좌밀실 여통구) 132 / 02. 富貴 如將智力求(부귀 여장지력구) 133 / 03. 但常以責人之心 責己(단상이책인지심 책기) 135 / 04. 守之以讓(수지이양) 137 / 05. 薄施厚望者 不報(박시후망자 불보) 139 / 06. 施恩 勿求報(시은 물구보) 142 / 07. 膽欲大而心欲小(담욕대이심욕소) 143 / 08. 念念要如臨戰日(염념요여임전일) 144 / 09. 懼法朝朝樂(구법조조락) 145 / 10. 守口如甁(수구여병) 146 / 11. 心不負人 面無慙色(심불부인 면무참색) 148 / 12. 人無百歲人 枉作千年計(인무백세인 왕작천년계) 149 / 13. 六悔銘(육회명) 150 / 14. 寧無事而家貧(영무사이가빈) 153 / 15. 心安茅屋穩(심안모옥온) 154 / 16. 自恕者 不改過(자서자 불개과) 155 / 17. 夙興夜寐(숙흥야매) 157 / 18. 以愛妻子之心 事親(이애처자지심 사친) 159 / 19. 爾謀不臧 悔之何及(이모부장 회지하급) 161 / 20. 生事事生 省事事省(생사사생 생사사생) 162
8. 戒性篇(계성편)
01. 人性 如水(인성 여수) 164 / 02. 忍一時之忿 免百日之憂(인일시지분 면백일지우) 166 / 03. 得忍且忍(득인차인) 167 / 04. 是非無實相(시비무실상) 168 / 05. 百行之本 忍之爲上(백행지본 인지위상) 170 / 06. 不忍非人(불인비인) 172 / 07. 好勝者 必遇敵(호승자 필우적) 174 / 08. 仰天而唾(앙천이타) 176 / 09. 我若被人罵 佯聾不分說(아약피인매 양롱불분설) 178 / 10. 凡事 留人情(범사 유인정) 179
9. 勤學篇(근학편)
01. 博學而篤志(박학이독지) 182 / 02. 人之不學 如登天而無術(인지불학 여등천이무술) 185 / 03. 玉不琢 不成器(옥불탁 불성기) 186 / 04. 人生不學 冥冥如夜行(인생불학 명명여야행) 188 / 05. 人不通古今 馬牛而襟裾(인불통고금 마우이금거) 190 / 06. 學者 乃身之寶 乃世之珍(학자 내신지보 내세지진) 191 / 07. 不學者 悔之已老(불학자 회지이로) 193 / 08. 學如不及(학여불급) 195
10. 訓子篇(훈자편)
01. 賓客不來 門戶俗(빈객불래 문호속) 198 / 02. 子雖賢 不敎 不明(자수현 불교 불명) 199 / 03. 不如敎子一經(불여교자일경) 200 / 04. 至樂莫如讀書(지락막여독서) 202 / 05. 外無嚴師友 有成者 鮮矣(외무엄사우 유성자 선의) 203 / 06. 失敎 長必頑愚(실교 장필완우) 205 / 07. 男年長大 莫習樂酒(남년장대 막습락주) 206 / 08. 嚴父 出孝子(엄부 출효자) 207 / 09. 憎兒 多與食(증아 다여식) 208 / 10. 我愛子孫賢(아애자손현) 209
11. 省心篇 上(성심편 상)
01. 忠孝 享之無窮(충효 향지무궁) 212 / 02. 家和貧也好(가화빈야호) 213 / 03. 夫無煩惱是妻賢(부무번뇌시처현) 214 / 04. 旣取非常樂 須防不測憂(기취비상락 수방불측우) 215 / 05. 居安慮危(거안려위) 216 / 06. 榮輕辱淺 利重害深(영경욕천 이중해심) 217 / 07. 甚藏必甚亡(심장필심망) 218 / 08. 不觀巨海 何以知風波(불관거해 하이지풍파) 220 / 09. 欲知未來 先察已然(욕지미래 선찰이연) 222 / 10. 往者 所以知今(왕자 소이지금) 223 / 11. 未來事 暗似漆(미래사 암사칠) 225 / 12. 明朝之事 薄暮 不可必(명조지사 박모 불가필) 226 / 13. 人有朝夕禍福(인유조석화복) 228 / 14. 難保百年身(난보백년신) 229 / 15. 人有所養 可不養哉(인유소양 가불양재) 230 / 16. 吳越同舟(오월동주) 232 / 17. 用人勿疑(용인물의) 234 / 18. 咫尺人心不可料(지척인심불가료) 235 / 19. 知人知面不知心(지인지면부지심) 237 / 20. 對面共話 心隔千山(대면공화 심격천산) 238 / 21. 人死不知心(인사부지심) 239 / 22. 凡人 不可逆相(범인 불가역상) 240 / 23. 結怨於人 謂之種禍(결원어인 위지종화) 242 / 24. 若聽一面說 便見相離別(약청일면설 변견상이별) 243 / 25. 飽煖 思淫慾(포난 사음욕) 244 / 26. 多財則損其志(다재즉손기지) 245 / 27. 人貧智短(인빈지단) 246 / 28. 不經一事 不長一智(불경일사 부장일지) 247 / 29. 是非終日有 不聽自然無(시비종일유 불청자연무) 248 / 30. 來說是非者 便是是非人(내설시비자 변시시비인) 249 / 31. 不作皺眉事 應無切齒人(부작추미사 응무절치인) 250 / 32. 有麝自然香(유사자연향) 252 / 33. 有福莫享盡(유복막향진) 254 / 34. 四留銘(사류명) 255 / 35. 得人一語 勝千金(득인일어 승천금) 257 / 36. 苦者 樂之母(고자 낙지모) 258 / 37. 小船 難堪重載(소선 난감중재) 259 / 38. 安樂 値錢多(안락 치전다) 260 / 39. 出外 方知少主人(출외 방지소주인) 261 / 40. 貧居鬧市無相識(빈거뇨시무상식) 262 / 41. 世情 便向有錢家(세정 변향유전가) 263 / 42. 難塞鼻下橫(난색비하횡) 264 / 43. 人情 皆爲窘中疎(인정 개위군중소) 265 / 44. 酒有成敗而不可泛飮之(주유성패이불가범음지) 266 / 45. 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치악의악식자 미족여의) 267 / 46. 士有妬友則賢交不親(사유투우즉현교불친) 269 / 47. 天不生無祿之人(천불생무록지인) 270 / 48. 小富 由勤(소부 유근) 271 / 49. 成家之兒 惜糞如金(성가지아 석분여금) 272 / 50. 不若病前能自防(불약병전능자방) 273 / 51. 天地自然皆有報(천지자연개유보) 275 / 52. 天意於人 無厚薄(천의어인 무후박) 277 / 53. 若將狡譎爲生計(약장교휼위생계) 279 / 54. 有錢難買子孫賢(유전난매자손현) 281 | 55. 一日淸閑 一日仙(일일청한 일일선) 282
1. 繼善篇(계선편)
계선(繼善) 계(繼)는 이어간다는 뜻이며 선(善)은 착함이니, 인생을 착하게 살아갈 것을 권유하는 것이며,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 존재로서의 하늘은 지극히 순(純)하여 결점(缺點)이 없는 인격체와 같은 존엄한 존재로 인식되어 인간 삶 기준의 근거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 지고지순(至高至純)한 근원으로서 하늘은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사람에게 윤리적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가치의 차원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룩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天人合一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편은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늘이(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선한 본연(本然)의 선(善)한 마음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01. 爲善者 天報之以福(위선자 천보지이복)
모든 선악에는 하늘의 응답이 있다
爲善者天報之以福
子曰(자 子(자) : 부자(夫子)의 줄임말로 스승을 높일 때 쓰인다. 여기서는 공자(B.C.551~B.C.479)를 높여 부른 것이다. ‘子’를 접미사로 써서 활용해 온 예를 든다면 공자는 물론이고, 老子 莊子 程子 朱子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접미어로 써서 존칭하는 것이 부족하였던지, 子程子의 경우처럼 姓의 앞에도 붙여 존칭의 의미를 더하는 예도 있다. 이처럼 ‘子’는 姓에 붙여 높임말을 만드는 접미어인데, 요즈음 동양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배의 姓에 ‘子’를 붙여 호칭하는 재미있는 일도 있다. 여기서 孔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그는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구(丘), 자(字)는 仲尼(중니)이다. 아버지 叔梁紇(숙량흘)과 어머니 顔徵在(안징재)의 슬하에서 周나라 靈王(영왕) 21년(B.C.551)에 태어났다. 노나라에 벼슬하여 司空이 되고, 뒤에 대사구(大司寇)에 올라 정치를 잘했으나, 나중에는 소외되어 노나라를 떠나 13년 동안 70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의 이상을 펴 보려고 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68세 때 노나라로 돌아와 詩書를 바로잡고 禮樂을 정하고 《春秋》를 짓는 한편, 후진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가 3천여 명에 이르렀고 六藝(禮 樂 射 御 書 數)에 정통한 제자만도 72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는 仁을 인간의 최고 이상으로 삼고, 그 바탕을 孝悌와 忠恕에 두었다. 敬王 41년(B.C.479)에 7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唐나라 때 文宣王(문선왕)이라 추시(追諡)하고, 宋나라 때 至聖文宣王, 元나라 때는 大成至聖文宣王이라 하고, 明나라 때 다시 至聖先師라 고쳤다. 淸나라 順治 2년(1645년)에 비로소 文廟를 세우고 시호를 大成至聖文宣先師孔子라 했다가, 동 14년에 또다시 至聖先師孔子로 고쳤다. 제자들이 그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 《論語》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成均館 大成殿을 비롯하여 각지의 鄕校에서 그를 祭享해 왔다.
왈)
爲善者(위선자 ~者(자) : ① ‘~하는 것’, ‘~하는 사람’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하면’의 의미의 條件節로 보면 문장 해석이 매끄럽게 된다. 따라서 원문을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그에게〉 복으로 갚아주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면 하늘이 〈그에게〉 재앙으로 갚는다.’로 번역해도 무방하다.
)는 天報之以福(천보지이복)하고
爲不善者(위불선자)는 天報之以禍(천보지이화)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는다.”
[해설]
여기에 하늘이 은연중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재앙과 복을 내린다는 陰騭(음즐) 思想이 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그에게 복을 내리고, 악한 일을 하면 하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백성을 안정시킨다는 독특한 동양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음즐 사상은 《書經》〈洪範 一章〉에 ‘天陰騭下民(천음즐하민)’이라 한 말에서 비롯한다. 騭(즐)은 ‘수말’, ‘오르다’, ‘정하다’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정하다’의 의미여서, 음즐은 곧 ‘하늘이 몰래 下民을 定한다’는 것이다. 곧 백성이 안정되도록 하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호하고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출전]
1) 《孔子家語(공자가어)》〈20. 在厄 第二十)〉에 보인다. 孔子家語 <공자가어> 第五卷 20편 재액(在厄) 중에서 공자 일행이 진나라와 채나라의 국경 사이에서 곤경을 치를 때를 기록한 것으로, 자로와 공자의 대화이다.
乃召子路而問焉(내소자로이문언) 曰(왈) 詩云(시운) 匪兕匪虎(비시비호) 率彼曠野(솔피광야) 吾道非乎(오도비호) 奚為至於此(해위지우차) 子路慍(자로온) 作色而對曰(작색이대왈) 君子無所困(군자무소곤) 意者夫子未仁與(의자부자미인여) 人之弗吾信也(인지불오신야) 意者夫子未智與(의자부자미지여) 人之弗吾行也(인지불오행야) 由也(차유야) 昔者聞諸夫子(석자문제부자) 為善者(위선자) 天報之以福(천보지이복) 為不善者(위불선자) 天報之以禍(천보지이화) 今夫子積德懷義(금부자적덕회의) 行之久矣(행지구의) 奚居之窮也(해거지궁야) 子曰(자왈) 由未之識也(유미지식야) 吾語汝(오어여) 汝以仁者為必信也(여이인자위필신야) 則伯夷(즉백이) 叔齊不餓死首陽(숙제불아사수양) 汝以智者為必用也(여이지자위필용야) 則王子比干不見剖心(즉왕자비간불견부심) 汝以忠者為必報也(여이충자위필보야) 則關龍逢不見刑(즉관룡봉불견형) 汝以諫者為必聽也(여이간자위필청야) 則伍子胥不見殺(즉오자서불견살)
(공자가) 이에 자로를 불러 물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詩)>에 이르기를, ‘들소도 아니고 범도 아니면서, 저 먼 들판을 쫓아다니네’라고 하였는데, 나의 도가 그릇된 것인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자로는 성을 내면서, 얼굴색을 짓더니 이렇게 대꾸하였다.
“군자는 곤궁한 일이 없다고 하시더니, 생각해 보건대, 선생님께서 아직 인(仁)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인가요? 남들이 우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건대, 선생님께서는 아직 지(智)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인가요? 남들이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면, 더구나 제가 옛날 선생님께 듣기를,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보상해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아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덕을 쌓으시고 의를 품으신 채, 실천하신 지 오래되었는데, 어찌 이런 곤궁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由)야! 아직 모르는 것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말해 주리라. 네 말대로 어진 자라고 하여 반드시 남이 믿어 준다면,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수양산(首陽山)에서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며, 네 말대로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반드시 남에게 쓰인다면, 왕자 비간(比干)이 심장이 갈라지는 화를 입지 않았을 것이며, 네 말대로 충성스럽다고 해서 반드시 보답이 있다고 한다면, 관룡봉(關龍逢)이 형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네 말대로 간언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임금이 들어 준다고 한다면, 오자서(伍子胥)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2) 《書經(서경)》〈商書(상서) 伊訓(이훈)〉에 다음의 글이 보인다. ‘惟上帝는 不常하사 作善이어든 降之百祥하시고 作不善이어든 降之百殃하시나니라. 하느님의 뜻은 일정하지 아니하여 선을 행하면 그에게 온갖 상서로운 일을 내리고 不善을 행하면 온갖 재앙을 내린다.’
※ 莊子(장자) 雜篇(잡편) 제29편 盜跖(도척) 10. 본성에 어긋나면 재앙을 자초한다 참고.
02. 勿以善小而不爲(물이선소이불위)
선(善)은 작을수록 아름답다
勿以善小而不爲
漢昭烈(한소열 漢(한) : 고대 중국의 나라 이름으로 前漢(西漢)과 後漢(東漢)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魏 蜀 吳로 분열된 삼국시대의 촉한(蜀漢)을 가리킨다. 昭烈(소열) : 촉한의 초대 군주인 유비(劉備: B.C.223~B.C.160)의 시호(諡號). 그의 字는 현덕(玄德)인데 어진 신하 제갈량의 보필을 받아 서촉(西蜀) 지방을 차지하여 촉한을 세우고 江北의 위(魏), 江南의 오(吳)와 더불어 삼국을 형성하였다. 223년 4월 관우, 장비의 사망과 이릉전쟁으로 인해 병이 심해진 유비는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이엄을 보좌로 삼고 영안궁에서 63살의 나이에 붕어(崩御)하였고, 8월에 혜릉(惠陵)으로 이장되었다.
)이 將終(장종)에 勅後主曰(칙후주 勅(칙) : 詔勅(조칙), 즉 조서(詔書)로서 제왕의 명령. 여기서는 ‘경계하다’의 의미이다. 後主(후주) : 후계(後繼)의 군주라는 뜻으로, 선주(先主) 소열제(昭烈帝)의 아들 유선(劉禪). 그는 어리석은 임금으로 제갈량이 죽은 뒤 위나라에 항복하였다. 효회제 유선(孝懷帝 劉禪, 207년~271년)은 촉한의 제2대 황제(재위: 223년~263년)이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陳壽)가 조위 정통론의 입장에서 전 황제인 선주(先主) 소열제(昭列帝) 유비(劉備)와 구별하여 유선을 후주(後主)라고 지칭했기에 후주로도 불린다. 자는 공사(公嗣). 유비의 적차남이자 감부인 소생이며, 아명은 아두(阿斗)였다. 조운(趙雲)이 당양 장판파에서 구하였고, 유비가 ‘너 때문에 용맹한 장수를 잃을 뻔하였다’라고 한탄하며 땅바닥에 던져버렸다고 전해지는 아두가 곧 그다. 17세에 유비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고, 유비의 탁고 유지를 받든 승상 제갈량(諸葛亮)에게 내정과 외정을 총괄케 하고, 신료들을 감독하게 하였다. 제갈량 사후, 장완(蔣琬), 비의(費禕), 강유(姜維) 등에게 국정을 맡기고 정치에 관여를 거의 하지 않으며[출처 필요], 말년에 권신 진지(陳祗)와 환관 황호(黃皓)를 총애하였다. 재위 40년째인 263년에 등애(鄧艾)의 기습 공격으로 수도인 성도(成都)가 위태로워지자, 그해 겨울에 위에 항복하였다. 이후 종회(鍾會)와 강유가 촉 회복 운동, 즉 위나라에 대한 반란을 꾀하다가 토벌된 뒤, 낙양(洛陽)에 압송되어 안락공(安樂公)으로 봉해졌다. 아명인 아두는 무능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인다. 촉한을 망하게 한 자라고 불림. <위키백과>
왈)
勿以善小而不爲(물이선소이 以(이) : 이유, 까닭,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겸 후치사이다. 여기서는 ‘~라는 이유로, ~때문에’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而(이) : 접속사로서 ‘그리고, 그래서’, 또는 ‘그러나’의 뉘앙스를 갖는, 전후 관계를 순접(順接)이나 역접(逆接)하는 허사이다. 그런데 때로는 대명사 ‘너’의 의미로도 쓰인다. 勿以~ 而~ (물이~ 이~) : ‘~하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의 뜻이다.
불위)하고 勿以惡小而爲之(물이악소이위지)하라
한(漢)나라의 소열황제(昭烈皇帝)가 장차 죽으려 할 때 후주(後主)에게 경계하여 말하였다.
“작은 선이라고 해서 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작은 악이라고 하여도 해서는 안 되느니라.”
[해설]
우리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면 설마 어떠랴 싶어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다. 소열황제는 이 점을 임종할 때 못난 아들 유선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것이다.
[출전]
본문 ‘勿以善小而不爲(물이선소이불위)하고 勿以惡小而爲之(물이악소이위지)하라’가, 1) 《三國志》 〈蜀志(촉지) 先主劉備傳(선주유비전)〉에는 ‘勿以惡小而爲之(물이악소이위지)하고 勿以善小而不爲(물이선소이불위)하라’로 되어 있으며, 2) 《小學》 〈嘉言(가언)〉에는 ‘勿以善小而爲之(물이선소이위지)하고 勿以惡小而不爲(물이악소이불위)하라’로 되어 있다.
03. 一日不念善 諸惡 皆自起(일일불념선 제악 개자기)
한결같이 선한 것을 사랑하라
一日不念善 諸惡 皆自起
莊子曰(장자 莊子(장자) : 중국 전국시대에 활약한 도가(道家)의 한 사람이다. 《道德經(도덕경)》을 쓴 노자(老子)와 《莊子(장자)》를 쓴 장자의 사상을 우리는 노장사상(老莊思想) 또는 노장철학(老莊哲學)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이 장자이다. 중국 고대의 철학은 유가(儒家) 묵가(墨家) 도가(道家) 법가(法家)의 4대 주류로 전개되었는데, 그중 노자와 장자의 철학은 무위자연(無爲自然), 즉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고 자연에 맡기는 것’을 표방하여 유가나 묵가나 법가와 같이 난세(亂世)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차라리 소극적인 자세로 억지로 꿰맞추는 인위를 버려야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설을 주장하였다.
왈)
一日不念善(일일불념 念(념) : 생각할 ‘념’
선)이면 諸惡(제 諸(제) : 모든 제.
악)이 皆自起(개 皆(개) : 모두(다) 개.
자기)니라
장자(莊子)가 말하였다.
“하루라도 선(善)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 악(惡)이 저절로 일어난다.”
[해설]
이 글은 《장자》에 보이지 않는다. 이 《명심보감》에 ‘莊子曰(장자왈)’이라 수록된 글들은 모두 《장자》에 보이지 않으니, 작자가 어디에 근거하여 채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선행(善行)할 것을 마음 쓰지 않는다면 방종해져서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어, 그 결과 나쁜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니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04. 聞惡如聾(문악여롱)
악한 일을 들으면 귀머거리가 되라
聞惡如聾
太公曰(태공 太公(태공) : 姓은 姜(강)이고 氏는 呂(여)이며, 이름은 尙(상) 또는 望(망)이다. B.C.1122년 지금의 중국 산동성(山東省) 태생이다. 주(周)나라 초기의 현자(賢者)로 위수(渭水) 가에서 낚시질하다가 문왕(文王)에게 기용되었다고 한다. 저서로는 《六鞱(육도)》와 《三略(삼략)》이 전한다. [육도삼략] 강태공과 주문왕의 만남(1) 참고
왈) 見善如渴(견선여갈 如渴(여갈) : 如는 전치사이나 ‘~처럼 하다’라는 동사로 새기는 것이 글의 맛을 명쾌하게 할 때가 많다. 따라서 ‘목이 타서 물을 찾듯이 하다’로 번역하면 좋다. 渴은 목마를 갈.
)하고 聞惡如聾(문악여롱 聾(롱, 농) : 귀머거리 롱.
)하라
又曰(우왈) 善事(선사)는 須貪(수 須(수) :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름지기’라고 번역하는 조동사이다. 그렇지만 보다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로 ‘必’과도 같다.
탐)하고 惡事(악사)는 莫樂(막 莫(막) : ① 자전적 의미로 ‘더 없을’, ‘더 이상 없을’의 의미를 갖는다. ② 부사로 ‘~하지 마라’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동사성(動詞性) 어조(語調)를 갖는 금지사이다. 본문의 莫은 ②에 해당한다. 例) ‘君有急病見於面(군유급병현어면)하니 莫多飮酒(막다음주) 하라. 그대는 급한 병이 얼굴에 나타나 있으니,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三國志(삼국지)》〈魏志 方技傳(위지 방기전)〉 ③ ‘더 이상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대사(代詞)이다. 例) ‘過而能改(과이능개)면 善莫大焉(선막대언)이니라. 잘못했더라도 고칠 수 있으면, 더 이상의 善이 없다.’《左傳(좌전)》〈宣公 二年〉 ④ 때로는 莫(막)이 無와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 例) ‘平長(평장)하여는 可娶妻(가취처)로되 富人莫肯與者(부인막긍여자)니라. 진평(陳平)이 자라서 아내를 맞을 수 있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딸을 주려는 사람이 없었다.’《史記(사기)》〈陳丞相世家(진승상세가)〉
락)하라
태공(太公)이 말하였다.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듯이 하며, 악한 말을 듣거든 귀머거리처럼 하라.” 또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탐내야 하며, 악한 일이란 즐기지 말라.”
[해설]
태공의 저술이라고 하는 《六鞱(육도)》나 《三略(삼략)》에 보이지 않는 글이다. 선행은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고 악행은 귀먹은 듯, 무관심하게 하라는 말이다.
05. 終身行善 善猶不足(종신행선 선유부족)
선은 평생 행해도 부족하다
終身行善 善猶不足
馬援曰(마원 馬援(마원) : 후한(後漢 사람 B.C.11~A.D.49)으로 자는 문연(文淵)이며, 광무제를 도와 티벳족을 정벌하고 남방(南方) 교지(交趾)의 반란을 평정하였으며 흉노족을 토벌하는 등 많은 무공(武功)을 세웠다. 《後漢書(후한서)》<馬援列傳(마원열전)>에 소개되어 있다. 마원(馬援, 기원전 14년~49년)은 후한의 정치가로 자는 문연이다. 태중태부와 농서 태수를 역임하였으며 후한 말, 서량태수 마등(馬騰)과 계한 표기장군 마초(馬超)의 조상이다. 후한 광무제(光武帝) 때 촉(蜀)을 공격, 함락하여 복파장군(伏波將軍)이 되고, 교지(交趾)를 쳐서 신식후(新息侯)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성(忠成). 마복파(馬伏波)이다. 또한 그는 나이가 70이 넘어 전쟁에 노구를 이끌고 참가하여 연승을 거두면서 노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후에 그의 딸은 명제의 황후가 되었고, 장제의 생모 가귀인과 사촌 자매처럼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위키백과>
왈)
終身行善(종신 終身(종신) : 목숨을 다하기까지의 동안. 일생을 마침.
행선)이라도 善猶不足(선유 猶(유) : ① 일반적으로 ‘오히려’라고 해석하는 부사이다. ‘여전히’, ‘또한’, ‘아직도’ 등으로 해석하면 좋으며 ‘오히려’ 상(尙)과 뜻이 일치한다. 例) ‘今君(금군)은 雖終(수종)이나 言猶在耳(언유재이)니라. 지금 임금은 비록 죽었지만, 말은 아직도 귓가에 있다.’ 《左傳》〈文公 七年〉 ② ‘猶(유)’가 ‘오히려’의 의미일 때를 보자. 추론을 이끌어내고, 부사절에서는 주어 뒤에 쓰이며 주어절 곧 正句에서는 ‘况(황:하물며)’이나 ‘安(안:어찌)’과 서로 호응한다. 이때 ‘오히려’, ‘또한’이라고 해석하는데, ‘尙’과 같다. 例) ‘臣之壯也(군지장야)에도 猶不如人(유불여인)이었는데 今老矣(금로의)라 無能爲也已(무능위야이)이니라. 내가 젊었을 때도 오히려 남만 못했는데, 지금은 늙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左傳(좌전)》 〈僖公 三十年(희공 30년)〉 ③ ‘猶(유)’의 용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와 같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例) ‘文猶質也(문유질야)며 質猶文也(질유문야)니 虎豹之鞹(호표지곽)이 猶犬羊之鞹(유견양지곽)이니라. 문(文)이 질(質)과 같으며 질(質)이 문(文)과 같은 것이니, 호랑이와 표범의 털 없는 가죽이 개와 양의 털 없는 가죽과 같은 것이다.’《論語(논어)》〈顔淵(안연) 八章〉 ‘子貢問師與商也(자공문사여상야)는 孰賢(숙현)이니잇고 子曰(자왈), 師也(사야)는 過(과)하고 商也(상야)는 不及(불급)이니라 曰(왈) 然則師愈與(연즉사유여)잇가 子曰(자왈) 過猶不及(과유불급)이니라. 자공(子貢)이 “자장(子張(師))과 자하(子夏(商))는 누가 낫습니까?”하고 묻자, 공자께서 “자장(子張)은 지나치고, 자하(子夏)는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자공이〉 “그렇다면 자장(子張)이 낫습니까?” 하자, 공자는 말하기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하였다.’《論語》 〈先進 十五章〉
부족)이요
一日行惡(일일행악)이라도 惡自有餘(악자유여)니라
마원(馬援)이 말하였다.
“일생을 마치도록 선(善)을 행하더라도 선(善)은 그래도 부족하고,
단 하루 악(惡)을 행하여도 악(惡)은 저절로 남음이 있다.”
[해설]
선(善)을 한평생 행해도 모자라는 것인데, 오히려 악(惡)을 행한다면 그 병폐는 저절로 남음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06.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불여적음덕어명명지중)
덕행(德行)은 가장 값진 유산이다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
司馬溫公曰(사마온공 司馬溫公(사마온공) : 북송(北宋) 때의 정치가이자 학자이다(1019~1086). 성은 사마(司馬), 이름은 광(光), 자는 군실(君實), 호는 우부(迂夫), 시호는 문정(文正)인데, 온국공(溫國公)에 봉해졌으므로 흔히 온공이라고 한다. 사마광(司馬光)은 중국 북송의 유학자, 역사가, 정치가이다. 자는 군실(君實)이고, 섬주 하현(陝州 夏縣, 지금의 산시성) 출신이다. 호는 우수(迂叟) 또는 속수선생(涑水先生)이라고 불렸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온국공(溫國公)의 작위를 하사받아 사마온공(司馬溫公)이라고도 한다. 선조는 사마의의 동생 사마부라고 한다. 자치통감의 저자로서 유명하다. 신법(新法)과 구법(舊法)의 다툼에서 구법파의 영수로서 왕안석과 논쟁을 벌였다. <사마광(사마온공) 관련 시>로는 [고문진보] 03. 司馬溫公勸學歌(사마온공권학가), [고문진보 후집] 71. 獨樂園記(독락원기), [고문진보] 97. 司馬溫公獨樂園(사마온공독락원)/司馬君實獨樂園(사마군실독락원)-蘇軾(소식)이 있다.
왈)
積金以遺子孫(적금이유 遺(유) : 끼칠 ‘유’, 남길 ‘유’.
자손)이라도 未必子孫(미필 未必(미필) : 必은 부사로서 ‘꼭 ~할 것이다’ 또는 ‘반드시 ~하려 한다’는 결연한 의지나 확정을 나타낼 때 쓰이고, 未必은 ‘꼭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미로 부분 부정을 나타낸다.
자손)이 能盡守(능진 盡(진) : 다할 ‘진’. 다될 ‘진’
수)요
積書以遺子孫(적서이유자손)이라도 未必子孫(미필자손)이 能盡讀(능진독)이니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불여 不如(불여) :① ‘차라리 ~하는 게 낫다’의 의미로 해석한다. 例) ‘齊人有言曰 雖有智慧나 不如乘勢하고 雖有鎡基나 不如待時이니라. 제나라 사람의 속담에, 비록 지혜가 있으나 차라리 권력에 편승하는 게 낫고, 비록 호미가 있더라도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했다.’《孟子》 〈公孫丑章句 上 一章〉 ② ‘A不如B’는 ‘A는 B만 못하다’의 의미이다. ①의 의미와 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부정부사 ‘不’과 동사 ‘如’가 이어져 쓰인다(현대의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다.). 例) ‘斯自以爲不如非이니라. 李斯는 스스로 자신을 韓非만 못하다고 생각하였다.’《史記》 〈老莊申韓列傳〉) ‘我不如他이니라. 나는 그만 못하다.’ ③ 不如는 不若과 그 쓰임새가 비슷하다.
적음덕어명 冥(명) : 어두울 ‘명’.
명지중)하여 以爲子孫之計也(이위 以爲(이위) : ‘~으로 여기다, ~으로 생각하다, ~으로 삼다’
자손지계야)니라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 준다고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킬 수는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 준다고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남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으로 삼는 것만 못하느니라.”
[해설]
‘재물은 3代를 못 간다.’는 속담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다.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는 세상에 덕을 쌓아 자손에게 남겨 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임을 말한 것으로, 돈이나 책을 가득히 유산으로 남긴들 그 보존은 어려우므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덕을 쌓아 후손이 보답을 받게 하는 계책을 세우는 게 낫다는 뜻이다.
[출전]
‘司馬溫公曰(사마온공왈)’이 淸州本(청주본)에 ‘司馬溫公家訓(사마온공가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마광(司馬光)의 가훈(家訓)으로 짐작된다.
07. 路逢狹處 難回避(노봉협처 난회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路逢狹處 難回避
景行錄曰(경행록왈 曰(왈) : 책 이름이나 편명이 나올 때는 ‘쓰여 있다’는 의미 정도로 보아도 좋다.
)
恩義(은의) 恩義(은의) : 갚아야 할 의리(義理)와 은혜(恩惠)
를 廣施(광시)하라
人生何處不相逢(인생하처불상봉) 人生何處不相逢(인생하처불상봉) :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에선가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라는 직역도 괜찮겠다.
이랴
讐怨(수원) 讐怨(수원) : 원수와 원한
을 莫結(막 莫(막) : 勿(물)에 상응하는 금지사이다. ~ 하지 말라
결)하라
路逢狹處(노봉협처) 路逢狹處(노봉협처) : 외나무다리 같은 좁은 곳에서 우연히 만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글인데, ‘길 가다 좁은 곳에서 만나다’로 직역함 직하다. 狹 : 좁을 ‘협’.
면 難回避(난회피)니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 서로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마라.
길이 좁은 곳에서 만나면 회피하기 어렵다.”
[해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널리 은혜를 베풀 것을 권하고 원수나 원한을 짓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
[출전]
1) 《景行錄(경행록)》은 송(宋)나라 때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2) 《琵琶記(비파기)》 十六에는 ‘路逢險處難回避(노봉험처난회피)니 事到頭來不自由(사도두래부자유)니라. 길 가다 험한 곳을 만나면 돌아서 피하기 어려우니, 사정(事情)이란 처음부터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로 되어 있다.
3) 《增廣賢文(증광현문)》에는 ‘路逢險處須當避(노봉험처수당피)니 事到頭來不自由(사도두래부자유)니라. 길 가다 험한 곳을 만나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니, 사정(事情)이란 처음부터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로 되어 있다.
08. 我旣於人 無惡 無惡哉(아기어인 무악 무악재)
선행(善行)은 모든 악행(惡行)을 제압한다
我旣於人 無惡 無惡哉
莊子曰(장자왈)
於我善者(어아선자)도 我亦善之(아역선지 之(지) : 여기서는 모두 지시대명사이다.
)하고
於我惡者(어아악자)도 我亦善之(아역선지)니라
我旣於人(아기 旣(기) : 일이 완성되었거나 시간이 흘러감의 의미를 포함하는 동사성(動詞性)의 부사이다. ‘이미’, ‘이후에’, ‘마치다’, ‘완성했다’의 의미로 쓰인다.
어인)에 無惡(무악)이면
人能於我(인능어아)에 無惡哉(무악재 哉(재) : 어조사 재. 어조사(語助辭). 비롯하다. 재난(災難).
)인저
장자가 말하였다.
“나에게 착하게 하는 자에게도 나 또한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나 또한 착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았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지 않는다.”
[해설]
이 글은 《莊子(장자)》에 보이지 않는다. 장자의 말을 빈 이 글은, 더불어 사는 세상에 내가 먼저 솔선(率先)하여 선(善)을 행할 때 악으로 갚는 일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09. 行惡之人 如磨刀之石(행악지인 여마도지석)
악행은 숫돌처럼 스스로 닳게 한다
行惡之人 如磨刀之石
東嶽聖帝垂訓曰(동악성제 東嶽聖帝(동악성제) : 도교(道敎)에서 섬기는 신. 동악성제는 분명치 않으나 동악대제(東嶽大帝)가 있다. 북경의 동악묘에 모셔둔 태산신(泰山神)으로 사람의 사후세계를 관장한다.
수훈왈)
一日行善(일일행선)이면 福雖未至(복수 雖(수) : ‘비록 ~이라도(하더라도)’로 해석되는 양보 절을 이끄는 부사이다.
미지)나 禍自遠矣(화자원의 矣(의) : 추측 또는 미래를 나타내거나, 약한 단정을 나타내는 종결사이므로 ‘~일 것이다’로 해석한다.
)요
一日行惡(일일행악)이면 禍雖未至(화수미지)나 福自遠矣(화자원의)니
行善之人(행선지인)은 如春園之草(여 如(여) : ‘마치 ~와 같다’는 비교의 뜻으로 쓰인다.
춘원지초)하여
不見其長(불견기장)이라도 日有所增(일유소증)하고
行惡之人(행악지인)은 如磨刀之石(여마도지석 磨刀之石(마도지석) : 칼을 가는 숫돌. 磨(마) : (갈 마). 갈다
)하여
不見其損(불견기손 損(손) : (덜 손). 줄다. 감소하다.
)이라도 日有所虧(일유소휴 虧(휴) : (이지러질 휴). 이지러지다. 줄다.
)니라
《東嶽聖帝垂訓(동악성제수훈)》에 말하였다.
“하루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화(재앙)는 저절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저절로 멀어질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나 날로 더해지는 것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 갈려 닳아 없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나 날로 이지러짐이 있다.”
[해설]
삶의 과정에서 남을 위해 살아도 바로 보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위(自慰)하는 생활 태도를 보인 내용이다.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권장 도서로서 첫손가락에 꼽는 <명심보감>은 예로부터 수신의 지침서로 읽히며 시대를 초월하여 만인의 인생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명심보감>은 삶의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 안에서 자기의 삶을 책임 있게 꾸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한다.
<명심보감(明心寶鑑)>이란 글자 뜻 그대로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된다.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 나아가 스승과 제자, 친구,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 거래관계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관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진다. <명심보감>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명심보감>은 삶의 교훈서로서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개선하여 올바르게 관계해 나갈 길을 말해준다.
총 25개의 편으로 나누어 인간의 자기 수양과 윤리, 도덕, 처세 등에 관한 예지를 수록하여 제목 그대로 마음을 밝게 해주어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세상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스스로 반성하게 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또 인생을 더 값지게 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삶의 지혜를 일깨운다.
서평
원문에 충실하였으며, 한자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하여 한자 옆에 훈을 달았다. 번역은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려 옮겼고, 해설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최소한으로 했으며, 원문의 출전을 밝히려고 애썼다.
한 권으로 엮기에는 분량이 많아 상, 하 두 권으로 나누었다.
부모를 화수분 내지는 금고 정도로 생각하며 존속살인까지 자행하는 세태에 ‘효’와 ‘자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리라 기대하며, 또 입시 경쟁에 등 떠밀려 친구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요즘 세상에 ‘우정’을 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스승이나 사표는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선생님을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직장인쯤으로 여기는 요즘, 참 스승의 길과 제자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부 관계를 그저 계약쯤으로 여겨 이혼율이 급증한 요즘 세태에 이상적인 부부 관을 제고하고, 직장에서 동료를 경쟁자나 내 밥그릇을 뺏는 사람으로 여기는 이들은 동료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명심보감> 속 지혜를 품을 수 있다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추적
추적(秋適)
출생 1246년 고려 양광도 양지현(現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사망 1317년(향년 72세) 고려 개경
본관 추계(秋溪)
별칭 자(字) 관중(慣中), 호(號) 노당(露堂), 시호(諡號) 문헌(文憲)
경력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추적(秋適, 1246년 ∼ 1317년)은 고려의 문신이다. 본관은 추계(秋溪). 자는 관중(慣中), 호는 노당(露堂)이다. 충렬왕 때,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역임하였다. 시랑(侍郞) 겸 국학 교수(國學敎授)로 재임할 때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집필하였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인흥서원(仁興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다.
노당(露堂) 추적(秋適)은 1246년(고려 고종 33년) 양광도에서 태어났다.
추적의 아버지인 추영수(秋永壽)는 1209년(고려 희종 5년) 국자시에 장원급제하여 문하시중을 역임하였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추적(秋適)은 성품이 활달하여 얽매임이 없었다고 한다.
1260년(고려 원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안동서기(安東書記), 직사관(直史館)을 거쳐 좌사간(左司諫)에 올랐다.
1298년(충렬왕 24) 환관 황석량(黃石良)이 권세를 이용하여, 황석량의 고향인 합덕부곡(合德部曲 : 현재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을 현(縣)으로 승격시키려고 할 때, 추적이 문안에 서명을 거부하자, 황석량은 내수(內竪) 석천보(石天補), 김광연(金光衍)과 함께 기회를 노려 추적을 참소하니, 왕이 형구를 채워 순마소(巡馬所)에 수감하게 했다. 압송하는 사람이 추적더러, 원한다면 골목길로 갈 수도 있다고 후의를 보였으나 추적은 거절했다. “죄를 저지른 자를 모두 해당 관청으로 보낼 때 대궐에서 형구를 채운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으니 내가 큰 거리를 지나면서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 간관(諫官)으로서 형구를 차는 것 또한 영광이니, 어찌 아녀자가 거리에서 얼굴 가리는 것처럼 행동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추적은 곧 복권되어 1299년 시랑으로 북계 용주(龍州)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1302년(충렬왕 28년) 찬성사(贊成事) 안향(安珦)에 의하여 시랑(侍郞) 겸 국학 교수(國學敎授)로 발탁되어 이성(李晟), 최원충(崔元冲) 등과 함께 7품 이하의 관리 혹은 생원들에 대한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안향(安珦)과 더불어 정주학(程朱學)의 도입을 꾀하였다. 1305년 시랑 국학교수로서 교양서인 《명심보감(明心寶鑑)》을 편찬하였다.
1306년(충렬왕 32년) 민부상서(民部尙書)를 역임하고,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이르렀다.
추적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다.
조선 순조 35년(1825) 10월 팔도 유림(儒林)과 추적의 20대손인 추세문(秋世文)이 뜻을 모아 창건한 대구의 인흥서원(仁興書院)에 배향되었다. 조선 고종 1년(1864년) 홍문관제학을 역임한 조선의 문신 해장 신석우(申錫愚, 1805~ 1865)가 비문을 지어 추적 신도비(秋適神道裨)를 건립하였다.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세운 주세붕(周世鵬)은 《무릉잡고(武陵雜稿)》에 노당 추적의 공적을 "해동에서 유교를 숭상하고 학교를 건립한 도(道)가 복초당 안선생 문성공 유와 노당 추선생 문헌공 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까지 누구라고 흠모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 고려와 조선의 유교가 안향과 추적 두 선생에서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바이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